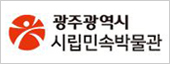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20건
-
- 고경명-무등산 풍경
- 조수처럼 퍼지는 구름은 온 구렁을 메웠는데햇살에 따라 변하는 모양 더욱 볼 만하네아름다운 글 한 편 써 볼 테니바람아 구름을 걷어가지 마라
- 2018-08-02 | NO.645
-
- 고경명-부용정에서
- 官裏文書綴亂絲 관청의 문서철이 어지럽게 엮여 있는데行春又到習家池 봄의 계절 또 다시 술 마시기 좋은 때(습가지)에 이르렀네非闕泥酒停騶御 술에 취해 마차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問柳尋花故作遲 버들을 묻고 꽃을 찾느라 짐짓 더디었다네습가지(習家池) :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양(襄陽)에 있는 못 이름. 토호(土豪)인 습씨(習氏)의 원지(園池)로, 진(晉) 나라 때 산간(山簡)이 양양 태수로 있으면서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여 술을 즐겨 마시던 곳으로 유명하다.
- 2018-08-02 | NO.644
-
- 고경명-양과모정에서 짓다(題良苽茅亭)
- 隣社招邀慣 이웃 사람들 초청하기 일쑤였으니 良辰幾上亭 좋은 시절 몇 번이나 이 정자에 올랐던고廚煙隔岸白 언덕 너머 부엌에 밥 짓는 하얀 연기 酒幔颭樗靑 주막의 깃발은 바람결에 푸르네 林表投雙鳥 수풀 속엔 한 쌍의 새 날아들고 槐根臥數甁 괴목 뿌리에는 술병 몇 개 놓여있네 村童齊拍手 마을 아이들이 함께 박수치니堪盡醉時形 그림보다 좋은 술취한 모습이구나問柳前村過 버들 숲을 찾고 앞 마을을 지나亭皐憩晚涼 서늘한 저녁 때에 정자에 올라 쉬네 黃雲村欲麥 마을마다 보리 누렇게 익어가고白水野分秧 논마다 가득한 물 모내기를 하네小雨園蔬嫩 가랑비에 밭나물 부드러워지고輕風市酒香 가는 바람에 저자의 술향기 풍겨오네自今來往熟 이제부터 오고가는 얼굴이 익어鷄犬亦相忘 지나가는 닭과 개도 못 본 체 하네 -양과모정은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있는 양과동정을 말하며 광주시 문화재 자료 제 12호로 지정되었다. 옛 부터 이 정자는 간원대, 또는 제봉의 별서라고 일러왔다. 간원대라 함은 조선조에 이곳 출신들이 많이 간관이 되어 중요한 나라일을 이곳에서 논의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집터 일대에 자리해 잠시 별서를 사용했다. 그리고 긴 운치를 남긴다.
- 2018-08-02 | NO.643
-
- 고경명-유서석록
- 고경명은 당시 광주목사이던 임훈 일행과 함께 1574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산사에서 유숙하며 무등산 권역을 유람했다. 널리 알려진 고경명의 유서석록은 그 시절 등산 관행과 산행 경로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유서석록’이다. 산행 경로 : 증심사 → 사인암(舍人巖) → 증각사(證覺寺) →죽정(竹亭) →이정(梨亭)→중령(中嶺) → 냉천정(冷泉亭) → 입석대(立石臺) → 불사의암(不思議庵) → 염불암(念佛庵) → 상원등(上元燈) → 정상삼봉(頂上三峯) → 서석대(瑞石臺) → 삼일암(三日庵)의 월대(月臺)→ 금탑사(金塔寺) → 은적사(隱迹寺) → 석문사(石門寺) → 금석사(金石寺) → 대자사(大慈寺)의 옛터 → 규봉암(圭峯庵) → 광석대(廣石臺) → 문수암(文殊庵) → 풍혈대(風穴臺) → 장추대(藏秋臺) → 은신대(隱身臺) → 청학대(靑鶴臺), 법화대(法華臺) → 문수암(文殊庵) → 송하대(送下臺) → 영신동(靈神洞) → 방석보(方石洑) → 장불천(長佛川) → 노루목 고개 → 창랑(滄浪) → 적벽(赤壁) → 소쇄원(瀟灑園) → 식영정(息影亭) → 서하당(栖霞堂)서석은 산 이름인데 곧 무등산이니 광주에 있다. 만력 갑술년(1574) 초여름에 목사 갈천 임선생(葛川 林先生, 이름은 林薰, 1500~1584)이 장차 틈을 내어 손님과 수종을 이끌고 서석산에 유람하기 위하여 서신으로서 나를 초청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어른과 기약하고 뒤늦게 갈 수 없으므로 20일 갑자에 등산장비를 갖추어 먼저 증심사(證心寺)에 가서 기다렸다. 서석산은 곧 우리 고을의 진산이다.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여러 번을 올라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윽한 시냇물과 깊은 숲을 두로 구경하여 발자국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범연히 보기만 하고 요령을 얻지 못한다면 초동, 목동의 보는 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혼자 올라 상심만 한다면 (중국 당나라의) 유의조(柳儀曹, 유종원柳宗元을 지칭, 773~819)의 시(南澗中題, 812)에 남간(南澗, 중국 영주(永州)의 남쪽에 있으며, 유종원의 <석간기(石澗記)>에 실려 있는 석간(石澗)을 말한다)에서 느낀 슬픔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니, 산의 경치를 소상히 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산의 참뜻과 참맛을 알았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다행히 선생의 뒤를 좇아 눈을 씻고 다시 관광하게 되어 황홀히 표륜(飇輪, 풍륜(風輪)과 같은 말이다. 회오리바람으로 가는 수레, 태양(太陽)을 뜻한다)과 우개(羽盖=羽蓋, 깃으로 된 왕의 수레덮개. 왕의 수레 포장)로서 낭풍(閬風)과 현포(玄圃, 현포는 곤륜산(崑崙山) 곡대기에 있다고 하며, 금으로 만든 대(臺)가 다섯 곳, 옥루(玉樓) 가 열두 개 있는데, 신선의 거처라고 한다. 『수경주(水經注)』에 의하면 곤륜산의 두번째 등급으로, 일명 낭풍(閬風)이라고 한다 하였다. 『산해경』에는 「현포(縣圃)」로 되어 있다)의 위에 노는 듯 했으니,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는가? 이에 흥취가 돋아나서 소매를 드날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해가 정오가 되기 전에 벌써 동문골짜기에 다다랐다. 누교(樓橋)를 거쳐 올라가니 수목은 더욱 울창하고 바위는 모두 기괴하였으며 시냇물 소리는 구슬이 구르는 듯 하였으니 점점 아름다운 지경에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내가 이에 말에서 내려 옷을 벗고 맑은 물에 발을 씻으며 태고적 창랑의 가사를 외우고 소산(小山, 한나라 회남 소산왕淮南小山王)이 지은 초은(招隱)의 곡조( 招隱士)를 읊으니, 서늘한 기운이 가슴에 가득하고 번잡한 마음이 사라져 씻은 듯 속세에서 벗어난 감상이 있었다. 해가 장차 저물매 지팡이를 짚고, 신을 끌며, 천천히 걸어 들어가니 절 앞에 조그만 다리가 있어 시내에 걸쳤으며 좌우에는 고목이 우거져 있었다. 그 그윽한 경치를 사랑하여 한동안 두루 구경했는데 절의 스님은 내가 그곳에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드디어 취백루(翠栢樓)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휴식을 취하였는데 취백루라고 이름한 것은 잣나무가 뜰 앞에 푸르다(栢樹庭前翠)라는 글귀에서 취한 것이 아니겠겠는가? 벽 위에는 권흥(權興) 등 여러 사람의 시를 편액에 새겨 걸었는데 대개 홍무(洪武, 명 태조 연호 1368~1398) 연간에 쓴 것이다. 김극기(金克己)의 시만이 유실되었으니 이 어찌 후인의 한탄할 바가 아니겠는가?잠시 후 조선(祖禪)이 찾아와 비로소 방을 쓸고 포단을 깔아주어 나는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한식경 후에 일어나 보니 떨어지는 햇살은 서산에 너울거리고 붉은 노을은 하늘을 뒤덮었는데 놀란 사슴은 죽림으로 달아나고 지친 새는 수풀을 찾아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을 자아내게 했다. 옛 사람의 이른바 명승지에 임하면 마음이 저절로 슬퍼진다는 것은 참으로 허언이 아니었다. 조선이 송화로 빚은 술과 산나물로 나를 접대하고 이야기가 소재(蘇齋)의 옛 놀이에 미치니, 자못 구수하여 들을만 하였다. 조선의 말로 인하여 비로소 누교의 시내 위에 최송암(崔松巖, 자는 응룡應龍, 1537~1592)이 바위에 새긴 시가 있음을 알았는데 각자를 얇게 했기 때문에 이끼가 끼어 처음에 알아볼 도리가 없었으니, 내가 한스럽게 여겼다.절 옆에 죽림이 있어 산과 연달았으니, 비록 위천(渭川)에 있는 천 이랑의 죽림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 하였다. 갑인년(1554) 봄에 내가 이 절에 왔을 때에는 그 마디의 길이가 일척이 넘고 둘레는 서까래같은 대가 즐비했었는데, 이제는 조릿대만 쓸쓸하여 다시 옛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조선(祖禪)이 법당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법당은 세상에서 전하기를 고려 초엽에 이름난 도편수가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장차 근 천년이 되었으나 동우(棟宇, 마룻대와 추녀 끝)와 계단과 초석이 조금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좌우의 요사는 무릇 몇 번을 개수하였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법당만 남아있습니다. 옛날 이절에 대장경 원판이 있었고 또 불경도 여러 상자가 있어 한 전당에 간직하였으나 이제 전당만 남고 경서는 모두 없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이날 저녁에 이만인(李萬仁, 자는 一元, 호는 梅亭)과 김형(金逈, 자는 叔明, 호는 鳴巖, 1543~?)이 함께 이르러 밤에 한 자리에게 유숙하였다. 늙은 고승이 촛불을 켜고 경석磬石을 울려 부처에 예배를 올린 후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산중에 옛날 향반(香盤)을 설치하였다가 연루(蓮漏)로서 대체하였는데 시각마다 종을 울려 손님의 잠자리에 방해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그렇지 않소. 우리들이 세속에서 몸을 벗어나 잠깐 선경에 머물렀으니 맑은 밤에 눈만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는 것이오. 그런데 작은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왔으니 실로 나쁜 소리가 아니요, 들으매 족히 깊이 살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얼마 후 세 사람이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늙은 중의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니 참으로 우스웠다. 새벽녘에 남풍이 급히 몰아치거늘 내가 비 올 조짐이 아닌가 염려하여 조선을 깨워 물으니 조선이 말하기를 "빈도(貧道)가 오랫동안 이 산에 깃들어 비바람의 증후를 익숙히 아는데 비록 남풍이 불더라도 비 올 조짐은 아니옵니다’라고 하였다.21일 을축일기가 쾌청하였는데 늦은 아침에 선생(갈천 일훈)의 행차가 당도하였다. 신형(愼衡, 자는 彦均)과 이억인(李億仁, 자는 長元)과 김성원(金成遠, 자는 剛叔)과 정용(鄭庸, 자는 子常)과 박천정(朴天挺, 자는 應須)과 이진(李?, 자는 汝正)과 안극지(安克智, 자는 公達) 등이 뒤를 따랐다. 나는 취백루에 올라가 선생을 뵈었다. 누대의 앞에는 해묵은 잣나무 두 그루가 있어 형상이 고괴하여 완상할만 했으니, 비록 고려시대의 유물은 아니었으나 또는 누대의 이름에 차착이 없었다.술이 몇 순배 돈 후에 선생이 식사를 재촉하여 먹게 하고 등산길을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잡인을 물리치고 종솔을 간단히 거느려 야복野服을 입은 채 죽여(竹輿)를 타고 사승寺僧 조선으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게 하여 증각사(證覺寺)로 향하였다. 중도에 선생이 우거진 나무 그늘에 앉아 짐꾼들을 쉬게 하였다. 응수(應須, 박천정)가 서쪽으로 한 봉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사인암(舍人巖)인데 옛날 그 정상에 올라가 본즉 바위가 구름에 연달았고 절벽이 허공에 솟았으며 송골매가 깃들인 둥지를 굽어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정오에 증각사에 당도하였는데 이날 뿌연 기운과 흙비가 내려 멀리는 바라볼 수 없으나 대나무 정자와 넓은 벌판과 비단결 같은 시냇물을 역역히 볼 수 있었으니, 높은 데 오를수록 안계가 더욱 넓은 것을 비로소 알았다. 증각사의 북쪽에는 분죽(粉竹)과 오죽(烏竹) 두 가지 대가 있는데 분죽은 불에 쪼여 기름을 낸 뒤 지팡이를 만들면 심히 윤기가 있다고 하였다. 차를 마신 후에 곧 길을 떠나 이정(梨亭)을 거쳐 중령(中嶺)으로 향하니 험준한 길이 곧장 올라가 드높기가 천계와 같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물고기를 꿰미에 엮듯 서로 붙들고 개미가 기어가듯 하여 겨우 한 자를 전진하면 열 자을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매 앞이 트여 안계가 활짝 열렸으니 쾌활하기가 차양(떼우적)을 걷어치고 해를 보는 듯 하였다. 중령으로부터 산세를 따라 좌편으로 접어드니 수풀이 울창하여 햇살이 새어 들어오지 못했으며 험한 비탈길이 절벽으로 돌아 한 웅큼의 흙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다만 푸른 바위옷 사이로 날다람쥐가 갑자기 나타났다. 지팡이를 끌고 걸어가며 시를 읊으니 등산의 수고로움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중령에 오를 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벼운 수레를 타고 평탄한 길을 달리는 듯하였다.선생이 먼저 냉천정(冷泉亭)에 이르러 뒤에 오는 자들을 기다렸다. 샘이 나무 아래에 있어 바위틈에서 솟아났으니, 그 차가운 것은 도솔사(兜率寺)의 샘물에 미치지 못했으나 달콤한 맛은 월등하였다. (도솔사는 규봉의 동북방에 있는데 이제 헐려버렸고, 그 곳에 있는 샘물이 지극히 차가워 그 빛깔이 푸른 쪽과 같다고 하였다.) 이때에 여러 사람들이 바야흐로 갈증이 심하여 그 물에 콩가루를 타서 다투어 마셨으니 비록 금장옥례(金漿玉醴)도 그 시원함을 비길 수 없었다.해가 저물 무렵 입석암에 당도했으니 양사기(楊士奇)의 시에 이른바 ‘열여섯 봉우리가 절을 감싸주었네(十六峰藏寺)’라는 구절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었다. 암자의 뒤에는 기암이 뾰죽뾰죽 솟아 울밀한 것은 봄 죽순이 다투어 나오는 듯하였고 결백한 것은 부용이 처음 피는 듯 하였으며, 멀리 바라보면 의관을 정제한 선비가 홀을 들고 읍하는 것 같았고 가까이 보면 중관과 철성에 일만갑병을 나열한 듯하였다. 그 한 봉우리는 홀로 드높이 서서 형세가 외로이 빼어났으니 세속에서 초월한 선비가 군중을 떠나 홀로 달리는 듯 하였다.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네 귀퉁이가 옥을 깎아 세운 듯 층계가 첩첩하여 먹줄로 친 것 같았으니 생각건대 천지가 개벽할 초두에 아무런 뜻이 없이 결합되어 우연히 기관을 이룩한 것인지 또는 신공과 귀장이 바람과 우레를 불러 이 교묘한 솜씨를 농락한 것인지. 아! 누가 이를 만들었으며 누가 이를 다듬었던가? 아미산의 옥국이 땅 속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닌지 성도의 석순에서 나온 해안이 아닌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었다. 그 바위의 형세를 보니 참차하고 떨기로 솟아 비록 공교한 역산가라도 손꼽아 헤아릴 도리가 없었으니, 그 열여섯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볼만한 것을 근거삼아 대략만을 말한 것이었다. 그 형세가 양편으로 뻗어내려 사람이 두 팔을 벌린 듯 하였는데 암자가 정중에 있었으며 위태로운 바위를 우러러 보매 장차 굴러 떨어질 듯 했으니 모골이 송연하여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었다. 바위 아래에는 두 샘이 있어 하나는 암자의 동쪽에 있고 하나는 암자의 서쪽에 있었는데 비록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으니 또한 한 가지 이상한 일이었다.입석암을 떠나 약간 북쪽으로 가다가 우쪽 입석을 끼고 돌아 불사의(不思議. 암자 이름)로 들어갔는데 방장이 겨우 수척 평방에 지나지 않았으니 좌선이 아니면 거처할 도리가 없었다. 방장의 남쪽에는 평탄한 석대가 있어 몇 사람이 앉을 만 했으며, 옆에는 큰 고목이 있어 석대의 위에 그늘이 덮혀 있었다. 입석암은 여러 사찰 가운데에서 지형이 가장 높아 산해의 그윽하고 기이한 풍경을 한 눈에 역력히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차가운 바람이 뼈에 스며들어 찾아온 자가 오래 견딜 수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었다. 이에 석문을 걸어나와 배회하며 사방을 돌아보니, 마음이 창망하여 옛 친구와 이별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입석암으로부터 동쪽으로는 길이 험준하지 않고 도처에 반석이 있어 자리와 같이 평탄하기도 하고 옆으로 삐뚤어진 것도 있었는데, 지팡이 소리는 그윽하게 울리고 나무 그늘은 듬성듬성하였다. 혹은 쉬기도 하고 혹은 걷기도 하여 마음의 지향하는 대로 맡겼는데, 이에 낭선(浪仙)의 시에 이른바 ‘나무 그늘가에서 자주 쉬어가는 몸이로세(數憩樹邊身)’라는 구절이 정경을 그려내는 데 교묘함을 알았으니, 천재의 옛일이 완연히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해가 저물어 염불암(念佛庵)에 투숙하였는데 일원(一元)이 피곤하여 숨결이 매우 촉급하거늘 강숙(剛叔)이 묻기를 ‘오늘 험준한 길을 멀리 발섭하여 피로하지 않은가’라고 한 즉 일원이 눈을 감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피곤하지 않다’하니 일행이 모두 웃어댔다. 판관 안공(判官 安公 彦龍)과 찰방 이공(察訪 李公 元禎)이 청첩을 받고 먼저 화순에 있다가 만연으로부터 향로봉을 돌아나와 장불사를 거쳐 황혼에 이 염불암으로 찾아왔다. 이 암자는 원래 강월(江月)이 창건한 바로서 중간에 황폐된지 오래였는데 정덕(正德) 을해(1515)에 일웅(一雄)이 중창하였고 융경 임신(1572)에 보은(報恩)이 중수했으며 옆에 조그만 원우를 설치했으니 이는 결하(結夏)할 때 참석하는 곳이었다. 일찍이 눌재가 일웅을 위해 중창기를 지었는데 글자의 잔결된 곳이 많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암자의 동쪽에 돌더미 쌓인 것이 바라보였는데 지공력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어지러운 돌이 서로 버티어 산과 같이 첩첩하고 그 가운데는 텅비어 밑이 없어졌으니, 어느 사람이 그릇 도끼를 빠뜨리고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굴러가는 소리가 한식경 후에 바야흐로 끊어졌다고 한다. 이 산 가운데에 역(礫)이라고 명칭하는 곳이 둘인데 증각사(證覺寺)의 동북방에 있는 것을 덕산력(德山礫)이라고 이름하였다. 매양 소나기가 새로 개이면 잠복하였던 이무기가 나와 햇빛을 쪼이는데 몸을 서리서리 도사리고 있어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산승(山僧)이 일찍이 목격한 이야기인데 노루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니 한 괴물이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눈의 광채가 번쩍거려 참으로 두려웠다고 하였다. 홀로 이 지공력(指空礫)은 뱀이나 독충의 종류가 없고 가을에 낙엽이 산에 가득할 때에도 항상 말끔하여 한 잎새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승도들의 전설에 의하면 지공선사(指空禪師)가 그 신도들과 더불어 설법한 곳이라고 하였다.22일 병인에 일기가 쾌청하였다. 아침에 판관과 찰방이 먼저 일어나 입석암을 찾아갔으니 어제 날이 어두워 미처 구경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선생의 뒤를 따라 곧장 상원등(上元燈, 절이름)으로 올라갔다. 조그만 암자를 새로 지었는데 얕고 누추하여 휴식하기에 적합하지 못했다. 선생이 암자의 서쪽 단상에 앉아 휴식을 취했는데 그 서편에 회목 두 그루가 마주 서있고 그 아래에는 반석이 있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었다. 조금 후에 판관과 찰방이 뒤쫓아 당도하여 관령(官伶)으로 하여금 천왕봉과 비로봉에 올라 젓대 몇 곡조를 부르니 그 음운이 표묘(??)하여 생황과 옥퉁소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 했으며 마침 한 승도가 있어 절조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을 추니, 족히 한 웃음거리가 되었다.상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셋이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은 천왕봉이요 가운데 있는 것은 비로봉인데, 그 사이가 백여척이 되며 평지에 서서 바라보면 쌍궐(雙闕)과 비슷한 것이 이것이요, 서쪽에 있는 것은 반야봉인데 비로봉과 더불어 정상과의 거리가 거의 포목 일필의 길이가 되고 그 아래는 겨우 일척 남짓 됐으니 평지에서 바라보면 화살촉과 같은 것이 이것이었다. 정상에는 잡목이 없고 다만 두견과 철쭉이 바위 틈에서 소복하게 나와 길이는 일척 가량 되고 가지는 모두 남쪽으로 쏠려 깃발과 비슷했다. 그 지형이 높고 기후가 차가운 때문에 풍설에 시달려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 때에 산향과 두견화는 반쯤 떨어지고 철쭉화가 처음 피었는데 나뭇잎도 무성하지 못했으며, 정상에서 평지까지의 거리가 대략 40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후의 차이가 이와 같았다.반야봉의 서쪽은 지형이 매우 평탄했는데 봉우리의 형세가 갑자기 끊어져 천척의 단애(斷崖)가 땅에서 까마득하였고 멀리 정상의 나무를 바라본즉 냉이와 비슷했다. 진남산(鎭南山)의 시에 이른바 ‘송삼(松杉)과 죽림(竹林)의 앙증함을 노여워했네(杉篁?蒲蘇)’라는 구절은 이를 지적한 것이었다. 단애에 열지어 앉아 술잔을 들어가며 질탕히 마셨으니 표연히 공중에 날아 신선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었다. 단애의 서쪽에 총석(叢石)이 즐비하게 섰는데 높이가 모두 백척이 넘었다. 이른바 서석이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날은 뿌연 토우(土雨)가 약간 개어 어제의 험악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되나 멀리 사방을 조망할 수는 없었으며 가까운 산과 큰 시냇물은 대략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남해를 뚜렷이 볼 수 없어 한라산 등 여러 섬을 역력히 지점하며 거센 바람이 물결을 헤치는 광경을 감상하지 못했으니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이에 다시 전일에 오던 길을 되찾아 반야봉과 비로봉의 아래를 돌아 상원등의 동쪽으로 나와 삼일암(三日庵)의 월대(月臺)에 당도했다. 선바위가 심히 기이하였으며 그윽하고 상쾌한 풍경이 여러 암자 가운데에서 가장 특출하였는데 선사의 말에 ‘이 암자에서 삼일을 머무르면 도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금탑(金塔. 사찰의 이름)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삼일암의 동쪽에 수십척 되는 바위가 있어 홀로 반공에 드높이 솟았으니, 세속에서 떠도는 전설에 의하면 그 가운데에 9급 상륜(相輪)을 간직한 때문에 사찰의 이름을 이에서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은적사(隱迹寺)는 또 금탑사의 동쪽에 있는데 정치 옹성(瓮城. 적벽의 동북방에 있음)과 마주 대했으며 샘이 바위 틈에서 나와 경인년의 가뭄에 이 산 가운데 샘이 모두 고갈되었으나 홀로 이 샘만은 도도히 흘러 마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석문사(石門寺)는 금탑사의 서쪽 80보쯤에 있는데 동서에 각각 기이한 바위가 문주와 같이 쌍으로 서 있어 들고 날 때에 이를 경유하였다.금석사(錦石寺)는 석문사의 동남방에 있으니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이른 바 ‘고개의 흰 구름 산문을 함봉했구나(門仗嶺雲封)’라는 구절은 곧 이곳을 지적한 것이며, 암자의 뒤에는 수십조의 기이한 바위가 수북하게 솟아있었고 그 아래에는 샘이 있는데 지극히 차가왔다. 대자사(大慈寺)의 폐지는 금탑사의 아래에 있는데 옛 우물이 심히 맑아 이끼가 끼지 않았으며 뜰 위에는 산단화(山丹花)가 바야흐로 활짝 피어있었다. 길가에 석실이 있어 비바람을 피할만 했으니 세속 사람들이 소은굴(小隱窟)이라고 칭호하였다.이날은 내가 상봉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조용히 살펴보지 못하고 명승을 유람함에 있어 말을 달려 비단을 구경하듯 눈에 언뜻 스쳐지내어 한갓 그 휘황하고 찬란한 풍경만 보았을 뿐이요, 그 문채와 격조의 현묘함은 알지 못하였다. 청운 높은 선비의 뒤를 추종하여 그 대략만을 이와 같이 기록했으니 가을을 기다려 다시 행장을 수습하여 오늘의 미진함을 보상할 예정이다. 금석사를 경유하여 산기슭을 돌아 동쪽으로 나온 즉 여기가 곧 규봉암(圭峰庵)이다. 김극기의 시에 이른바 ‘괴석은 비단을 오려내어 장식하였고, 봉우리는 백옥을 다듬어 이루었네(石形裁錦出峰勢琢圭成)’라는 구절은 참으로 허언이 아니었다. 바위의 기괴한 것은 입석암과 더불어 비등한데 그 위치의 훤칠한 것과 형상의 특출함은 또한 입석암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 소상함은 권공 극화(權公 克和)의 기문에 나와있어 ‘여지승람’에 실렸으므로 여기에 생략하는 바이며,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신라시대 김생(金生)이 이 암자의 편액 삼대자(三大字)를 써서 걸었는데 그 후에 도둑이 훔쳐갔다고 했다. 광석대(廣石臺)는 암자의 서쪽에 있는데 바위 모습이 깎은 듯 하였으며 넓고 평탄하여 둘러 앉으면 수십명을 용납할 수 있었다. 당초에는 서남방의 귀퉁이가 약간 낮았던 것을 승도들이 여러 인부를 데리고 낮은 부분을 들어올려 큰 바위로 밑을 괴어 반듯하게 바로잡았다 하니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살펴보건대 인력으로 된 것은 아닌 듯하였다. 이른바 삼존석(三尊石)은 광석대의 정남에 있는데 그 높이가 수림의 위에 나와 창연히 솟아있으니, 광석대의 장엄한 기세를 더욱 도와주었다. 열 아름이나 되는 늙은 고목이 광석대 위에 비스듬이 서있어 나뭇잎이 우거지고 그늘이 두터웠으니 서늘한 바람이 스스로 이르러 비록 삼복 더위에 있어서도 단삼(單衫)을 입은 자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천관, 팔전, 조계, 모후의 여러 산이 모두 눈 아래에 나열되었으니 규봉암의 승경이 이미 서석산에 있는 여러 사찰의 으뜸이 되었고, 이 광석대의 풍치는 또 규봉암에 속한 십대의 위에 뛰어났다. 비록 남중의 제일경이라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최학사(崔學士)와 같은 자가 난(鸞)과 학을 타고 이 사이에서 휘파람을 불며 진(晉)나라의 척계(?溪)와 협산사(峽山寺)의 홍류시(紅流詩)와 같이 자암(紫巖. 규봉의 별명)의 정상에서 한번 취필(醉筆)을 휘두를 수 없는 것이 애석하였다. 광석대의 서쪽에 바위가 길을 막아 문설주와 비슷했는데 그곳을 넘어 조금 걸어가니 곧 문수암(文殊庵)이었다. 암자의 동쪽에 오목하게 파인 바위가 있고 그 중앙에서는 샘이 솟아 나왔으며 그 둘레에는 석창포(石菖蒲)가 수북하게 자라났는데, 앞에는 두어 길 높이 되는 석대가 있었고 너비도 높이와 비등하였다. 광석대에서 서북방으로 접어들어 비탈길을 몇 굽이 지나 자월암(慈月庵)에 당도했는데 암자의 동쪽에는 풍혈대(風穴臺)가 있었고 바위 밑에 구멍이 있었으니 풀을 그 구멍에 스치면 약간 팔랑거림을 느꼈다. 암자의 서쪽에 병풍같은 바위가 서 있었고 별달리 땅에 돌을 깔아 그 위에 늙은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니, 이는 곧 장추대(藏秋臺)이며 그 아래 깊은 골짜기를 굽어보매 모골이 송연하였다. 장추대에서 서쪽으로 행하여 비탈길을 따라 남으로 접어드니 오솔길의 너비가 일척을 넘지 않았고 길이 패인 곳에는 돌로 덮여 있었다. 발로 밟으니 딸가닥 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래로 절벽을 굽어보매 칠흑 같이 컴컴하여 비록 백혼무인과 같이 탐험에 능숙한 자라도 또한 다리를 꼬눌 수 없을 것이다. 비탈길이 다하고 오목한 곳에 당도했다. 원숭이 같이 나무를 더위잡고 올라가니, 그 남쪽에 은신대(隱身臺)가 있었는데 옆에는 오종종한 소나무 4~5주와 철쭉 두어 떨기가 모두 거꾸로 서 있었다. 은신대의 서쪽에는 바둑판같이 네모진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전해오는 말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좌선한 곳이라고 하였다. 그 북쪽에는 청학대(靑鶴臺), 법화대(法華臺) 등이 있었는데 도처에 바위 구멍이 뚫려 있어 배와 등을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 절정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손으로 땅을 짚고 팽조(彭祖)가 우물을 굽어보듯 하였다. 한식경 후에 다시 비탈길을 타고 내려와 밤에 선생을 모시고 문수암에서 유숙하였다.23일 정묘에 일기가 청명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흰 구름이 무럭무럭 올라와 일만 골짜기가 모두 평평하였고 일천 봉우리가 아득한 운해 가운데에 드러났다. 정히 만경 바다위에 파도는 고요한데 여러 섬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과 같았다. 조금 후에 흰 구름이 바람에 따라 몰려 들어와서 두 언덕을 분변할 수 없었으며 아침 햇발이 비치는 곳에 가닥가닥 가루와 같이 풍겨서 붉은 상서의 기운이 혹은 서리고 혹은 나부껴 경각 사이에 만 가지 형태로 변했다.한퇴지(韓退之)의 시에 이른바 ‘비낀 구름 때로는 평평하게 어렸네(橫雲時平凝)’라는 구절도 족히 그 기묘함을 형용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선생이 머리에 폭건(幅巾)을 두르고 난간 앞에 앉아 사방을 돌아보며 이상히 여겨 절귀일수(絶句一首)를 지었다. 해가 서너발 올라오니 구름의 형세가 점점 엷어지다가 잠깐 사이에 홀연히 흩어져 환연히 홍몽(鴻?)이 열려 천지가 비로소 정해진 듯 하였으니 참으로 일대장관이었다. 선생이 광석대(廣石臺)로 자리를 옮길 것을 분부하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시를 화답하게 했으며 시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벌주 일대백(一大白)을 마시기로 드디어 시령(詩令)을 내렸다. 서석산의 대략은 이미 매일 일기에 실렸은즉 더 논평할 것은 없을 듯한데 서봉사의 풍수동(風水洞)과 향적사(香積寺)의 고목과 불영암(佛影庵)의 기암과 보리암(菩提庵)의 석굴도 그 그윽한 풍경이 금석사(錦石寺) 등 여러 사찰만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저것은 활달하고 이것은 아늑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날 선생이 장차 적벽에 유람하려 했으나 탐승의 겨를이 없어 산천초목으로 하여금 돌아보며 애완하는 영광을 입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한갓 우리의 유감만 되겠는가? 또는 이 산의 불행일 것이다.광석대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니 여기가 송하대(送下臺)이며 이로부터 동으로 지향하여 산등성이를 따라 영신동(靈神洞)에 다다른 즉 오솔길이 가느다란 선과 같이 굽이굽이 얽혀 있다. 참으로 동파(東坡)의 시에 이른바 ‘길은 산허리를 감아 삼백 굽이쳐 돌았구나(路轉山腰三百曲)’라는 구절은 이 같은 곳을 지적한 것이리라. 영신동으로부터 방석보(方石洑)에 당도한즉 그 사이의 마을은 모두 시냇물을 끼고 있었고 돌밭과 띠집의 풍경은 소슬하며 닭과 개는 손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비록 무릉의 주진촌(朱陳村)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었다.동구에서 나와 시냇물을 따라 남으로 거의 백보를 달리니 중첩한 봉우리가 벽적과 같았는데 늙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그 정상을 덮었으며 석벽이 마주 얽힌 사이로 한가닥 길이 겨우 통하여 주민들이 이 길을 경유하여 오르내리고 있었다. 장불천(長佛川)이 그 아래를 감돌아 깊은 연못을 이루어 밑을 측량할 수 없었으며 띠집과 흰 용마루가 푸른 수풀 밖으로 은은히 보였으니 완연히 일폭화경이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몽교(夢橋)이니 명칭도 또한 아담하여 시의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시냇물을 격하여 동쪽을 바라본즉 푸른 석벽이 수백보를 연달아 채색병풍을 전개한 듯 했으며 그 위에 한 가닥 조그만 길이 있었는데, 이른바 노루목 고개였다.노루목을 넘어 남으로 접어들매 푸른 신나무와 늙은 소나무가 석벽에 비껴 그림자가 거꾸로 연못에 잠겨있다. 옛날 남장포(南張甫, 자는 彦紀)가 이곳을 지나다가 창랑이라 명칭하였다. 남령(藍嶺)과 장불(長佛) 두 시냇물이 이곳에서 합류되는데 장불천은 야공(冶工)이 쇠를 달구어 물에 담그는 때문에 때로는 물빛이 흐리므로 이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층암으로 된 언덕이 준급하게 연못 가운데로 뻗어 들어가 층계를 이루었고 한 떼의 큰 물고기가 바야흐로 그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햇빛이 물결을 뚫고 바위 위에 그림자가 일렁거리매 비단결같이 찬란했으며 은어 수십마리가 또한 활발하게 뛰고 놀았다. 내가 비록 물고기는 아니었으나 또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것만 같다.적벽에 당도하니 현령 신군 응항(縣令 申君 應亢)이 먼저 이르러 장막을 치고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이 보건대 옹성의 산은 순전히 바위로 되어 첩첩한 봉우리가 혹은 낮고 혹은 높아 형세가 마치 진마(陣馬)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이 절벽이 된 듯 홀연히 높이 솟았다. 그리하여 수리를 뻗어내려 종횡으로 뒤얽힌 형세가 위로는 하늘에 연달았고 아래로는 티끌세상을 진압했으니, 만약 조화의 원기가 뭉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장엄할 수 있겠는가? 그 높은 곳은 대략 눈어림으로 거의 70장이 되며 창랑의 물이 굽이쳐 돌아 물빛이 검푸르니 마음에 두려워 굽어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전하는 말에 ‘이 적벽은 가운데가 텅 비어 속삭이는 말과 조그만 소리도 문득 메아리친다’고 하였다. 동복현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퉁소를 불게 하고 또 돌을 굴러 내리게 하니 서로 맞부딪혀 진동이 심하게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렁거려 노기가 치솟으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적벽은 고을과 상거가 10여리 떨어져 땅과 궁벽지고 사람의 자취가 드물었다. 늑대와 호랑이가 들끓고 족제비와 박쥐가 우글거리니 화전민들만이 그 사이에서 구차히 살고 있었다. 장원(長源, 金濤의 자로 고려 공민왕 때 사람)이 한번 세상을 떠난 후에 뒤를 이어 감상할 자가 없으니 풍류객의 자취가 끊어진지 거의 수백 년이 되었다. 최사인 신재(崔舍人 新齋, 이름은 山斗)가 중종 기묘사화에 걸려 이 고을로 정배되었는데, 하루는 손님과 동반하여 달천(達川)으로부터 물의 원류를 더듬어 이 명승을 찾아내는 데 이르렀다. 이에 남방 사람들이 비로소 적벽을 알게 되어 시인 묵객의 노는 자취가 잇달게 되었으니 임석천(林石川)이 명(銘)을 짓고 김하서가 시를 지어 드디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아! 무창(武昌)의 적벽은 황강(黃岡) 만리 밖에 있어 남만지대(南蠻地帶)의 장연(?烟)이 자욱한 곳이었으나 다행히 소동파의 전후 적벽부(前後赤壁賦)를 힘입어 마침내 천추에 명성을 떨쳤으니, 시운은 통달하고 비색함이 있으며 지리도 밝고 어둠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적벽의 동쪽에 오봉사(五峰寺)가 있는데 선생의 수종자에 희경(希慶)이라는 자가 있어서 시를 짓는데 조예가 있어 명구가 많았다. 오후에 동복현감과 작별하고 참현(岾峴)을 넘어 이참(耳岾)을 지나니 시내 위에 조그만 정자가 있었다. 이 정자는 마을 사람 정필(鄭弼)이 세웠고 민응소(閔應韶. 이름은 德鳳)가 수령으로 있을 때에 이구암(李龜巖, 이름은 楨)과 더불어 감상했는데 지금도 시판이 벽상에 걸려있다고 하였다.이날 찰방은 용무가 있어 동복으로 향하고 해가 저물어 창랑의 유정(柳亭, 진사 丁?壽의 별장)과 무염(無鹽)의 석탄(石灘)을 관상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이번 유람길의 한 가지 결흠이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갈 무렵 소쇄원에 투숙했다. 이는 양산인의 옛 농장이었다. 시냇물이 정사의 동쪽으로부터 흘러왔는데 담장을 뚫고 끌어들여 비단결 같은 물줄기가 뜰 아래로 감돌았으며 맑은 물소리는 구슬을 굴리는 듯 하였다. 그 위에는 조그만 다리가 놓여 있었고 다리 아래에는 바위가 오목하게 패여 조담(槽潭)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물이 조그만 폭포가 되어 쏟아내리니 그 소리가 영롱하여 거문고를 울리는 듯 하였다. 조담의 위에는 노송이 굽어서 일산을 편 듯 연못을 걸쳐 비껴있었고 조그만 폭포의 서쪽에는 아담한 서재가 있었으니 완연히 화방(畵舫)과 비슷하였다. 그 남쪽에는 돌을 높게 쌓아 조그만 정자를 세웠는데 형상이 일산과 같았으며 처마 앞에는 벽오동이 서 있는데 고목이 되어가지고 반쯤 썩어 있었다. 정자 아래에는 조그만 연못을 파고 나무 홈통으로 시냇물을 이끌어 대었으며 연못의 서쪽에는 죽림이 있어 큰 대 백여 그루가 옥롱과 같이 서 있었다. 참으로 완상할 만하였다. 죽림의 서쪽에는 연지가 있는데 둘레를 돌로 쌓고 시냇물을 끌어들여 조그만 연못을 이루었다. 죽림 아래를 거쳐 연지의 북쪽을 지나니 또 물방아 한 채가 자리잡아 보이는 바가 소쇄하지 않음이 없었다. 김하서의 40영에 그 아름다운 풍치가 모두 그려져 있다. 주인 양군(梁子亭)이 선생을 위하여 간소한 연회를 베풀었다.이날 저녁에 비로소 식영정에 당도하였으니 곧 강숙(剛叔)의 별장이었다. 선생이 난간에 의지하여 한가로이 감상했으며 밤에는 서하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질탕히 놀다가 흥이 다하매 자리를 파했으니, 이 또한 일시의 거룩한 일이었다. 식영정과 서하당의 두 편액은 모두 박공(朴詠)의 글씨로서 정자는 팔분(八分)이요, 당은 전자(篆字)로 되어 있었다. 무릇 식영정과 서하당의 아름다운 풍치는 이미 석천의 기문에 소상히 실려 20영과 8영 가운데에 섞여 나와 있으니 이제 어찌 새삼스레 말을 첨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후에는 돌로 몇 계단을 쌓아 모란, 작약, 월계화, 일동, 철쭉 등을 심었는데 모두 특수한 품종으로서 번화하지 않고 청수하여 자연의 미를 갖추고 있었다. 서하당의 서북방에는 10여평 되는 연못이 있는데 4~5줄기의 백련이 심어져 있었고 대 홈통으로 샘물을 이끌어 뜰 아래를 거쳐 연못으로 끌어왔으며 연못의 남쪽에는 벽도(碧桃)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서쪽에는 금앵수(金櫻樹) 몇 그루가 있어 담장 위로 뻗어있었다. 식영정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날아갈 듯한 정자가 있었고 그 앞에는 큰 반석이 시냇물을 가로막았으며 아래에는 맑은 웅덩이가 있었다. 이는 곧 김사문(金斯文) 윤제(允悌)의 고택으로서 환벽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신영천(申靈川, 이름은 潛)이 쓴 글씨라고 했다.24일 무진 일기가 청명하였다. 아침에 창평현령 이공(李公, 이름은 孝?)이 찾아와 선생을 배알하고 인하여 서하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일원(一元)이 소쇄원으로부터 뒤에 이르러 대백으로서 몇 잔을 연거푸 기울였으며 술이 거나하게 취하매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판관이 최후에 일어나거늘 나와 강숙이 이를 만류하고 식영정에 올라가 다시 술자리를 열매 술잔이 오가며 환담과 해학이 벌어졌으니, 장자의 이른바 ‘불을 쪼이는 자는 아궁이를 다투고 관부에 있는 자는 자리를 다툰다’는 말이 과연 틀림없었다. 내가 만취하여 소나무 아래에 누워 깜박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어나 보니, 이에 남가일몽이었다. 빈 산은 쓸쓸하고 소나무 소리는 그윽한데 우두커니 서서 허전한 느낌이 있었으며 상봉을 돌아보매 드높은 봉우리는 변함없이 푸르렀다. 명승에 유람한 일을 추상하건대 이미 옛 자취를 이루어 다시 알 수 없었다.이에 유람의 전말을 대략 서술하여 기행문을 삼았다. 다른 날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뵈올 연분이 없을 때에 이 기행문을 펼쳐본다면 바로 옆에서 선생의 음용(音容)을 받드는 듯할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이요, 만났다가 헤어지기 쉬운 것은 인생인데 60성상이 번개같이 지나 뵈올 날이 많지 않을 것이니, 이 산에 올라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찌 금할 길이 있겠는가? 조만간 마땅히 죽장 망혜로 선생을 갈천의 고택으로 찾아가 뵈옵고 물러나와 여정(汝正) 등 제군으로 더불어 수송(愁送)의 높은 대를 더위잡고 지량의 붉은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 맑은 폭포수에 머리를 씻음으로서 내 지원을 모두 이루어볼까 하는 바이다. 선조 7년(1574) 갑술 5월 초일에 장택산인(長澤散人) 고경명(高敬命)은 기록하다. 원문[1574년/월미상/일미상] 萬曆甲戌之初夏▣ 003墨洞家上高霽峯遊瑞石錄。瑞石。山名。卽無等山也。在光州。牧使葛川林先生諱薰。安陰人。將以暇日携賓從遊瑞石。以書邀余。余念與長者期不可後。[1574년/04월/20일] 二十日[甲子] 齎遊山具先往證心寺候焉。瑞石。吾鄕之山也。自幼至長。凡幾登眺。懸崖絶壁幽磵深林將皆有屐痕履迹。然汎觀而不得要領。何異於樵童牧豎之見。獨往傷神亦未免。柳儀曹南澗之悲。謂之知山之詳則可謂之得山▣ 004之趣則未也。今幸從先生之後。拭眼改觀。怳然若飈輪羽蓋游戲於閬風玄圃之上。顧不偉歟。於是逸興飛動舊袂迅赴。日未亭午已及洞門。由樓橋以上。木益壯石益瘦。水鳴皆鏘然。方知漸入佳境也。余乃卸馬解衣。當流濯足。誦太古滄浪之詞詠。小山招隱之操。爽氣侵膚。煩惱去體。灑然有出塵之想焉。日將昃。索藜躡屩緩步而入。寺前有小橋跨澗。古木交映。愛其狀致幽▣ 005絶。瞻顧久之。寺僧初不虞余之涉其地也。遂登翠柏樓倚欄少憩。豈名樓者有取於柏樹庭前翠之句否。壁上有權興諸公詩板。蓋洪武間所題。而金公克己之作獨逸。斯非後人之憾歟。頃之。祖禪至。始掃榻。藉蒲團余困睡一霎起。則返照銜山。斷霞泛空。驚麏竄竹。倦翮投林。令人悄然不悅。古人云勝處心自哀信哉。祖禪以松醪溪蔌餉余。語及蘇齋舊遊。纚纚可聽。因禪始知▣ 006樓橋溪上有崔松巖應龍。題詩石。而以刻畫膚淺。苔蘚蝕盡。余初不識爲可恨也。寺傍有竹連山。雖渭川千畒未足多讓。甲寅春。余來遊此寺。見其節闊盈尺圍大如椽者無筭。今則䕺篠蕭蕭。無復昔日之觀矣。祖禪顧指法堂曰。此堂世傳麗初名匠所創。于今將及千歲。而棟宇階礎略不傾墊。左右寮舍不知其凡幾易。而此堂巍然獨存。寺舊有大藏經板本。又有諸經若干。函▣ 007規爲一殿閣之。今殿在而經亡云。是夕。李萬仁一元。金迥叔明。聯袂而至。入夜共宿。有老宿張燈響磬禮佛訖跪曰。山中舊設香盤以替蓮漏。第恐打更有妨客夢也。曰否。吾儕抽身塵坱。暫棲金地。耿耿淸宵。自爾忘寢。小鐘疎亮。實非惡聲。聞之足以發深省也。旣而三人話到夜分。而老宿鼻息如雷。殊可笑也。向曉。南風甚駃。余畏雨。蹴祖禪叩之。禪曰。貧道久居此山。飽諳雲物。▣ 008風雖自南。非雨候也。[1574년/04월/21일] 二十一日[乙丑] 晴。晩朝先生至。愼衡彦均。李億仁長元。金成遠剛叔。鄭庸子常。朴天挺應須。李傎汝正。安克智公達。實從焉。余謁先生于翠柏樓。樓前有古柏二章。磊砢可愛。雖未必爲麗時舊物。亦於樓名不爽也。酒數行。先生命促飯戒行。屛騶御簡。僕從以野服登筍輿。令寺僧祖禪前導指證覺寺。中路。先生坐茂樹休。擔夫應須西指一峯曰。此舍人巖。昔▣ 009登其上。石骨揷雲。壁面鑱空。棲鶻之巢。可俯而窺也。卓午到證覺寺。是日。白氣沈霾。不能遠望。而竹亭鉅野濯錦諸川皆可指點。始知所處益高所見益廣也。寺北有粉竹烏竹二種竹。粉竹取汗爲杖。甚滑膩。茶罷卽行。由梨亭上中嶺。峻塗直上迥若界天。人皆魚貫蟻附尺進尋退。及其路窮前低。劃然開豁。快若揭豐蔀而覩白日也。自中嶺隨山左轉。密林蔽虧。雲日不漏。危磴▣ 010懸虛。不履寸土。但見飛生倏閃。石髮飄翠。曳杖行吟。頓忘登陟之勞。回視躋攀中嶺之時。不啻若御輕車而馳康莊也。先生先到冷泉亭以待後者。泉在樹底生從石間。其冷冽微不及兜率。而甘美過之。兜率。寺名。在圭峯東北。今廢。有泉極泠。可以靛藍云。時諸人方渴。爭調豆屑沃之。雖金漿玉醴未足喩其快也。向晩到立石庵。楊士奇詩所謂十六峯藏寺者是也。庵後有怪石矗立。森森然若春筍爭逬。▣ 011皎皎然若芙蓉初出。遠而望之。若峨冠碩人。端笏拱揖。迫而視之。若重關鐵城。萬甲中藏。其一特立不倚。勢益孤挺。有若違世絶俗之士。離群而獨往也。尤不可曉者。四隅削出。絶類磨瑩。層疊級累。劌然如中繩墨意者。混沌之初。融結無心而偶成奇詭歟。抑亦神工鬼匠號召風霆而弄此狡獪歟。噫。孰陶鑄是。孰礱斲是。無乃如峨眉之玉扃。從地湧者乎。無乃如成都之石筍。鎭▣ 012海眼者乎。是未可知也。觀其石勢差參。䕺抽族出。雖巧歷莫能筭其曰十六峯者。特亦據其可見而存其大都焉。爾邐迤翼如如人張拱而庵也。正處其中。仰視危石。岌然如將墜。壓然凜乎其不可留也。石下有泉。凡二泓。一在庵東。一在庵西。雖大旱不耗亦一異也。離庵少北夾右立石入于不思議寺名。。方丈僅一笏。自非坐禪。不堪居也。方丈之南有石臺。平坦可坐。旁有大樹。布▣ 013陰其上。立石庵視諸寺地勢最高。可以極山海幽遐詭瓌之觀。而惜其風氣震淩。來者不能耐久也。相與步出。巖扃徘徊。屢顧惘然。如與親舊別。自立石以東。路不峻險。皆有盤石如席。平鋪側展。筇聲彭鏗。樹影婆娑。或憩或步。意行自如。乃知浪仙數憩樹邊身之句。工於模寫。情境宛然。千載在目也。薄暮。投念佛庵。一元憊甚。喘息頗急。剛叔問曰。今日遠涉險路不已勞乎。一元▣ 014閉目搖首曰。未也。衆一鬨。判官安公彦龍。察訪李公元禎。沿牒先在和順。自萬淵繞出香爐峯。歷長佛寺。纁黃追及於此庵。庵本江月所刱。而中廢者久。正德乙亥。一雄重創之。隆慶壬申。報恩重修之。傍置小院。所以結夏入定者也。訥齋嘗爲一雄作重創記。而字多殘缺可惋。庵之東。積甃彌望。號爲指空礫。亂石相撑。倚疊如山。其中嵌空。下入無底。有人誤墮樵斧。側耳聽之則▣ 015鏗然之聲逾時方絶。山中以礫名者二。在證覺東北曰德山礫。每當驟雨新晴。潛虺出曝。榛榛糾結。人莫敢近。山僧嘗見一獐過之。有物橫噬以入。目光燁然。吁可駭也。獨此礫無虫蛇蠢蠕之屬。當秋落木滿山。而恒如淨掃。不見一葉。僧輩相傳以爲高僧指空與其徒說法處云。[1574년/04월/22일] 二十二日[丙寅] 晴。朝判官與察訪徑往立石。以昨日昏黑未及探歷故也。餘人隨先生直抵上元燈▣ 016寺名。。小庵新構而矮陋。不堪憩息。先生坐庵西壇上。稍西有二檜。對樹其下有石。可以布武。少選判官察訪踵至。令官伶齊上天王毗盧二峯。橫笛數聲。縹緲如鸞笙鳳簫來自烟霄。適有一僧赴節拍舞。眞足以供一笑之樂矣。上峯之最高者三。東曰天王。中曰毗盧。其間可百餘尺。自平地望之若䨥闕者是也。西曰般若。與毗盧兩巓相去幾一匹長。其下財盈尺。自平地望之若箭▣ 017筈者是也。峯上無雜木。但有杜鵑躑躅䕺生石罅。長尺許。枝皆南靡若旗脚。以地勢高寒困於風雪而然也。時山杏杜鵑半落。躑躅始開。木葉亦不甚敷暢。峯去平地一由旬爾。其風氣迥別。如此般若峯之西地頗夷曠。峯勢斗斷。斷崖千尺。下臨無地。遙見樹頂如薺。眞南山詩所謂杉篁吒蒲蘇者也。緣崖列坐。羽觴迭飛。飄然有羽化登仙之意。斷崖之西有䕺石櫛立。高皆百尺。▣ 018所謂瑞石者此也。是日。白霾少霽。不比昨日之甚。雖不得遠窮四際。山之近者水之大者。亦略可辨。而終不能洞觀溟海。歷數漢拏諸島。以慰長風破浪之志。可勝惜哉。於是復尋前路。傍般若毗盧二峯。下出上元燈之東。歷三日庵。月臺有立石甚奇。幽閑爽塏。最出諸庵之右。禪云。住此三日可以悟道。故名金塔寺名。。在三日庵東有石可數十尺。當空獨立。諺傳其中藏九級相輪。▣ 019寺名蓋取諸此云。隱迹寺名。。又在金塔之東。正與瓮城在赤壁東北。相對。有泉噴出石竇。庚寅之旱。山中諸泉皆涸。此獨混混不渴云。石門寺名。在金塔西八十步許。東西各有奇石。雙峙如門。出入由之。錦石寺名。在石門東南。金克己詩所謂門仗嶺雲封者卽其地也。庵後有石數十條。䕺挺奇峭。其下有泉甚冽。大慈寺名。廢址在金塔下。古井澄澈。苔暈不翳。砌上有山丹方盛開。路傍有石室▣ 020可庇風雨。俗稱小隱窟。是日。余在上峯已醉。不得雍容周覽。選勝搜奇。有如走馬看錦。眩轉滅沒。徒見其輝煌燦爛之色而不識其藻繢之妙。追訪靑雲錄。其槪如此。秋來當再理謝屐以償今日之欠也。由錦石繞山麓東出是爲圭峯。金克己詩所謂石形裁錦出。峯勢琢圭成。誠非虛語也。石之奇古可與立石相埒。而其位置之寬敞。形模之瓌偉亦非立石所敢擬也。其詳見於▣ 021權公克和之記。而具載勝覽。故略之舊傳。新羅金生書庵額三大字。後爲人竊去云。廣石臺在庵西。石面如削。寬平妥帖。環而坐可容數十人。初西南隅微低。寺僧募衆揭起。負以巨石。觀其雄蟠屭贔之狀似若不容人力者。所謂三尊石正在臺南。其高上出樹梢。蒼然竦直。尤足以增臺之壯而助其氣勢也。有老樹絜之十圍。穹窿偃蹇。橫跨臺上。葉厚陰濃。凉颸自至。雖當盛暑。▣ 022御單袷者不能久坐。天冠八巓。曺溪母后諸山皆在眼底。蓋圭峯之勝旣爲瑞石諸寺之冠。而此臺之勝又夐出圭峯十臺之上。雖曰南中第一可也。恨無如崔學士者。以鸞驂鶴駕嘯咏其間。一灑醉墨於紫巖卽圭峯也。之上。如晉之雙溪。陜之紅流。惜也。臺西有石當路。如棖闑形。踰棖闑以入。卽文殊庵也。庵東有泉。在巖腹闕泐處。石菖蒲斜生四畔。前有臺高數丈。廣如之。自廣石▣ 023臺西北捫石磴。斗折數轉抵慈月庵。庵東有風穴臺。穴在石底以草承其空。微覺搖颭。庵西有立石如屛帖。別有石鋪地。老松生其上。卽藏秋臺也。俯瞰深壑。毛髮盡豎。自臺西行。緣崖南轉。小逕闊不滿尺。缺處蓋之以石。踏之軒軼有聲。下視絶陘。沈沈如漆。雖履危石。如伯昏無人亦不能立定脚跟也。崖盡有坳處。猿引而上。其南卽隱身臺。有矮松四五株。躑躅數䕺。皆倒生。臺▣ 024西有石方整如棋局。人言道詵坐禪處。其北卽靑鶴法華諸臺所在。穿巖孔腹背俱盪磨。然後達于頂。人皆戰悸。以手據地。若彭祖觀井狀。良久復自崖坳下。夜陪先生宿于文殊庵。[1574년/04월/23일] 二十三日[丁卯] 晴。朝起見白雲騰湧。萬壑皆平。碧峯千點微露於杳靄之中。正如滄溟萬頃。波濤不驚。而島嶼橫陳也。少焉。隨風坌入。兩崖不辨。朝暉所射。縷縷霏霏。異氣紫赤。輪囷飄簸。頃刻萬狀。▣ 025退之所謂橫雲時平凝者。殆未足以盡其妙也。先生以幅巾出坐前簷。顧而異之爲賦一絶。日高三竿。勢漸疎淡。轉眄之間。倏忽消散。煥然若鴻濛始闢而天地初奠。眞絶觀也。先生命移席廣石臺。令諸人屬和。詩不成者。罰一大白。遂著爲令。山之大槪已附於逐日之下似無餘蘊。而瑞峯之風水洞。香積之古木。佛影之奇巖。菩提之石窟。其幽勝不下於錦石諸庵。而但彼豁而▣ 026此奧爲少異也。是日。先生將遊赤壁。未暇探討。使溪山草木不得衣被顧眄餘光。豈徒吾儕之憾。抑亦玆山之不遇也歟。自廣石臺南下是爲送下臺。自此東迤。循山脊趨靈神洞。細路如線。紆縈屈蟠。眞坡詩所謂路轉山腰三百曲者也。自靈神洞抵方石洑。其間村落皆竝水而居。石田茅屋。人烟蕭瑟。鷄犬相忘。雖武陵朱陳未必勝此。出洞沿溪南馳約五百弓有疊壁如襞積。▣ 027古松鬱盤覆其巓壁間。摺縫一徑纔通。居人由之上下。長佛川匯其下爲深潭。渟泓不測。茅茨白脊隱映於靑林之表。依然一生色畫也。村號夢橋亦甚雅。可供詩料。隔溪東望有翠壁連延數百步。若綵屛斜展不盡。上有鳥道卽所謂獐項峙也。歷鳥道折而南。靑楓古松側垂。壁面倒蘸潭底。昔南張甫彦紀。過此。創名之曰滄浪。以藍嶺長佛二川合流于此。而長佛川爲汰鐵者所▣ 028溷。有時而濁。故名斷岸。斗入潭中。層級若階砌。大魚一隊方游泳其下。日光下透影鋪石上。爛如雲錦。銀唇數十尾亦潑剌跳擲。余雖非魚。亦可以知魚之樂也。到赤壁。縣宰申君應元亢至。張幙以候。嘗見瓮城一山。純以石爲骨。層峯疊障。低昂起伏。勢如陣馬齊驅。萃而爲此壁。截然屹立。延袤數里。其橫張盤錯之勢。上磨靑蒼。下壓鴻厖。若非造化元氣之所鍾。烏能如是之壯▣ 029哉。其高處續蔓。測之幾七十丈。滄浪之水蜿蜒赴之。其深黛黑。▼(忄+雙)難俯視。人言壁中空洞。細語微絃。動輒響荅。同福使於高處捻簫。又令轉石下之舂撞震撼。風起水涌。怒氣噴薄。聲如萬雷。壁去縣郭十餘里而地在荒崖。人迹罕至。豹虎之所窟。鼪鼯之所竄。但有傖叟田更傲睨淟涊於其間。長源金濤號。蘿葍山人。恭愍朝人。一逝。繼者無人。賞音寥寥將數百年。新齋崔舍人山斗。罹己卯之▣ 030禍。編管此縣。一日拉客自達川窮源而得之。於是南人始知有赤壁。而騷人墨客遊躅相踵。林石川銘之。金河西詩之。遂爲南國名區。噫。武昌赤壁在黃岡萬里之外。湮沒於蠻烟蜑音誕。雨之鄕。幸賴坡仙二賦。終能聲播天壤。時有通塞。地有顯晦。理固然也。壁東有五峯寺。先生有從者名希慶。頗曉賦詩。多警句。午後與同福別。踰砧峴。過耳岾。見溪上有小亭。乃村人鄭弼所構。閔▣ 031應韶德鳳。爲縣時。與李龜巖楨。登賞。今有詩板揭壁云。是日。察訪以事向同福。日晩不得歷賞滄浪之柳亭進士丁嵒壽別業。無鹽之石灘縣監宋庭筍卜築于此。。實今行之一欠也。晡時投瀟灑園。乃梁山人山甫。舊業也。澗水來自舍東闕墻。通流㶁㶁。循除下上有略彴。略彴之下。石上自成科臼。號曰槽潭。瀉爲小瀑。玲瓏如琴筑聲。槽潭之上。老松盤屈如偃。蓋橫過潭面。小瀑之西有小齋。宛如▣ 032畫舫。其南累石高之。翼以小亭形如張傘。當簷有碧梧甚古。枝半朽。亭下鑿小池。刳木引澗水注之。池西有鉅竹百挺。玉立可賞。竹西有蓮池。甃以石引。小池由竹下過蓮池之北。又有水碓一區。所見無非瀟灑物事。而河西四十詠盡之矣。主人梁君子渟。爲先生置酒。日夕始到息影亭。卽剛叔別墅。先生倚檻寓賞。頗極從容。夜入棲霞堂。秉燭窮歡。興闌而罷。斯亦一時勝事也。▣ 033息影棲霞二額皆朴公詠。所題。而亭則八分而堂則篆也。凡亭若堂之勝。已悉於石川之記而雜出於二十詠。八詠之中奚容贅焉。堂後石砌數級。植以牡丹芍藥月季花日東躑躅皆殊品。不繁而麗。有自然之勝。堂之乾隅。方塘半畒。種白蓮四五莖。以竹筧走泉。伏流階下而入于塘。塘之南有碧桃一株。其西有金櫻樹數本。蔓延墻上。自息影南望有亭翼然。前有盤石捍流。下▣ 034有澄湫。卽金斯文允悌故居。申靈川潛。扁曰環碧云。[1574년/04월/24일] 二十四日[戊辰] 晴。朝昌平縣令李公孝讜。來謁先生。因觴于棲霞堂。一元自瀟灑後至。浮以巨觥。酒半先生起。諸人隨之判官。後余與剛叔遮挽上息影亭。更酌觥籌交錯。歡謔備至。蒙莊所謂煬者爭竈舍者爭席者果有之矣。余醉臥松下。黑甜方酣。蘧然形開。乃一場南柯也。空山悄然。松籟幽咽。黯然佇立。若有所喪。回視上▣ 035峯。巍然蒼翠。故自若也。而追思勝遊。已成陳迹而不可復識矣。略敍其經過顚末以爲行錄。庶幾他時。景慕先生而冥鴻壤虫。影響無緣。時展此編。有若親承謦欬於其側。豈不幸哉。噫。峙而不動者。山也。聚而易散者。人也。六期電邁。舋沐無多。登此山而懷此人。烏可已也。早晩當以靑鞋布襪拜公于葛川之故第。退而與汝正諸君攀愁送之高臺。踏智雨之丹梯。濯髮於長水之▣ 036瀑。以畢吾志焉。是歲端陽初吉。散人長澤高敬命識。墨洞家上。
- 2018-08-01 | NO.642
-
- 고광선-戒兒曹 아이들을 경계함
- 古苑有雙木 고원유쌍목 옛날부터 뜰에 나무가 둘 있었다. 今朝盡伐之 금조진벌지 오늘 아침 그들을 모두 잘라서其一犧樽作 기일사준작 하나는 제사용 잔을 만드니靑黃文彩奇 청황문채기 푸르고 누른 무늬 훌륭하였다. 其一委諸壑 기일위제학 하나는 구렁에 되는 대로 두었더니汚泥朽敗宜 오니후패의 더러운 흙 속에서 썩는 게 당연하지. 均是一般木 균시일반목 이들은 둘 다 한 가지 나무거늘尊卑隋作爲 존비수작위 만듦에 따라서 귀해지고 천해졌다. 奚獨木而己 해독목이기 어찌 유독 나무뿐이랴.人生亦若斯 인생역약사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異日貴與賤 이일귀여천 다른 날에 귀하고 천해지는 것은在於各所思 재어각소사 각자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戒爾羣兒輩 계이군아배 여러 아이들에게 경계를 전하니勉旃念在玆 면전염재자 생각을 이에 두고 근면할지니라.*2018.11.25. 수정
- 2018-07-13 | NO.641
-
- 고광선-掩耳洞十詠
- ①寒泉 한천 掩耳洞中老 엄이동에 사는 노인이 無端日弄波 무단히 날마다 물결을 희롱한다. 雖爲水所辱 물은 비록 욕을 당해도 不害其淸何 어떻게 그 맑음 잃지를 않는가? ②山月 산월 寂寞夜山齋 적막한 밤 산 속 집 孤吟頻蹴月 외로움에 읊조리며 달을 자꾸 밟지만. 月應不介嫌 달은 싫은 내색 하나 없어 自愧尋常發 부끄럼에 늘 그렇듯 자리를 뜬다 ③芭蕉 파초 堪燐數葉蕉 몇 잎 파초가 안타깝게도 僻處棘林中 가시밭 속 궁벽한 곳에 피어 있다. 愧吾無所似 부끄럽게 나는 본받지 못해 未作橫渠翁 아직도 횡거노인 되지 못했네.④梅花 매화 疎枝寒査月 차가운 달빛에 성긴 가지 살펴보니 能作大明春 따뜻한 봄소식 지어낼 수 있겠다. 愧此塵容客 세속의 이 나그네 반겨 맞는데 反爲剪伐人 도리어 가위들고 잘라내게 되었네. ⑤老松 노송 滿天白雪裏 천지에 가득 흰눈이 덮이었네 藏得獨靑期 감추인 그 속에 노송 홀로 푸르리. 斤斧休相伐 낫이며 도끼도 서로 베지 말자는 건 何曾伍凡枝 어찌 뭇가지와 한 무리랴 싶어서네. ⑥碧梧 벽오동 庭前早種意 일찍이 뜰 앞에 벽오동 심은 뜻은 擬見瑞禽來 상서로운 날새나 깃들까 해서였네. 邈矣高岡外 날새는 저 산 바깥 아득하기만 한데 抵欣霽月開 비 개고 달 떠오니 그것이 오직 좋네. ⑦錦城落照 금성낙조 錦峀半殘景 금성산 바위굴 반 남은 풍경이 猶能返照明 아직도 노을 속에 되비쳐 오네. 傀吾衰且病 가련하다 이 몸은 쇠약하고 병들어서 臨履難爲情 바장이며 구경하기 뜻같이 않다네. ⑧池蓮 지련 最憐一藕蓮 참으로 가련하구나 한 줄기 연꽃 曾不汚泥染 일찍이 더러운 흙에 물들지 않았는데 石澗僅存生 돌틈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건 恐爲衆卉厭 뭇 꽃들 싫어함이 두려워선가. ⑨紅桃 홍도 前春培植意 지난 봄에 심어서 길렀던 뜻은 竊欲侈吾軒 내 집 한번 남몰래 꾸며보자 해서였네. 軒侈還爲辱 집 치장 도리어 욕이 된다면 不如早晦根 일찌감치 뿌리가 마르니만 못하리. ⑩野霞 노을 晩起掩疎箔 날 저물자 엷은 금박 일어나네 高山盡沒霞 높은 산에 노을이 걷히는 것을. 爲山雖可愧 산은 비록 부끄럽다 말할지라도 霞盡山更佳 노을 걷힌 산도 또한 아름답다네. -현와유고(弦窩遺稿)
- 2018-07-13 | NO.640
-
- 고광선-掩耳齋原韻
- 結盧掩耳洞 엄이동 골짜기에 띠집을 지어 놓으니 日與洞雲隣 날마다 골짜기는 구름과 이웃 하오明月寒泉夜 밤이면 밝은 달 찬 샘물에 뜨고 流霞孤島晨 새벽이면 외로운 섬에 노을 흐르네.巖間垂死跡 바위틈에 죽은 자취 드리우는데 世外一遺民 나라 잃고 세상 등진 백성의 모습이라不道腥塵語 더러운 세상사 더 이상 말하지 마오 山光太古春 산 빛은 아득히 먼 옛 봄이라오.-현와유고(弦窩遺稿)현와 고광선(高光善, 1855~1934)은 본관은 장택(長澤). 자는 원여(元汝), 호는 현와(弦窩)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마을에서 태어나 공부를 하고 후학을 가르쳤다. 문인이 650여명에 이르고 후학들이 1935년 영당을, 1964년에 봉산사를 세웠으나 2016년에 무너졌다.
- 2018-07-13 | NO.639
-
- 고광선-省蘆沙先生墓遺感 二首
- 一聲慟哭銷靑山 일성통곡소청산 한바탕 통곡소리 청산에 흩어지고 感淚徒傷咫尺閒 감루도상지척한 지척에 있는 제자들이 슬피 우도다. 若使九原靈不昧 약사구원령불매 만일 구천의 영혼이 어둡지 않으시면 應知小子此時還 응지소자차시환 소자가 이때 오는 줄 응당 아시겠지. 音容永邈此江山 음용영막차강산 그 목소리 그 모습이 강산에 아득하나 懷思莫禁方寸間 회사막금방촌간 (스승을)그리워함은 가까이 가지 못함이라永失平生依仰地 영실평생의앙지 평생토록 의지하고 우러를 곳 영영 잃어 徊徨半日未堪還 회황반일미감환 한 나절 방황하며 돌아갈 길 찾지 못하네. -현와유고(弦窩遺稿)2019.1.13. 수정
- 2018-07-13 | NO.638
-
- 고광선-謹次益齋李先生影幀韻
- 嗟我先生道 아, 우리 선생이 가신 길은 海東百世春 해동에 백세토록 영원하도다. 五朝冢宰積 다섯 왕 총재로서 이룬 업적 十分事功神 그 공 귀신을 섬겨도 충분하리. 模月難模色 달은 본떠도 색깔은 본뜨기 어려우리 畵龍只畵身 용을 그린 것인지 단지 몸을 그린 것인지徒將遺像得 유상을 그리려는 사람들아 敢告後來人 나중 사람에게는 감히 알려 주게나. -현와유고(弦窩遺稿)
- 2018-07-13 | NO.637
-
- 고구려 때의 광주 - 해동역사(海東繹史) 제6권
- 해동역사(海東繹史) 제6권 : 옥유당(玉蕤堂) 한치윤(韓致奫 1765~1814)과 그의 조카인 한진서(韓鎭書) ○ 위 고조 때 고구려 왕 고련이 바치는 공물이 전에 비해 배로 늘었고, 그에 대해 보답으로 내리는 것도 점점 불어났다. 이때에 광주(光州)의 관리가 고구려 왕 고련이 숙도성(肅道成)에게 파견한 사신 여노(餘奴) 등을 바다에서 잡았다. 이에 고조가 조서를 (조서는 예문지(藝文志)에 상세하게 나온다) 내려 고련을 꾸짖었다. *《후위서》 ○ 살펴보건대, 고구려사에는, “장수왕 68년 4월에 남제에서 왕에게 표기대장군을 책봉하였다. 이에 왕이 사신 여노(餘奴) 등을 보내어 들어가서 사례하게 하였는데, 광주(光州)의 바다에 이르러서 위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하였다. ○ 위 정광(正光) 원년 (안장왕 2년)에 광주(光州) 해상에서 또 소연(蕭衍)이 고안에게 주는 영동장군(寧東將軍)의 의관과 칼, 패물(佩物) 및 사신으로 가던 강법성(江法盛) 등을 잡아 경사(京師)로 보내었다. ,《후위서》 [주-D070] 소연(蕭衍) :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이름이다.*중국의 광주를 말한다.
- 2020-09-29 | NO.636
-
- 고대일록 - (광주일기 정리)
- 고대일록 - (광주일기 정리) : 정경운(鄭慶雲 : 孤臺, 1556~?)1593년 6월 22일 을사(乙巳)왜적의 한 무리가 진주(晉州)로 쳐들어와서는 성의 동북(東北)을 포위했다. 절도사(節度使) 최경회(崔慶會) 등이 힘을 다해 방어하니, 적들은 향교동(鄕校洞)에 모여 진을 쳤다. 왜적의 다른 한 무리가 삼가(三嘉)로 쳐들어가서 제멋대로 노략질을 하니,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가는 것과 같아 막을 사람이 없었다. 나머지는 몇 개 고을에 있으니, 위태로움이 마치 철류(綴旒)와 같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은 광주 목사(光州牧使) 장의현(張義賢)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운봉 지역에 매복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인심이 더욱 허물어져 행여 산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했다.○ 6월 23일 병오(丙午)명나라 병사 한 사람이 왜적들의 소식을 상세하게 묻고, 전라도로 내려온 명나라 군대와 함께 모의해서 하도(下道)의 적을 공격하고자 했다. 묘시(卯時)에 군(郡)에 당도해 곧바로 남원(南原)으로 향했다. 나도 성(城)안으로 들어가 그의 면모를 보고 말을 들어 보았는데, 통역에 의지해 말을 하는 바람에 표현을 다 하지 못했으니, 탄식할 일이다. ○ 광주 목사(光州牧使) 장의현(張義賢)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함양(咸陽)에 주둔하였다.1595년 8월 16일 병진(丙辰)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났다. 향사당(鄕射堂)에 갔다. 마침 서울에 사는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鄭)은 무과에 급제한 진사(進士)이다.] 이날 김응구(金應久)가 부모상을 당하였다.1596년 7월 13일 무인(戊寅)충용장(忠勇將) 김덕령(金德齡)이 군(郡)에 이르렀다.○ 7월 15일 경진(庚辰)큰비가 내렸다. 김덕령(金德齡)이 운봉(雲峯)으로 향해 비전(碑殿)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호서(湖西)의 적 우두머리가 이미 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홍산(鴻山)에 사는 이몽학(李夢鶴)이 몰래 반역의 뜻을 품고서 오합(烏合)의 무리를 모으니, 수천여 명에 이르렀다. 연이어 두 군(郡)을 함락하고 사방으로 공격하며 겁을 주니, 대흥(大興)ㆍ청양(靑陽)ㆍ정산(定山)ㆍ부여(夫餘) 등의 영장(令長)들이 기세만 보고도 달아났다. 충청 병사(忠淸兵使)가 금강(錦江)에 진(陣)을 치고 여러 날을 서로 대치했다. 홍주(洪州)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김모(金某)가 서울에서 오다가 적에게 사로잡혔다. 겉으로 투항하여 들어가 용기와 지략을 보이니, 도적이 크게 기뻐하며 심복으로 삼았다. 촌집에서 함께 잘 때 사복(司僕) 김모(金某)가, 달게 잠을 자는 틈을 엿보아 몽학(夢鶴)을 참수하여 아군(我軍)에 고하였다. 아! 한 필부(匹夫)가 사람을 무리 지어 가만히 발호하니, 호서(湖西) 주군(州郡)의 수령들이 기세만 바라보고 달아났는데, 일개의 사복이 마음을 다해 적을 잡았는데, 손 한 번 드는 사이에 평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윗사람이 된 이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7월 25일 경인(庚寅)한 고을 사람들이 서로 읍(揖)하고 헤어졌다. 나는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녘〔晡時〕에 승지(承旨) 서성(徐渻)이 충용장(忠勇將)을 체포하려고 군(郡)에 도착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적들이 공초(供招)한 말에 ‘김덕령(金德齡)은 호남(湖南)에서 거병하고, 홍계남(洪季男)은 영남(嶺南)에서 거병한다.’는 말이 있었다. 덕령이 실제로 간여한 행적이 있다면, 거열형(車裂刑)을 준들 무엇이 애석(哀惜)하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러한 행적이 없는데도 마구 떠드는 말만 믿었다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막심(莫甚)할 것이니 가련하다.○ 7월 26일 신묘(辛卯)승지(承旨) 서성(徐渻)이 운봉(雲峰)으로 가서 김덕령(金德齡)을 잡아갔다. ○ 광주(光州)에 사는 무진사(武進士) 이완근(李完根)이 조카딸 집에 와서 잤다. 조용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1600년 5월 7일 기유(己酉)우상(右相) 이항복(李恒福)이 체찰사 겸 주사도원수(體察使兼舟師都元帥)로서 광주(光州)에 진(鎭)을 쳤다.1608년 3월 11일 무술(戊戌)전라도 유생들이 좌우로 나아가 광주(光州)에 모여서 상소를 올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선생께서 영경(永慶)의 간흉함을 미리 보았음을 밝혔다.
- 2020-10-04 | NO.635
-
- 고대일록 부록 인명록 (광주일기 정리)
- 고대일록 부록 인명록 (광주일기 정리) : 정경운(鄭慶雲 : 孤臺, 1556~?)고경명(高敬命) : 1533~1592.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ㆍ태헌(苔軒). 시호는 충렬(忠烈).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고 왕이 의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각처에서 도망쳐온 관군을 모았다. 두 아들 종후(從厚)ㆍ인후(仁厚)로 하여금 이들을 인솔, 수원에서 왜적과 항전하고 있던 광주 목사 정윤우(丁允佑)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전 나주 부사 김천일(金千鎰)ㆍ전 정언 박광옥(朴光玉)과 의논하여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6000여 명의 의병을 담양에 모아 진용을 편성하였다.고종후(高從厚) : 1554~1593.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도충(道冲). 호는 준봉(準峰). 시호는 효열(孝烈).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은 전라도 관군을 인솔하고 서울로 향하다가 공주에 이르렀을 때, 왕이 북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하였는데, 그는 아버지 경명의 뜻에 따라 아우 인후(因厚)와 함께 각지에 흩어진 군졸들을 설득하여 다시 모아, 수원에 있는 광주 목사 정윤우(丁允佑)에게 인계하고, 돌아오는 길에 태인에서 경명의 의병군과 합류하였다.권율(權慄) : 1537~1599.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ㆍ모악(暮嶽). 시호는 충장(忠莊). 임진왜란 때 광주 목사, 전라도 순찰사, 도원수 등을 역임하며 임진왜란 7년간 군대를 총 지휘한 장군으로, 바다의 이순신과 더불어 역사에 남을 전공을 세웠다.김덕령(金德齡) : 1567~1596.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본관은 광산. 자는 경수(景樹). 광주출신. 시호는 충장(忠壯). 20세에 형 덕홍(德弘)과 함께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高敬命)의 막하에서 전라도 경내로 침입하는 왜적을 물리쳤다.정충신(鄭忠信) : 1576~1636.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晚雲).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 2020-10-04 | NO.634
-
- 고대일록 제3권 / 무술(戊戌, 1598) 겨울 10월 -광주 목사 이정신
- 고대일록 제3권 / 무술(戊戌, 1598) 겨울 10월 ○ 10월 8일 경신(庚申)우의정(右議政) 이덕형(李德馨)이 장계를 올려 전주 부윤(全州府尹) 김협(金)을 파직하고,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상길(李尙吉)을 품계를 올려 제수할 것을 청했다.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정신(李廷臣)은 직질(職秩)과 사람됨이 서로 걸맞은 듯하지만, 결국 상길이 본도의 일에 익숙한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 2023-12-04 | NO.633
-
- 고대일록 제3권 / 무술(戊戌, 1598) 광주 목사 김형진
- 고대일록 제3권 / 무술(戊戌, 1598) 가을 9월○ 9월 3일 을유(乙酉)호남(湖南) 순찰사(巡察使)가 도내의 어진 수령(守令)을 뽑아 장계(狀啓)를 올렸다.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상길(李尙吉)ㆍ광주 목사(光州牧使) 김형진(金珩鎭)ㆍ진안 군수(鎭安郡守) 오익승(吳翼承) 등에 대해 특별히 두드러진 점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포상(褒賞)을 청하였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2023-12-04 | NO.632
-
- 고대일록 제3권 / 무술(戊戌, 1598)-익산군수가 광주 목사로
- ○ 11월 3일 갑신(甲申)익산 군수(益山郡守)가 광주 목사(光州牧使)를 제수 받고, 이원익(李元翼)이 영의정에 올랐으며, 이정신(李廷臣)이 전주(全州) 부윤을 제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2023-12-04 | NO.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