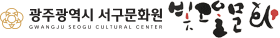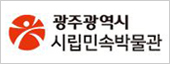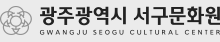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20건
-
- 왕조대와 견훤대
- 예로부터 광주에는 왕조대王祖臺라 명명하던 곳이 있었지요. 왕조대는 왕이 머문 곳 또는 왕이 군진軍陣을 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왕이란 다름 아닌 고려 왕조의 건국자인 태조 왕건을 말합니다. 이 왕조대에 얽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천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해 광주천 하류의 너른 들에서 왕건과 견휜의 군대가 결전을 앞두고 대치했지요. 광주는 견훤의 심장과 다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왕건이 나주에서 오다련의 딸(왕건의 둘째부인인 장화왕후 오씨)과 결혼했듯 견훤도 광주 북촌이란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키웠지요. 그만큼 그들에게 나주나 광주는 자신들의 정치기반을 이룬 소중한 공간이었지요. 이들은 현지인과 관계를 통해 지지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갔죠.당시 왕건과 견훤은 결전을 앞두고 지휘소를 차렸습니다. 왕건의 지휘소는 훗날 ‘왕조대’라고 하고, 견훤의 지휘소는 ‘견훤대甄萱臺’라 부르던 관행은 이때부터 비롯됐다고 보면 됩니다. 왕조대는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9세기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언급되고 있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왕조대는 광주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 지점에 있고, 견훤대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왕조대가 서창마을 북쪽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특히 여지도서’ 왕조대와 견훤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리에 있다고 명기된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훤대를 다룬 옛 문헌들은 하나 같이 그곳이 광주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견훤대는 오늘날 북구 생룡동 뒷산에 있는 토성 터일 것이란 추정이 있어요. 이 추정의 근거는 고려 충렬왕 때의 보각국사 일연一然 스님이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의 유사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견훤이 광주 북촌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물이었다고 적고 있는 점, 생룡동 근처인 담양군 대전면 사람들이 예전부터 자기 동네에 무진주의 치소治所가 있었다고 믿었던 사실, 생룡生龍이라는 동네 이름이 용, 즉 임금이 태어난 곳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룡동 뒷산에 토성의 흔적까지 있어 이런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합니다.생룡동은 옛 거리상 북쪽 40리에 있었던 동네인데 견훤대가 북쪽 15리에 있었다는 기록과 40리는 큰 차이가 납니다. 나아가 견훤대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부터 다른 주장이 있었는데 ‘대동여지도’에는 견훤대가 황계면(현재의 운암동 일대)의 남쪽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형도로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산은 대마산(일명 석산) 입니다.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光州邑誌』에 황계면은 서북쪽 20리에 있다고 했고, 18세기에 제작된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도 황계면은 관아에서 가깝게는 10리, 멀게는 15리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황계면은 옛 광주읍성의 북문을 통해 갈 수 있는 곳이므로 북쪽 20리로 추정돼 견훤대가 있다는 15리와 비슷한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기록상으로 대마산을 견훤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견훤대의 위치만큼이나 왕조대의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남구 대촌동의 백마산 혹은 그 주변의 여러 산봉우리 중 하나가 왕조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여지도서에 따르면 왕조대의 위치를 언급하며 ‘견훤대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與甄萱臺 相對]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죠. 왕건이 머문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의 봉호마을로도 또한 왕조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지도서나 광주읍지 등에는 왕조대가 광주 관아에서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했고, 김정호의 또 다른 지리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는 생압진나루가 서쪽 30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압진나루 옆에 있는 산이 사월산獅月山인 것입니다.실제 사월산 정상에 오르면 견훤대로 추정되는 대마산이 보여야 하는데 건물들로 가득 메워져 건너편 대마산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바라볼만한 거리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눈앞의 건물들이 없다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또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월산 역시 옛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과 맞서 싸울 때 전투지휘소를 차렸던 왕조대의 후보지가 될 만한 곳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사월산을 왕조대라고 꼭 집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벽진동의 사월산이나 유덕동의 덕산 등 영산강변에는 견훤과 관련된 설화가 깃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신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이 풍영정 주변의 풍광을 읊은 시詩 가운데 이 정자 앞에 과거 견훤이 왕건의 군대로부터 포위당했다가 용케 벗어난 곳이 있다고 한 구절도 있어요. 이중 유덕동 덕산도 그 후보지였겠지만 ‘대동여지도’에는 덕산과 견훤대는 전혀 위치가 다른 곳으로 표시돼 있어 그 후보지가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지도서에는 왕조대의 지명 유래가 언급되어 존귀한 이의 성명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예법에 따라 ‘왕조대’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해 원래 이름은 왕건대王建臺가 아니었나 추정하고 있습니다.※사월산은 서창동 관할인 벽진동에 소재한 산으로, 고도 101.6m로 아담하다. 광주-송정리간 도로에서 공항 혹은 순환도로 접어들기 전 좌측에 솟아있는 산으로, 광산 탁씨 시조산과 공군 탄약고 등성이를 지나 자리하고 있다.
- 2018-05-28 | NO.210
-
- 왜(倭)가 광주(光州)를 함락시켰다 - 동사강목 제17상
- 동사강목 제17상 기사년 후폐왕 창(後廢王昌) 즉위년(6월 즉위) 추7월 도당(都堂)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폐왕(廢王)에게 의대(衣帶)를 바쳤다.우(禑)의 생일이기 때문이었다. 곧 우를 여흥(驪興)으로 옮겨서 그 고을의 군사로 숙위(宿衛)하고 세(稅)를 거두어서 공봉(供奉)하게 하였다.○ 왜(倭)가 광주(光州)를 함락시켰다.
- 2020-09-15 | NO.209
-
- 왜적이 광주(光州) 등지의 군에 침구하니 - 동사강목 제16상
- 동사강목 제16상 을묘 고려 전폐왕 우(前廢王禑) 원년부터, 무진 14년 6월까지 14년간 경신년 전폐왕 우 6년(명 태조 홍무 13, 1380) 3월 왜적이 광주(光州) 등지의 군에 침구하니, 원수(元帥) 최공철(崔公哲)ㆍ정지(鄭地) 등을 보내어 막게 하였다.
- 2020-09-15 | NO.208
-
- 외증조 《제봉집》 뒤에 공경히 쓰다〔敬題外曾祖霽峯集後〕- 목재집 제1권
- 외증조 《제봉집》 뒤에 공경히 쓰다〔敬題外曾祖霽峯集後〕- 목재집 제1권 / 시(詩) :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건곤 같은 큰 절개 북두처럼 우러르는데 / 大節乾坤仰斗杓다시 시권으로 소 허리를 땀나게 하였네 / 更將詩卷汗牛腰묘함은 육마가 여지없이 밟는 데 이르고 / 妙臻六馬蹄餘地장엄함은 삼군이 기세를 모을 때에 비기네 / 壯比三軍氣欲朝서석산 높은 곳에 가을 해 밝고 / 瑞石山高秋日白구름 걷힌 남명에 푸른 하늘 아득하네 / 南溟雲盡碧天遙유풍은 원공의 편액에 모자람이 부끄러워 / 遺風愧欠袁公額붓 잡고 공연히 온갖 경치나 그려 내었네 / 握管空令萬景驕[주-D001] 제봉집(霽峯集) :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시문집이다.[주-D002] 시권으로 …… 하였네 : 원문의 ‘우요(牛腰)’는 시문이나 서책의 뭉치가 소의 허리만큼 찬 것을 이르는 말로, 시문이나 서책이 많음을 의미한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취후증왕력양(醉後贈王曆陽)〉시에 “시는 두 마리 소 허리만큼 지었다.〔詩裁兩牛腰〕”라는 말이 있다.[주-D003] 육마(六馬)가 …… 데 : 천자의 수레는 여섯 마리 말이 끈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내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두렵기가 썩은 새끼로 육마를 모는 것 같다.” 하였다. ‘무여지(無餘地)’는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마음이 한가롭고 몸이 발라서 여섯 고삐 말이 어지럽지 않은……그런 뒤에 말발굽 외에 여지가 없게 할 수 있다.〔心閑體正 六轡不亂……然後馬蹄之外可使無餘地〕”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주-D004] 서석산(瑞石山) : 광주(光州)에 있는 무등산(無等山)을 말한다. 산의 서쪽 양지 바른 언덕에 높이가 백 척이나 되는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 데서 연유하여 서석산이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光山縣》*홍여하는 영남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외증조부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제봉 고경명이다.
- 2020-10-08 | NO.207
-
- 요부(堯夫)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朴受汝)의 운에 차하다
- 요부(堯夫)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朴受汝) (중회重繪) 의 운에 차하다. 기사년(1689, 숙종 15년, 선생 83세) 6월 3일 광주(光州) 선암역(仙巖驛)에 이르러 짓다. :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분분한 말로에 도가 참되지 못했는데 / 紛紛末路道非眞*오직 주자께서 성신을 이으셨네 / 惟有閩翁繼聖神물고기 뛰고 솔개 날음 발명한 후엔 / 魚躍鳶飛揮發後천 년 동안 사람 없다 말하지 마오 / 莫言千載更無人*어떤 책에는 ‘갈림길 의혹 많아 모두 참이 아니네.[岐多路惑摠非眞]’로 되어 있다.
- 2020-09-23 | NO.206
-
- 용사호종록(龍蛇扈從錄)- 후광세첩
- 용사호종록(龍蛇扈從錄) - 梧陰公의 外交洞察力과 救國精神 - 후광세첩 제3권 / 문정공 사실(文靖公事實) : 오음 공(梧陰公) 윤두수(尹斗壽, 1533~1601)임진년(1592, 선조25) 9월에 윤두수가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은 기골(氣骨)과 도량이 있어, 참으로 장수감입니다. 전라 감사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권율로 순찰사(巡察使)를 삼았다. 《임진일록》○ 전라 감사 이광(李洸)이 군사를 거느리고 금강(錦江)에 진을 치고 있다가 뜬소문을 듣고는 진을 파하였다. 그러자 당시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던 권율(權慄)이 판치(板峙)에 주둔해 있다가 여러 군사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소속 군사들로 하여금 동요치 말게 한 다음, 큰소리로 이광을 힐책하니, 이광이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권율 등과 함께 전주(全州)로 내려가서 재차 거병하기로 꾀하였다. 장성(長城)에 사는 왕자사부(王子師傅) 정운룡(鄭雲龍), 광주(光州)에 사는 진사(進士) 박종정(朴宗挺), 생원(生員) 유사경(柳思敬) 등이 항소(抗疏)를 올려 이광이 머뭇거리면서 진격을 하지 않은 상황을 진술하고는, 무인(武人) 박희수(朴希壽)를 보내어 행조(行朝)에 진달하게 하였다. 당시에 정승으로 있던 해원군 윤두수는 바로 박종정의 처종형(妻從兄)이었다. 박종정이 해원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본도의 감사를 만약 행조에서 제수해 보낸다면, 한 달 안으로는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의 수령 가운데에서는 오직 권율만이 담략과 기략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적임자는 없습니다.” 하였다. 《우산기사(牛山記事)》
- 2020-12-31 | NO.205
-
- 용이 된 잉어할머니
- 이 이야기는 서구 세하동 동하洞荷마을 앞 조용한 만귀정晩歸亭 연못 속에서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어요. 물고기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이 드러나지요. 인간들에 의해 연못의 평화가 깨지고 있어 물고기들의 논의가 열린 것입니다. 물고기와 인간 사이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때 묻은 인간과는 달리, 순수한 물고기들의 세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연못에는 잉어가 많이 모여 살았지만 몰려드는 낚시꾼들이 문제였어요. 잉어들이 제대로 자랄 틈이 없을 정도였죠. 연못에는 나이 많은 ‘잉어’ 한 마리만 남았어요. 잉어 외에도 붕어, 메기, 가물치, 송사리와 같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잉어와 같이 비늘이 노랗고 눈자위가 새까만 얼굴을 가진 물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잉어는 좀 외롭고 쓸쓸하기는 했지만 그윽한 연잎 향기를 맡으면서 넓고 깊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 무렵에 비단같이 보드랍고 매끈매끈한 잉어가 창포 잎을 깔고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참이었어요.평소에 자기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던 새끼붕어 한 마리가 허겁지겁 찾아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제 동생이 실에 달린 지렁이를 빼먹다가 하늘로 올라간 뒤 돌아오질 않아요. 엄마 아빠는 저녁도 안 드시고 울고만 계세요."새끼 붕어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이 연못 속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잉어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그거 참, 야단났군. 네 동생이 낚시 바늘을 문 게로군!"잉어할머니는 쩍 쩍 입맛을 다시면서 붕어의 집으로 달려가 붕어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한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이 겪은 끔찍했던 순간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위로했어요. "갑자기 내 몸에 섬뜩한 손길이 와 닿더니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캄캄하고 좁디좁은 바구니 속에 갇히고 말았어. 그 속에는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 여러 물고기 형제들이 갇혀있더군. 나는 두려움과 목마름에 그저 입을 쩍 벌리고 울고만 있었지."잉어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입을 벌린 채 그 때의 놀란 표정을 다시 지어보였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아버님이 해준 말을 잊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붕어 가족에게 전했어요."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족속의 손에 붙들린 거란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도저히 살아 나가지 못할 것이지만 어쩌면 나이 어린 너만은 살아날지도 모른다. 인간은 워낙 욕심이 많아, 약아빠져서 어린 너희들을 더 키워서 잡아먹을 궁리만 하거든. 네가 살아나거든 이 연못을 떠나 너의 외가가 있는 이 앞들 ‘넓은 냇가’로 가거라. 그리고 얼마 후 장마철이 되어 방죽물이 둑을 넘거든 그 물줄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알았지?"잉어할머니는 말하는 동안 말 뿐만이 아니라 그 표정과 꼬리 흔들기를 아버지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해보였습니다. "내 아버님은 이렇게 말한 후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리시더군. 그동안 어머니는 내 볼에 자기 얼굴을 부비시면서 울고만 계셨지."잉어할머니는 그때의 슬픔이 되살아난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목멘 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 갔어요. "나는 그 얼마 후 아버님의 말씀대로 이 연못 속에 다시 던져졌고 그 후 사람들에게 부대끼면서 같은 동족들의 시달림을 받아가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지. 그러면서 외갓집을 찾아 헤맸지만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었고 모두가 허사가 되어 이곳에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는 홀로 살다가 이렇게 늙어 버렸어! 알고 보면 우리네 사회에서 온 식구가 오붓이 모여살기를 바란다는 건 애당초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지!"붕어 가족은 잉어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슬픔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연못에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 견디다 못한 물고기들이 그 방죽 안에 제일 어른인 잉어할머니를 모시고 대책을 의논하는 회의를 열게 되었어요. 회의시간이 되자 창포꽃이 노랗게 물가를 수놓은 연못가로 붕어 날치 피라미들이 긴장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항상 사이가 좋지 않은 메기, 가물치, 뱀장어들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니네들끼리 잘해, 우린 걱정 말라고!”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전해들은 잉어할머니는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여러분, 우리가 꽃향기 그윽한 이 아름다운 연못에서 편안히 지내왔는데 인간이라는 욕심 많고 고약한 동물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참으로 큰 야단이 아닐 수 없소!"잉어할머니는 큰 목소리로 말머리를 꺼낼 때 급한 날치가 뾰족한 주둥이로 다른 물고기들을 떠밀고 나오면서 한 마디를 했습니다."아니, 잉어할머니, 거 참 답답하지 않소? 무턱대고 야단났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어쩌면 좋다든가, 어떻게 하자든가, 그 방법을 말씀해야 할 게 아니에요?"그러나 잉어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우리가 살 길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이제까지 먹곤 했던 지렁이 같은 것을 일체 입에 대지 않으면 되는 거요. 더욱이 미꾸라지나 송사리 같은, 우리 동족을 잡아먹는 고약한 것들의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하오."차근차근 말을 계속하려고 할 때 연잎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가 그 옆을 나는 파리 한 마리를 날름 채먹고 쩍쩍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그건 가물치나 메기 영감더러 물어 보라지, 개굴개굴…"이번에는 배가 복쟁이처럼 볼록하고 쭉 째진 입가에 송곳처럼 날카로운 수염까지 단 자가사리가 입을 벌름거리면서 말참견을 했어요."저, 잉어할머니, 전 그 말씀에 불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생고기만 먹고 사는 놈인데, 그리되면 나 같은 놈은 아주 굶어죽어 버리란 말씀과 다름이 없잖소. 하루 종일 다방에 앉아 맹물마시고 사는, 일없는 인간들도 아침밥은 먹고 나오는데… 아무런들 내가 그들만도 못하다는 말이요? 내 참…."무지스런 까만 얼굴을 한 자가사리는 제법 핏기까지 올려가며 소리를 높였으나 잉어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말투로 자가사리를 타이르는 듯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이 연못 속에는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거나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얼마든지 있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고소한 나무열매, 풀잎에서 떨어지는 갖가지 벌레들, 그리고 연잎 위에 진주알처럼 고였다가 흘러내리는 맑은 물방울,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같은 동족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고 그런 것만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너도 이제부턴 같은 동족을 해치는, 그 고약하고 모질스런 짓은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그리고 한층 목청을 높여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곳의 안녕과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탱할 수 없을 테니 깊이 명심하시오."잉어할머니의 긴 말은 여기서 끝을 맺었어요. 이제 남는 것은 연못 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결정뿐이었습니다.그 자리에 모인 물고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잉어할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굳게 맹세를 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 없었던 가물치, 메기, 뱀장어는 자가사리가 일러바친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칠뿐이었습니다.그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빈정거리면서 입을 삐죽거렸어요. 그 후 잉어할머니 말씀에 순종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먹이를 지렁이가 아닌, 미꾸라지나 개구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이 연못 속에 살던 가물치, 메기, 뱀장어와 같은, 생고기 좋아하는 사나운 물고기들은 앞을 다투어 그것을 물고 채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번 연꽃이 피고지고 많은 세월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그동안 잉어할머니는 그 곳 모든 동족 물고기들의 존경과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던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장대같은 비가 그 연못을 내리 덮더니 잉어할머니를 감싸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비구름 속에 하늘로 올라가는 잉어할머니의 모습은 잉어가 아닌, 마치 용이 꼬리를 흔들며 올라가는 듯 했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본 것은 유일하게 연잎 위에 앉아 낮잠을 자다가 깬 개구리뿐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썽꾸러기 개차반으로 이름난 그 놈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 잉어할머니의 그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만 넙죽 큰 절을 했지요. 개구리가 공손히 앞발을 모으고 엎드려 절을 하는 버릇이 생긴 것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서구 세하동 동하마을은→세하동 동북쪽에 있는 큰 마을로, 마을 뒤에 백마산과 옥녀봉이 솟아 있고, 마을 앞에는 송정 평야의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그 들판 가운데로 극락강이 흐르고 있다. 조선 초에 청주한씨가 들어와 생성된 마을로, 마을 앞에 연꽃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앞 1000평 남짓한 연못 안에 만귀정, 습향각, 묵암정사 등 정자가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 2018-05-28 | NO.204
-
- 우부승지 이공 행장〔右副承旨李公行狀〕- 이화진(1626~1696)
- 우부승지 이공 행장〔右副承旨李公行狀〕- 이화진 광주목사(1691~1694)성호전집 제67권 / 행장(行狀)- 성호(星湖) 이익(李瀷)공의 휘는 화진(華鎭)이고 자는 자서(子西)이며 재호(齋號)는 묵졸(默拙)이다. 여흥 이씨(驪興李氏)는 고려조에 인용교위(仁勇校尉)를 지낸 휘 인덕(仁德)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10대를 내려와 병조 판서를 지내고 시호가 경헌(敬憲)인 휘 계손(繼孫)에 이르렀다. 이분은 실로 광묘조(光廟朝)에 명덕(名德)이 최고인 분으로 꼽혔으니, 사적이 국승(國乘)에 실려 있다. 또 3대를 내려와 응교를 지낸 휘 사필(士弼)에 이르렀으니, 이분이 첨정을 지낸 휘 우인(友仁)을 낳았고, 휘 우인이 군수를 지낸 상관(尙寬)을 낳았고, 휘 상관이 별제(別提)를 지낸 휘 지일(志一)을 낳았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고(考)이다. 비(妣)는 함양 오씨(咸陽吳氏)로 정랑 오익창(吳益昌)의 따님이다.공은 우리 순효대왕(純孝大王) 4년 병인년(1626, 인조4) 1월 13일에 무장현(茂長縣) 욕곡(浴谷)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영민하고 빼어났는데 몸이 약해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6세에 오 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례(喪禮)를 행하기를 거의 어른처럼 하였다. 마침내 외왕부 오공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오공은 선비들에게 명망이 있었다. 훈육하여 깨우쳐 주니 공의 학업이 크게 진보하였다. 총명함이 월등하여 한 번 보면 다시는 잊지 않았다. 책을 잡고 강송하게 되어서는 음성이 낭랑하였으며 독실하게 밤낮없이 읽으면서도 피곤해할 줄 몰랐다. 이따금씩 무릎 위에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여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병자년(1636, 인조14)에 서천(舒川) 해도(海島)로 피란을 갔는데, 오랑캐가 이르려 하자 민심이 끊임없이 소요하여 하루에 세 번은 혼비백산하였다. 그런데도 공은 오히려 게을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책을 읽었으니, 섬 사람들 모두가 탄복하였다. 일찍이 종 한 명만 따르게 하고서 책을 끼고 산사(山寺)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종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였는데, 공은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다. 바로 종으로 하여금 앞서 달아나게 하고는 자신은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자 호랑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조금 자라서는 시험장에서 제법 명성을 드러내었다. 당시에 사람들이 남쪽 고을의 큰 인물을 꼽아 보았는데 공 한 사람뿐이었다. 무자년(1648)에 진사가 되고 계축년(1673, 현종14)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당시 꺼리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연소한 자가 아니면 괴원(槐院)의 직임을 맡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 결국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에 보임되었다.갑인년(1674)에 성균관 학록(成均館學錄)에 전보되었다가 마침내 6품의 품계에 올라 전적이 되었고 조금 뒤에 병조 좌랑으로 옮겨졌다.을묘년(1675, 숙종1) 1월에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의 좌막(佐幕)이 되었다. 3월에 그대로 삼도(三道)의 해운 판관(海運判官)을 겸하였다. 겨울에 조정에 들어와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병조 정랑에 옮겨졌다.병진년(1676)에 다시 정언에 옮겨졌다가 조금 뒤에 다시 병조 정랑이 되었다. 6월에 요직을 담당한 자의 뜻을 거슬러서 외직으로 나가 북청 판관(北靑判官)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임 재상이 변방 지역에 군사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여 본도로 하여금 유적(儒籍)을 없애고 유생을 군사에 충원시키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북쪽 지방이 떠들썩해지고 유생들이 왕왕 불만을 얘기하며 서로 나와 호소하였다. 공이 이때 차사원(差使員)으로 서울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즉시 당시 재상을 만나 말하기를, “북쪽 지방은 본래 오랑캐 땅이었는데 조정이 실로 문교(文敎)로 유지하여 300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유신(儒紳)들을 몰아 군대로 귀속시켰습니다. 세속의 풍조는 한번 잘못 되면 다시 바로잡을 수 없고 인심은 떠나면 다시 거둘 수 없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시임 재상이 수긍하면서 옳다고 하여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다음 해 6월에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에 차임되었다. 얼마 뒤에 성균관 사예가 되어 조신(朝臣)을 고시(考試)하였는데, 여기서 내놓은 제목(題目)에 시휘(時諱)를 범한 것이 있다는 논의가 있어 여러 시험 담당관이 모두 죄를 입었고 공도 홍천현(洪川縣)에 찬배되었다.무오년(1678, 숙종4)에 방환되어 다시 사예를 거쳐 헌납에 옮겨졌다. 기미년(1679) 2월에 사헌부에 들어가 장령이 되었다가 헌납, 사성을 역임하였다. 7월에 다시 사은사의 서장관에 차임되어 중국에 갔다. 12월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아직 복명(復命)도 하기 전에 집의에 승진되었다.경신년(1680)에 사간에 옮겨지고 도로 집의에 제수되었다. 또 봉상시 부정에 옮겨졌다. 당시 당인(黨人)이 국정을 주도하였으므로 공 또한 조정에 있기가 편치 않았다. 이에 서천 군수(舒川郡守)에 보임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겨울에 사소한 일로 체직되어 돌아왔다.신유년(1681, 숙종7)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이 되었다. 다음 해 봄에 백성 가운데 윤기(倫紀)를 범한 자가 있었다. 경성은 북쪽 변방이라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는데 방백이 잘못 알고 옥사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계문하자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뒤따라 논박하였다. 3월에 마침내 해남현(海南縣)에 찬배되었으니, 무고하게 죄를 받은 것이다. 겨울에 사면되어 돌아왔다.정묘년(1687) 겨울에 이르러 방백이 다시 당시 사실을 밝혀 아뢰었으므로 비로소 서용되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다. 무진년(1688) 7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라 경흥 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가 되었다.경오년(1690) 봄에 임기를 채우고 해임되어 돌아왔다. 5월에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7월에 후사(喉司)에 들어가 동부승지가 되었다. 8월에 병으로 체직되었다.신미년(1691) 3월에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5월에 우부승지에 옮겨졌다. 6월에 광주 목사(光州牧使)에 제수되었다. 갑술년(1694) 봄에 또 임기를 채우고 해임되어 돌아왔다.병자년(1696) 4월 7일에 서울 집에서 임종하니 향년 71세였다. 7월에 양근군(楊根郡) 용문산(龍門山) 임좌(壬坐) 언덕에 안장되었다.공은 타고난 성품이 관대하고 넉넉하였으며 내면을 기름에 방도가 있었다. 고아한 풍모와 진실된 마음은 안팎이 똑같았다. 자신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담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혜롭게 하였다. 종족 간에 매우 화목하고 붕우 간에 신의가 있었다. 다른 사람을 논할 때는 장점을 들어 논하였고 일을 할 때는 충실함을 위주로 하였다. 고결하다는 이름을 얻는 데에 마음 쓰지 않았지만 엄연히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군자였다.물러나 집에 거처할 때는 깊숙이 들어앉아 교제를 끊고 날마다 후생들과 글을 읽고 글씨를 쓰며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출사하여 임금을 섬길 때에는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해 직임을 수행하였으며, 작은 관직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평생 산업을 경영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재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얼굴을 찌푸리며 좋아하지 않았다. 아래로 노비들에게까지 또한 너그럽게 대해 주어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성색(聲色)에 노기를 띤 적이 없었다. 예전에 거룻배〔步船〕 한 척을 보유한 적이 있는데, 매년 거두는 미곡이 적지 않았다. 공이 말하기를, “재물의 수입이 매우 많아 마음에 편치 않다.” 하고는 이어 태반을 덜어 내어 곤궁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스스로 바르게 한 것이 이와 같았다.또 일찍이 혼자 장원(莊園)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흰옷 입은 산도깨비들이 수풀 사이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공이 정색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귀신이 홀연히 사라졌다. 얼마 뒤에 친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바로 지난번 흰옷 입은 도깨비였다. 공이 가서 문후하니 귀신이 발자국 소리만 듣고 바로 사라졌다.하루는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노를 빠뜨렸다. 당시 한창 물이 불어나던 때라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은 동요하지 않고 파도에 일렁이는 뱃전에 걸터앉아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 말대로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을 것이다.” 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손을 나란히 하여 노 젓는 것처럼 하니, 배가 즉시 해안에 당도하였다. 이에 모두들 큰절을 올리며 사례하기를, “우리들이 고기밥이 되지 않은 것은 공이 힘쓴 덕분입니다.” 하였다.무장(茂長)에 있을 때 많은 배가 파도에 패몰당한 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빠져 죽어 갯벌에 묻혀 있었는데, 조수(潮水)가 들어와 시신이 떠내려가면 다시 찾을 수 없게 될 형세였다. 공은 직접 동복(僮僕)을 데리고 가서 즉시 거두어들이고 또 거주민들을 효유하여 힘을 합쳐 건져낸 다음 친속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에 과연 그들의 처자가 모두 와서 시신을 찾고는 감읍하고 돌아갔다.경흥(慶興)을 맡아서는 선비 양성을 정사의 최우선에 두었으니, 경헌공(敬憲公)의 유업을 이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대개 경헌공이 일찍이 본도의 방백이 되어서 처음으로 궁마(弓馬)의 풍속을 혁파하였으니, 북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향사(享祀)를 올리고 있다. 이후 158년이 지나 공이 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지역이 가장 멀고 외져서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공은 제일 먼저 성묘(聖廟)에 참배하고 유생들을 보니 전립(氈笠)에 가죽신 차림이고 일자무식인 것이 거의 옥저(沃沮), 말갈(靺鞨)의 유습이었다. 공은 즉시 관아에 명하여 의건(衣巾)을 지급하게 하고 감사에게 청하여 경사(經史) 약간 권을 얻었다. 또 총명하고 재주 있는 십여 명을 뽑아 직접 가르치고 권면하였으며 매일 과정을 정해 두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게 하자, 몇 년 사이에 이미 성과가 나타났다. 고사(古事)에, 국가 시험이 있으면 열읍에서 반드시 먼저 과거 응시자 명단을 올렸다. 그러나 경흥은 외지고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미 4, 5인이 시험에 응시하였고 또한 충분한 실력으로 합격하였으니 모두들 놀라워하였다.당시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판이었다. 이에 공이 또 감영 및 병마영(兵馬營)에 환곡을 청하였다. 마침내 이웃 고을에서 매우 많은 미속(米粟)을 얻게 되어 우선 길주(吉州) 이북으로 보내어 진휼하였다. 겨울과 봄까지는 영남에서 계속 보내와 보리 수확 때까지 대 주었다. 부역과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어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제거되었다. 아울러 부지런히 권면하여 농작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니, 사람들이 덕분에 온전히 살아남았다. 이윽고 또 부중(府中)에 방을 붙여 유시하기를, “백성을 기르는 도리는 노인을 위문하고 곤궁한 자를 구제하며 따르지 않는 자를 교도하는 데에 있다. 유품(儒品)은 70세, 군민(軍民)은 75세 이상인 자 및 늙었는데 처자가 없거나 어린데 부모형제가 없는 자, 그리고 효자와 열부(烈婦)를 마을에서 각각 보고하라. 또 효제(孝悌)를 하지 않는 자, 어른을 능멸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패려궂은 자,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자, 남녀가 분별없이 내외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였다. 이에 완급에 따라 흡족하게 구휼하고 경중에 따라 합당하게 상벌을 주었으므로 모두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다.자신의 생활은 매우 검약하여 비록 잔치를 베풀 때라도 한결같이 집에 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말하기를, “본래 가난하고 근검하니 녹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돌아가게 되어서는 의복과 사용하던 물건 가운데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면 바로 남겨 두며 말하기를, “나는 떠나면서 재물을 챙겨 가는 것을 싫어한다.” 하였다. 부의 백성들이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길을 막고서 멀리까지 나와 전송하였다.돌아온 뒤에 또 소장을 올려 본부의 폐단 및 북도의 편의에 대한 14가지 일을 논하였다. 그 대략에,“우리나라의 관방(關防)은 북도가 중요한데 진보(鎭堡)의 허술함이 막심합니다. 군민(軍民)들의 원성도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창졸간에 조처하기 어렵습니다. 강을 따라 설치한 보(堡)는 그 거리가 가까워야 4, 5십 리이고 배속된 군사는 많아야 3, 4십 인입니다. 뜻밖의 변고가 생겨 철기(鐵騎)의 군대가 나는 듯이 짓쳐들어온다면 다른 보의 군사가 구원하러 오기도 전에 이곳의 군사는 먼저 사로잡힐 것입니다. 변장은 기껏해야 저들의 길잡이 노릇만 할 것이고 저축해 놓은 군량은 단지 저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행영(行營)의 거리가 강변길에서 지극히 가까우니 강변의 수비가 무너지면 화가 필시 먼저 미칠 것입니다. 비록 손(孫)ㆍ오(吳)와 분(賁)ㆍ육(育)이 있더라도 머리를 내주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이 때문에 대장은 군대의 위세를 유지할 수 없고 국가는 전쟁을 치를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영이 함락되고 나면 더는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 그 방책이 또한 부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책은 강변 연안의 육진(六鎭)을 점차 내지로 옮겨 설치하고 강변의 높은 지역에 망루(望樓)를 많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랑캐가 나타나는 즉시 성화같이 재빨리 보고하면 근처에 있는 군병을 소집해서 성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잔폐한 보를 철폐해서 그 군졸을 합병한다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경성(鏡城)은 요해지로서 성 또한 튼튼하고 완벽하여 북쪽의 보장으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장은 항상 이곳에 거류하도록 하고, 부수(副帥)는 행영에서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변란에 대응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하였다. 공은 변방의 일을 익숙히 알았고 나랏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 말이 모두 나라를 경륜하는 원대한 계책이었으나 조정이 써 주지 못하였다.광주(光州)에 부임하였을 때는 재이가 있어서 상이 교서를 내려 구언(求言)하였다. 공은 즉시 상소를 올려 폐단을 논하였는데, 모두 3천여 글자가 되는 말이 모두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한 일이었다. 공은 선비로 있을 때부터 이미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두어 죽을 때까지도 말이 나랏일에 미치기만 하면 말이 끝없이 이어졌다. 반면에 편당(偏黨)하는 말이라면 일절 함묵하고 말하지 않았다.때로 한가하면 운을 골라 시를 짓기를 단지 성향대로 하였다. 변방 고을에 있을 때 상공(相公) 남구만(南九萬)이 이곳에 유배되어 거처하고 있었다. 평소 공의 시명(詩名)을 중시하여 공이 지은 시편을 들으면 반드시 장중하게 암송하였고, 또 한 권을 전사(傳寫)하여 궤 안에 두었다. 남상이 조정에 돌아오게 되어 공을 크게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묵졸재집(默拙齋集)》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불초한 나 익은 공에게 실로 당질(堂姪)이 되는데 늦게 태어나 문하생이 되어 모시지는 못했으나 돌봐 주고 길러 주시는 중에 베푼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일찍이 도성의 서문(西門) 쪽 사제(私第)에서 뵌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수염과 장대한 용모에 말씀하시는 것이 진지하여 지금까지도 그 후덕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지금 공의 막내아들 정(涏)이 나에게 공의 행장을 짓도록 명하였다. 나는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지만, 이 몸이 어리석고 보잘것없어서 공의 덕업을 드러내지 못할까 실로 염려되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듣건대, “비록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공을 평하게 하더라도 똑같이 반드시 남을 상해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니, 여기서 공을 잘 알 수 있었다.전 부인은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학생 김우참(金友參)의 딸이고, 계해년(1623, 인조1)에 태어나 신축년(1661, 현종2)에 졸하여 무장현(茂長縣) 송운산(松雲山)의 별제공 무덤 아래에 안장되었다. 아들 3인을 두었다. 후 부인은 단양 이씨(丹陽李氏)로 학생 이홍익(李弘翼)의 딸이고, 경신년(1680, 숙종6)에 태어나 기해년(1719)에 졸하여 안산(安山) 첨성리(瞻星里) 계좌(癸坐) 언덕에 안장되었다. 아들 1인을 두었다.[주-D001] 광묘조(光廟朝) : 세조(世祖)이다.[주-D002] 순효대왕(純孝大王) : 인조(仁祖)를 말한다.[주-D003] 좌막(佐幕) : 감영 등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관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도사(都事)를 지칭한다.[주-D004] 당인(黨人)이 국정을 주도하였으므로 : 1680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 이후 남인들이 조정에서 대거 물러나고 서인들이 요직을 차지하여 국정을 주도하게 된 것을 말한다.[주-D005] 후사(喉司) : 승정원을 말한다.[주-D006] 엄연히 …… 군자였다 :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인(善人)이라 한다.〔可欲之謂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주에 “천하의 이치가, 선한 자는 반드시 좋아하여 따르고 싶어 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미워하니, 그 사람됨이 따르고 싶어 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선인이라 할 만하다.” 하였다.[주-D007] 경헌공(敬憲公)의 유업 : 경헌공 이계손(李繼孫)은 1470년(성종1)에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에 제수되었는데, 부임하여 본도의 향교를 진흥시켜 선비를 양성할 것을 계문(啓聞)하였다. 《국역 성종실록 1년 6월 15일》[주-D008] 158년 : 218년의 오기인 듯하다. 이화진(李華鎭)이 경흥 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에 부임한 것은 1688년(숙종14)이고 이계손이 방백으로 부임한 것은 1470년이므로 218년 뒤의 일이다.[주-D009] 손(孫)ㆍ오(吳)와 분(賁)ㆍ육(育) : 손ㆍ오는 춘추전국 시대의 병가(兵家)인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말하고, 분ㆍ육은 진 무왕(秦武王) 때의 역사(力士)인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을 말한다.[주-D010] 상공(相公) …… 있었다 :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1688년(숙종14)에 박세채(朴世采)를 변호하고,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 전평군(全坪君) 이곽(李漷)에 대해 간언하다가 경흥(慶興)에 위리안치되었다. 《藥泉年譜》
- 2023-08-08 | NO.203
-
- 우역(牛疫)으로 폐사한 상황을 순영(巡營)에 보고하다-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 - 光州牧使 소가 병들어 죽다○ 영조(英祖) 39년(1763) 8월 11일 경내(境內)에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소가 병을 앓았다 하면 곧바로 폐사한 상황을 순영(巡營)에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우역이 지난해 겨울부터 발생하여 금년 봄과 여름에 이르렀으나 그 기세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가 몇 개월 전부터 점점 전염되어 소가 병을 앓았다 하면 곧바로 폐사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신칙하여 폐사한 족족 땅에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역이 마치 불처럼 치성하여 소가 잇따라 폐사한 바람에 심지어 한 마을에 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머지않은 가을갈이에 사람이 소 대신 쟁기를 끌어야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의 재앙이 아니므로 민사(民事)가 정말로 매우 고민됩니다.전후로 폐사한 소에 대해 지금 막 각각 주인의 성명을 조사하여 수록(收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끝나면 별도로 책자를 작성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간사한 백성의 무리가 은밀히 폐사한 소를 도살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산 소를 도살한 경우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금법(禁法)을 범한 것이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다방면으로 기찰하고 한편으로는 엄히 신칙하여 땅에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먼저 첩보합니다.제사(題辭)우역이 이와 같이 치성하고 있으니, 정말로 고민이 된다. 폐사한 소는 낱낱이 묻을 것이며, 도살하는 것도 엄히 신칙하여 금단(禁斷)해야 할 것이다.
- 2023-08-17 | NO.202
-
- 우잠만고ㆍ우잠잡저
- 장태경 (張泰慶 , 1809 ~ 1887)의 우잠만고ㆍ우잠잡저 : 愚岑漫稿ㆍ愚岑雜著는 국역본으로 2010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간행되었다.이 책에는 풍영정, 취백루, 서석산, 장원봉, 금당산, 제봉산, 사인봉, 극락강, 경호, 분적산, 황화루 등 광주 관련 시들이 상당히 있다.
- 2021-03-31 | NO.201
-
- 우재 선생께 올리는 편지〔上尤齋〕 -문곡집
- 우재 선생께 올리는 편지〔上尤齋〕 -문곡집 제27권 / 서독(書牘): 김수항(金壽恒, 1629~1689)늦가을, 어르신께 문안을 가는 광주(光州)와 나주(羅州) 유생들이 있어서, 삼가 편지 한 장을 써서 문후를 여쭈었고 아울러 《차의(劄疑)》 한 책을 보냈는데, 과연 지체되지 않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뜸한 지 이미 몇 달이 지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고 박(剝)과 복(復)이 교체되는 시절입니다. 삼가 균체(勻體 편지에서 정승을 지칭하는 말)의 건강이 철따라 강녕하고 복되리라 생각되니, 우러러 그리는 저의 마음이 하루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저 수항은 그런대로 죽이나 먹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 진실로 이른바 혜주(惠州)의 급제하지 못한 수재(秀才)는 어디에 있은들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병과 게으름이 날로 고질이 되고 뜻과 학업이 날로 황폐한 것은 참으로 횡거(橫渠 장재(張載)의 호)의 말처럼 오로지 구습에 얽매어 탈피하지 못한 데서 연유하니, 종전에 좋은 시절을 헛되이 버리고 단지 어르신께 상심과 슬픔만 끼치는 것이 더욱 슬픕니다. 만일 때때로 가르침을 받아 저의 혼미함을 깨우칠 수 있다면 혹시 끝내 소인(小人)이 되지는 않겠지요? 마침 조생(曺生) 집에 회향(懷鄕 회덕(懷德))에서 온 인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략 이렇게 문안 편지를 썼으니 조만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자세히 갖출 겨를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주-D001] 우재 …… 편지 :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송시열이 10월 14일에 부쳤다. 송시열의 편지는 《송자대전(宋子大全)》 권54 〈김구지에게 답함-정사년 6월 12일〔答金久之 丁巳十月十四日〕〉이다.[주-D002] 박(剝)과 …… 시절 : 박과 복은 《주역》의 괘명(卦名)이다. 산지(山地) 박(剝)괘는 9월에 해당되며, 지뢰(地雷) 복(復)괘는 11월에 해당된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절을 뜻하면서 동시에 난세(亂世)에서 치세(治世)의 싹이 튼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주-D003] 혜주(惠州)의 …… 수재(秀才) : 여기서는 귀양 간 신세를 말한다. 송나라 소식(蘇軾)이 왕안석(王安石)의 화를 당하여 그곳으로 귀양을 간 일이 있었으므로 귀양살이를 흔히 혜주라 칭한다. 소식이 자신을 묘사했던 말이다. 《東坡全集 卷84 與程正輔提刑》[주-D004] 구습에 …… 못한 : 《장자전서(張子全書)》 권14 〈성리습유(性理拾遺)〉에 나온다.[주-D005] 조생(曺生) : 누군지는 미상이다.
- 2020-12-14 | NO.200
-
- 우후(虞侯) 김준민(金俊民)의 복수 사건
- 연려실기술 별집 제13권 / 정교전고(政敎典故) / 형옥(刑獄)○ 인조 조에 우후(虞侯) 김준민(金俊民)의 종 금이(金伊)가 준민의 집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부러뜨려 죽였는데, 그 아들 성일(成一)ㆍ성구(成九)가 장사를 지내지 않고 도적 괴수의 동정을 살피다가, 시장 가운데서 김이와 그 부모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손수 도륙(屠戮)하고 집안 사람을 시켜 그들의 간을 그 아버지 빈소(殯所) 앞에 매달아 놓게 하고, 곧 관청으로 나아가 자수(自首)하여 옥에 갇혀 죽여주기를 청하였다.담양부사(潭陽府使) 이윤우(李潤雨, 1569~1634)와 취조관인 광주목사(光州牧使) 임효달(任孝達, 1584~1646)이 예전에 있었던 복수(復讐)는 사형을 면한다는 의논을 증거로 끌어대어 조정에까지 보고하니, 형조에서 《대명률(大明律)》 장벌조(杖罰條)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특별히 사면하여 주었다. 《우암집》* 다른 기록에서 <丁丑庭試文武科榜目>에 의하면 金成一(1538~1593)은 선전관(宣傳官)으로 부는 우후(虞侯) 김준민(金俊民), 형은 김성구(金成九)라 하였는데 <광산김씨 정묘대보>에는 형 성구가 성일의 아우로 기록되어 있다. 이 파는 담양과 광주일원에 세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김준민의 아들 김성일이 선전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로 나와 인조의 재위(1623~1649) 기간을 고려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다. 또 김성일의 자는 사순(士純)인데, 아래의 송시열이 쓴 글에서 자는 응건으로 나온다.김 삭주(金朔州) 형제의 복수전(復讎傳) / 송시열김성일(金成一)의 자는 응건(應乾)인데, 광주(光州) 평장동(平章洞) 사람으로 담양부(潭陽府)에서 대대로 살았다. 그의 아버지 준민(俊民)은 벼슬이 우후(虞候)였고, 어머니는 하동 정씨(河東鄭氏)였는데, 용(龍)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공을 낳았기 때문에 아명(兒名)은 현룡(見龍)이었다. 키는 8척이었고, 붉은 수염은 창끝처럼 곧았으며, 용력(勇力)이 뛰어난 데다 음양가(陰陽家)를 섭렵(涉獵)하여 장차 무재(武才)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준민의 아우는 세민(世民)이었는데, 그의 종[奴] 금이(金伊)가 동생 세민의 아내 예합(禮合)과 간통하였다. 준민은 이를 통분하게 여겨 장차 그들을 제거하려 하였는데, 미처 거사(擧事)하기 전에 종 금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제 아비와 두 동생을 거느리고 기사년(1629, 인조7) 10월 30일 밤에 준민의 집으로 쳐들어가 준민을 매우 참혹하게 어지러이 찍어 죽였다.)이때에 성일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아버지의 부음(訃音)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의 아우 성구(成九)는 피를 토하며 실성(失性)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형제가 서로 굳게 결심하고 창을 베개 삼아 거적자리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고 적괴(賊魁)의 동정만을 살폈다.이해 12월 15일에 시장(市場) 안에서 금이와 그의 부모를 찾아 손수 잡아 죽이고 그의 간(肝)을 잘라 내어 가인(家人)을 시켜서 아버지의 빈전(殯前)에 매달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부(府)에 나아가 형제가 자수(自首)하면서 죽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준민이 죽은 지 겨우 45일째였다.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공 윤우(李公潤雨)가 추관(推官)인 광주 목사(光州牧使) 임효달(任孝達)과 함께 예전의 복수면사의(復讎免死議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고 죽음을 면한 데 대한 의논)를 끌어대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다.감사 송공 상인(宋公象仁)이 이를 조정에 보고한 결과, 승지(承旨) 이공 경용(李公景容)이 해조(該曹)에 알려, 《대명률(大明律)》의 장벌조(杖罰條)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인조대왕(仁祖大王)은 그의 효의(孝義)를 가상하게 여겨 특사(特赦)하였다. 대체로 처음 변(變)이 났을 때부터 이제까지의 기간은 9개월이었다. 그러자 인리(隣里)의 여러 친지들은 준민의 시체가 돌아갈 곳이 없음을 민망하게 여겨 힘을 합해서 그를 장사 지냈다.성일은 담양(潭陽)을 선친이 살해당한 지역이라 하여 차마 그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가 드디어 흥덕(興德)ㆍ부안(扶安) 등지로 옮겨 가 우거(寓居)하였다. 사인(士人) 박문두(朴文斗)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들 형제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재산을 기울여서 접대하였다. 그들 형제가 아버지의 상(喪)을 마치자, 백강(白江) 상공(相公) 이경여(李敬輿)는 그들을 막하(幕下)에 두고 후히 대우하였는데,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신공 경진(申公景禛)도 역시 그렇게 대우하였다.병자호란 때는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동성(東城)에 나누어 예속되었다. 선전관(宣傳官) 윤겸지(尹謙之)와 함께 베개를 연하고 잠시 토우(土宇)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 번 부르는 소리가 들리므로 놀라 일어나서 뛰어나가다 뒤돌아 보니, 적(賊)의 포(砲)가 벌써 윤겸지의 머리를 부숴버렸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난(亂)이 끝나자 선전관이 되었고,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이 되었으며, 영원 군수(寧遠郡守)로 나갔다가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다. 복(服)을 마친 다음 곡산(谷山)과 철산(鐵山)의 군수(郡守)를 거쳐 간간이 장관(將官)이 되었는데, 대체로 문무관(文武官) 제공(諸公)에게 깊이 알려졌기 때문에 직임(職任)이 몸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젊은 때의 패기가 줄어지자 전리(田里)에 물러나 살면서 여생을 마치려 하였다. 그러나 정유년(1657, 효종8) 6월에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삭주 도호부사(朔州都護府使)를 특별히 제수하므로 한숨지으며 탄식하기를,“나는 늙었는데 어찌 다시 젊은 패기가 있겠는가마는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감히 죽기로써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고는, 드디어 애써 부임하였다.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눈바람을 맞으면서 용만(龍灣)을 왕래하다가 한질(寒疾)을 얻어 나이 66세로 무술년(1658, 효종9) 1월 1일에 졸(卒)하였다. 그러자 비변사(備邊司)에서 연도(沿道)에 명하여 그를 운상(運喪)해 돌아오도록 해서, 담양군(潭陽郡) 무이동(武夷洞) 정좌(丁坐)의 언덕 선영(先塋)에 장사 지냈다.그의 아내 이씨(李氏)는 아들 수태(守兌)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은 지 돌도 안 되어 변(變)이 일어났으므로 아이를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남몰래 재종형(再從兄)인 진경(振慶)의 집에 의탁하였다. 진경은 그를 길러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 수태의 아들 정하(鼎夏)가 삭주(朔州 삭주 도호부사를 지낸 김성일을 가리킴)에 대한 시말(始末)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전(傳)을 만들어 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늙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지경이라, 필연(筆硯)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지만, 이제 성일 형제의 사적은 세교(世敎)에 도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대략 쓴다.삼가 예경(禮經)과 《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복수(復讎)에 대한 의리가 자상하였는데, 주 부자(朱夫子)에 이르러 그를 더욱 발휘(發揮)하고 천명(闡明)하였다. 그러나 세상이 쇠퇴하고 풍속이 투박하여 이런 의리를 아는 자가 적다. 이제 성일 형제는 꼭 예경이나 《춘추》의 뜻을 연구해서가 아니고, 다만 천부(天賦)의 성(性)을 가지고 생사(生死)를 잊고 분발하여 이런 큰일을 처리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인조대왕은 그가 제 맘대로 살인한 죄를 특사(特赦)하였고, 효종대왕은 또 그에게 벼슬을 제수하였으며, 상공 이경여는 가장(嘉奬 칭찬하고 장려함)하고 친후(親厚)하게 대하였다. 심지어 옥관(獄官)들까지도 모두 그를 살리자는 의논을 펴서 풍화(風化)를 도왔으니, 본조(本朝)의 예의(禮義)의 밝음이 중화(中華)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더욱 믿을 만하다.그 아버지의 장례(葬禮)를 뒤로 미루었던 것은 더욱이 주자의 설(說)과 부합된 점이 있다. 주자가 일찍이,“《춘추》의 법에, 임금이 시해(弑害)되었을 때 임금을 시해한 적(賊)을 토벌하지 못했으면 장(葬)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바로 복수의 대의(大義)를 중히 여기고 장사 치르는 상례(常禮)를 가볍게 여겨, 만세의 신자(臣子)에게 반드시 적을 토벌해서 원수를 갚은 다음에야 그 군친(君親)을 장사 지낼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비록 관곽(棺槨)과 의금(衣衾)이 더없이 융후(隆厚)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시체를 구학(丘壑)에 버려서 여우와 너구리가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빨아먹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하였으니, 그 의리가 아주 적절하다 하겠다. 이제 성일 형제의 처사가 그와 은연중 부합되며, 대체로 하늘에서 얻은 의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아, 기특하도다.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8월 일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 2023-08-09 | NO.199
-
- 원찬류(遠竄類-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 ○ 전 유수(留守) 임길후(任吉後) : 사헌부가 아뢰었다.“폐조 때 후궁의 친속으로 아양을 떨어 사랑을 받아 무리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일찍이 광주(光州) 목사가 되어서는 온 고을이 텅 비다시피 하였으며, 개성 유수가 되어서는 탐독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제수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멀리 귀양보내소서.”뒤에 석방되었으나, 유효립의 옥사 때 도로 귀양보냈다. 강진으로 정배.
- 2022-04-29 | NO.198
-
- 유사-초은정에 올라
- 초은이란 이 정자를 서산에서 일으키니주인옹의 높은 풍류 맑은 술잔 이끌었네.열려있는 처마 앞에 아침비가 그치었고높이 솟은 지붕 위에 저문 구름 길들였다.편안한 마음으로 꽃 언덕을 바라보고한가로운 꿈속에서 돌 시내를 베었도다.이 가운데 깊은 뜻을 어느 누가 아올손가거문고의 맑은 곡조 높았다가 낮아지네.-초은정(樵隱亭)에서 설강(雪江) 유사( 柳泗 1503-1571)
- 2020-04-06 | NO.197
-
- 유순-喜慶樓
- 十二闌干對遠岑 열두 난간이 먼 산을 대했는데, 올라가 보니 登臨倦容散幽襟 고단한 손이 그윽한 흉금을 터놓을 만하다榴花竹葉有佳色 석류 꽃과 대잎은 아름다운 빛이고紫鷰黃鸝俱好音 검은 제비 누른 꾀꼬리는 모두가 좋은 소리로다憑檻欲招丹蓑侶 난간에 기대어서 단전(丹篆)의 짝을 부르려 하고捲簾如臥白雲陰 발을 걷어 올리니, 흰 구름 그늘에 누운 듯하도다須曳得月添高趣 이윽고 달이 돋아 높은 흥취를 더하니消盡區區一片心 울적한 한 조각 마음이 없어지누나-광주읍지유순(柳洵, 1441-1517)의 자는 희명(希明)이며 호는 노포당(老圃堂)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냈다.
- 2018-07-26 | NO.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