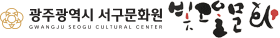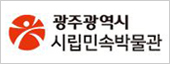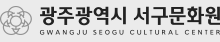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20건
-
- 정시림-過光州城(광주성을 지나며)
- 정시림(鄭時林, 1839∼1912)의 자는 백언(伯彦)이며 호는 월파(月波)이다. 보성 출생이다. 문집으로 월파집(月波集)이 있다.立立樓臺百尺浮 우뚝 솟은 누대 백 척 높이 떠서太平歌鼓度春秋 태평시대 노래하며 봄가을을 보낸다鈴軒老吏閒無事 관청의 늙은 아전 일 없어 한가하니坐送歸雲瑞石頭 가만히 서석산으로 가는 구름을 보낸다
- 2018-07-10 | NO.105
-
- 정약용-遊瑞石山記山在光州東三十里 一名無等山
- 余旣游赤壁之數日。曺公翊鉉和順人過余于琴嘯之堂。聽余言赤壁之樂。歎曰赤壁之勝。如女子靚妝。其粉黛珠翠。雖足以悅目。無可以拓胸懷而舒氣志也。子不見瑞石之山乎。屹然若巨人偉士。不言不笑。坐於廟堂之上。雖不見其施爲動作之跡。而其功化之及物廣矣。子盍觀焉。於是昆弟四人。復謀所以游瑞石者。曺公亦遣其弟從焉。瑞石之山。崷崪磅礴。根之據郡縣者七。登其頂。北可以望赤裳。南可以眺漢拏。而月出松廣之屬。皆兒孫也。上有十三峯。常有白雲護之。有祠焉。巫典之。其言曰雷霆雲雨之變。常自山腰起。濛濛然推轉向下。而山上且靑天矣。其爲山不已俊乎。立中峯之頂。飄然有輕世獨往之想。覺人生苦樂。無足爲意。余亦莫知其所以然也。凡山水之勝者。必其有奇巖削壁。飛泉怪瀑。姿態紛紜。紫綠萬狀。而後方得備數於山經水志之中。瑞石特以高峻雄湖南。而曺公獨知其可以長諸山。其山與人。蓋亦偉矣。歸由圭峯之下。圭峯者兩峯削立如圭。其稜中觚。臥者折者之在其下者。又數十枚。-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3권*적벽과 무등산을 유람한 기록
- 2018-07-12 | NO.104
-
- 정약용-過景陽池 (경양방죽을 지나며)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경양의 못가를 지나며(過景陽池)’雜樹臨官道 잡목은 큰 길가에 늘어섰는데 芳池近驛樓 역루의 가까운 곳 저수지 하나照顔春水遠 얼굴 비친 봄물은 아득히 멀고隨意晩雲浮 저문 구름 두둥실 한가롭기만 竹密妨行馬 대밭 성해 말 몰기 여의치 않고荷開合汎舟 연꽃 피어 뱃놀이 제격이로세弘哉灌漑力 위대할사 저수지 관개의 공력 千畝得油油 일천 이랑 논들에 물이 넘치네-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1권*光山縣*2023.6.1 수정
- 2018-07-12 | NO.103
-
- 정약용-재차 광주를 지나며(重過光州)
- 每過光山府 매과광산부 광주를 지날 때는 언제나 長懷鄭錦南 장회정금남 오래도록 정금남(鄭錦南) 생각이 나네 地如從直劣 지여종직렬 신분은 구종직(丘從直)처럼 미천했으나 才比舜臣堪 재비순신감 재주야 이순신과 견줄 만했네 古廟風雲氣 고묘풍운기 옛 사당엔 풍운의 기운 서렸고 遺墟父老談 유허부노담 옛 집터에 시골노인들이 전설 전하네 雄哉瑞石鎭 웅재서석진 웅장할사 서석의 드높은 진산 亭毒出奇男 정독출기남 정기 모아 기특한 위인 탄생시켰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자는 미용(美庸), 송보(頌甫)이며 호는 다산(茶山), 여유당(與猶堂),삼미(三眉) 등이다.
- 2018-07-10 | NO.102
-
- 정염(丁焰) 고봉 만헌(晩軒) -고봉별집 부록 제1권 / 제문(祭文)
- 임신년(1572, 선조5) 12월 27일에 능성 현령(綾城縣令) 정염은 삼가 고봉 기 선생의 영전에 제사를 올립니다.아, 강학(講學)의 공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굳이 옛 시대에서 근거를 찾아 알아볼 것도 없이 당장 오늘에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초야에 물러나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에 힘쓰는 자는 그 덕이 참으로 훌륭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으니, 그를 아는 사람이 적으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넓지 못할 것이 당연합니다.공께서는 높은 재기(才器)와 큰 역량으로 처음에는 문자(文字)의 공을 바탕으로 하셨으나, 뒤에 자못 도학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선각(先覺)을 만나 더욱 그 길을 단단히 믿으셨습니다. 고증은 극도로 해박하게 하고 논변은 지극히 자상하게 하셨으며, 나아가 자신이 얻은 도의 정수를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기꺼이 남들에게 일러 주셨으니, 여느 사람들처럼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구하는 도구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은 거론할 것도 못 됩니다. 게다가 벼슬길이 창창해도 그것을 꼭 해야겠다는 뜻이 없으셔서 마음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애써 본심을 억누르면서까지 억지로 벼슬하지는 않았으니, 잠시 사이에 나왔다 물러갔다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문(斯文)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기에 머뭇거리며 관망하는 뜻이 없고 과감하고 호탕한 기운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 자도 있었으나 차츰차츰 믿게 되어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면 반드시 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습속이 더럽고 잘못된 줄을 알고 옛 도가 행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공의 힘이 많이 작용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강학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더 긴 수명을 누리셨다면 그 성취가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저는 실로 외람되고 천박하여 도의(道義)의 벗은 되지 못했지만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신 은혜를 오래도록 입은 덕에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누었으니, 저로서는 큰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번잡한 공무에 매여 사모하는 마음을 펴지 못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다시는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어찌 산 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에 조촐한 제물로 거칠게나마 보잘것없는 정성을 표합니다. 아, 슬프오이다. 부디 흠향하소서.[주-D001] 정염(丁焰) : 1524~1609.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군회(君晦), 호는 만헌(晩軒)이다. 23세 때 정황(丁熿)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성균관 직강을 거쳐 안성 군수(安城郡守), 광주 목사(光州牧使), 고부 군수(古阜郡守)를 지냈다.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평난한 공로로 1590년(선조23)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고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선되었다. 저서에 《만헌집》이 있다.
- 2022-03-04 | NO.101
-
- 정재순- 죽취정에서
- 죽취(竹翠)라는 산명으로 이 정자를 이름하니듣고 보는 그 성광(聲光)이 한결같이 푸르도다. 달이 밝은 창문위에 마을 공기 차가웁고 저녁노을 석양뜰에 산그림자 나타나네. 충신모신 사당앞에 선대유업 남아 있고효우하는 가풍속에 옛날 글을 읽었도다. 푸른 대의 높은 절개 속됨없이 깨끗하니백년임하 찾아와서 티끌 꿈을 깨었도다강산(江山) 정재순(鄭在淳, 1878~1948)이 범형식의 죽취정에서 이곳에서의 감흥을 이렇게 나타냈다.
- 2020-04-25 | NO.100
-
- 정준일-次光山客舍韻
- 年過半百髮絲絲 不用荒城滞一摩東閣梅花聊相折 故園知發數層枝-향북당선생유고(向北堂先生遺稿)정준일(鄭遵一, 1547-1623)의 자는 택중(擇中)이며 호는 향북당(向北堂)이다.
- 2018-07-26 | NO.99
-
- 정지는 광주(光州)에서 살다가 졸하니 시호는 경렬(景烈)이다- 동사강목 제17하
- 동사강목 제17하 신미년 공양왕 3년(명 태조 홍무 24, 1391) 동10월 ○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정지(鄭地)가 졸하였다.정지는 외모가 우람하며 성품이 관후(寬厚)하였다. 어려서부터 큰 뜻이 있어 책읽기를 좋아하고 대의(大義)를 통하였으며,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서책을 가까이하였다. 이(彛)ㆍ초(初)의 옥사가 일어나 청주옥(淸州獄)에 갇혔을 때 고문을 해도 불복하고 말마다 하늘에 맹세하였는데 말뜻이 매우 강개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나 광주(光州)의 별장(別莊)에서 살다가 졸하니 시호는 경렬(景烈)이다.
- 2020-09-15 | NO.98
-
- 정창손-皇華樓迥壓高臺
- 皇華樓迥壓高臺 황화루가 아득히 고대(高臺)를 누르니臺畔群花獨自開 고대 주위에는 꽃만이 제대로 피었구나鳳去悠悠終不返 봉황은 날아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데空餘雙樹送靑來 부질없이 남은 한 쌍의 나무가 푸르름을 보내 오는구나 정창손(鄭昌孫, 1402-1487)
- 2018-07-12 | NO.97
-
- 정철 - 人亡欲斷琴 (고경명을 생각하며)
- 금사사에 열흘 머무른 것이 / 十日金沙寺고국을 생각하는 마음 삼년과 같이 길게 하누나 / 三秋故國心밤 밀물은 새벽 바람을 흩뜨리는데 / 夜潮分爽氣돌아오는 기러기 떼는 슬픈 소리를 보내오네 / 歸雁送哀音오랑캐가 나타나니 자주 칼을 보게 되고 / 虜在頻看劍훌륭한 사람이 죽었으니 거문고를 끊고자 하노라 / 人亡欲斷琴평소에 읽던 출사표를 / 平生出師表난리를 당하여 다시 한 번 길게 읊어 보노라 / 臨難更長吟임진란 때에는 왜놈들이 득실거렸다. 선조(宣祖)는 서쪽으로 피란 길을 떠났는데, 상국(相國) 정철(鄭澈)을 귀양살이에서 풀어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직에 임명하였다. 정철이 명을 받고 남으로 내려갈 때,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사사(金沙寺)에 이르러 7월 가을에 10일 동안을 묵게 되었다. 정철이 감개하여 드디어 율시 한 수를 지었다. 그 시에, 고경명(高敬命) 공이 전사한 까닭으로 제6구에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고 썼다.
- 2021-10-07 | NO.96
-
- 정철- 한거에 시를 읊다(閒居口占)
- 浮雲過長空(부운과장공) 먼 하늘을 지나는 구름一點二點白(일점이점백) 한 점 두 점 하얗구나 流水歸北海(유수귀북해) 북해로 흘러드는 물은千里萬里碧(천리만리벽) 천 리 만 리 푸르구나 白者何爲白(백자하위백) 흰 것은 어찌하여 희며碧者何爲碧(벽자하위벽) 푸른 것은 어이 푸른가 此理欲問之(차리욕문지) 그 뜻을 묻고자 함인데雲忙水亦急(운망수역급) 구름도 물도 황급하네중앙 정계에서 활약하던 정철은 당쟁에서도 밀리고, 선조에게도 버림을 받아 담양 창평으로 낙향하였다. 환벽당에 들른 정철은 '한거구점(閒居口占)'이란 시를 지어 읊었다. 한가하게 읊은 시 같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흰 것과 푸른 것이 각각 바쁘고 급하게 제 갈 길만 가는 세태를 한탄하는 시다. 정철이 서인의 영수이자 행동대장이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흰 것'은 서인, '푸른 것'은 동인을 상징한다. 동양의 오방색에서 서쪽은 흰색(白), 동쪽은 푸른색(靑), 남쪽은 붉은색(赤), 북쪽은 검은색(黑), 중앙은 누른색(黃)에 해당한다.
- 2018-08-02 | NO.95
-
- 정철-환벽당운에서 차운하다(次環碧堂韻)
- 一道飛泉兩岸間(일도비천양안간) 한 줄기 샘물은 양 언덕 사이로 흐르고採菱歌起蓼花灣(채릉가기료화만) 여뀌꽃 물굽이엔 채릉가 소리 들려오네山翁醉倒溪邊石(산옹취도계변석) 시골 늙은이 취해 시냇가 바위에 누우니不管沙鷗自往還(불관사구자왕환) 갈매기는 상관 않고 자유로이 오가누나자연에 취하고 술에 취해 무위자연의 도를 즐기는 노래다.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시다. 어디선가 아낙네들의 채릉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채릉가(採菱歌)'는 마름을 따면서 부르는 노래다. 술에 취해 바위에 누워 천하태평한 산옹은 김윤제, 그런 산옹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는 정철 자신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다. '료화(蓼花)'는 여귀꽃이다. 옛 시인들은 강변의 풍경을 여뀌꽃을 통해서 묘사하곤 했다.
- 2018-08-02 | NO.94
-
- 정충신(鄭忠信) - 성호사설 제17권 / 인사문(人事門)
- 정충신(鄭忠信) - 성호사설 제17권 / 인사문(人事門) : 성호 이익(李瀷, 1680~1763) 금남군(錦南君) 정충신은 곧 광주(光州) 통인(通印)이었는데, 통인이란 것은 인장을 맡은[知印] 천리(賤吏)의 속칭이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알아준 바로 발신(發身)하여 벼슬을 하다가 갑자년(1624, 인조 2)의 변란에 큰 공을 세움으로 인해 책훈(策勳)되고 부원수(副元帥)에 이르렀다.대개 서애(西厓)가 미관(微官)으로 죄를 얻고 내쳐진 이순신(李舜臣)을 알았고, 백사가 하읍(下邑)의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정충신을 알았는데, 그후로는 다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계해년(癸亥年)에 반정(反正)을 도모할 때 여러 의론이 모두, “옥성(玉城 장만(張晩)의 봉호) 장만(張晩)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하였는데, 그 사위인 정승 최명길(崔鳴吉)은 “장인은 늙고 병들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장 만이 이 말을 듣고, “내 사위가 나를 잘 안다. 내가 어찌 차마 섬기던 임금을 갈아내는 하수자(下手者)가 되겠는가.” 하였으며, 정금남(鄭錦南)은, “장옥성(張玉城)의 갑자년 공로는 어찌 칭할 바가 있으리요마는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곧 그의 훌륭한 일이다.” 하였다.또 그의 시에,날마다 강 머리에서 한가로이 술잔만 기울여도 / 日把江頭無事酒어이해 허리띠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고 / 如何衣帶漸寬圍북으로 장안을 바라보면 삼천 리나 되는데 / 長安北望三千里늦가을 형양에는 기러기 자취마저 드무네 / 秋盡衡陽鴈亦稀하였는데, 읊조릴 적마다 흥미가 있다.[주-D001] 형양(衡陽) : 중국의 형산(衡山) 남쪽에 회안봉(回雁峯)이 있는데, 기러기가 가을에는 이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봄을 기다려서 북쪽으로 돌아간다고 함. 《당시훈해(唐詩訓解)》 지기(地記)에, “衡山一峯極高 雁不能過 故名回雁峯”이라고 하였음.
- 2020-09-22 | NO.93
-
- 정충신(鄭忠信) - 연려실기술 제29권
- 정충신(鄭忠信)평안ㆍ경상 병사ㆍ부원수(副元帥)ㆍ형조 판서ㆍ금남군(錦南君) - 연려실기술 제29권 /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정충신은 자는 가행(可行)이며,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고려 병장 정지(鄭地)의 후손이다. 미천한 집에 태어나서 절도영(節度營)에 속한 정병(正兵)이었고, 겸하여 부(府)에 예속된 지인(知印 통인)이었다. 일찍이 절도영에 사역되어 불려갔는데, 늙은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 기생이 절도영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공이 물리쳐 먹지 않고 말하기를 “대장부가 마땅히 절도사가 되었으면,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남에게 먹일지언정 어찌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하니, 그 뜻과 기운 높음이 이러하였다. 임진년에 목사 권율(權慄)이 행재소에 장계를 전달할 만한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이 분연히 가기를 청하니, 그때 나이가 17세였다. 적병이 길에 가득 찼는데, 공이 단신으로 칼을 짚고 행재소에 도착하였다. 이항복 권율의 사위 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멀리서 와서 몸둘 곳이 없으니, 내게 머무르게 하겠다.” 하였다. 이내 사서(史書)를 가르쳤는데, 공이 재주가 뛰어나 문리가 날로 진보되니, 항복이 아들처럼 사랑하였다. 가을에 행재소에서 시행한 무과에 올랐다. 임금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경이 일찍 정충신의 재주를 말했었는데, 이제 과거에 합격했으니 데리고 와서 나를 보게 하라.” 하였다. 들어가 뵈니, 임금이 칭찬하며 이르기를, “나이가 아직 어리니, 좀 자라면 크게 쓰리라.” 하였다.○ 공은 키와 몸이 작았으나 눈이 샛별 같고, 얼굴이 아름다우며 말솜씨가 있고, 기상이 좋아 영특하였다. 활발하고 의기가 있고 일을 잘 헤아려서 미리 맞히는 것이 많았다. 《곤륜집(昆崙集)》 ○ 만포 첨사(滿浦僉使)가 되었을 때, 명을 받들어 오랑캐들 가운데 들어가 여러 추장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추장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늘 우리를 적이라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였다. 답하기를, “너희들이 천하를 도적질할 마음이 있으니,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니, 여러 추장이 크게 웃었다.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오랑캐가 장차 천하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니, 어찌 다만 우리나라의 걱정뿐이겠소.” 하였다. 《곤륜집》 ○ 공은 매우 미천한 집안 출신이면서도 성질이 거만스러워서 여러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교의 예로써 대하니, 이 때문에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최명길이 늘 자와 호를 불러 벗하였는데 혹 말하기를, “정충신이 교만하고 망녕된 것은 공들의 잘못 때문이다.” 하였다. 명길이 웃으며 말하기를, “충신의 장점이 바로 교만하고 망녕된 데 있으니, 충신에게 이것이 없다면 무엇을 족히 취할 것인가.” 하였다. 《지천유사》 ○ 병자년 여름에 병이 심하였는데, 임금이 의관에게 명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달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었다. 의관의 말이, “마땅히 인삼 두어 근을 써야 하겠다.”고 하면서도 임금에게 청하기를 어렵게 여겼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국력을 다 소비하더라도 아깝지 않은데, 하물며 몇 근의 인삼이겠는냐.” 하였다. 죽은 뒤에 내시에게 명하여 호상하게 하고, 어포(御袍)를 주어 수의(襚衣)로 하게 하고 관청에서 예로써 장사하게 하였다. 《정장군전(鄭將軍傳)》 ○ 병자년 봄에 왜구가 온다고 말이 와전되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왜인은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이요, 나라의 큰 근심은 곧 북녘 오랑캐다.” 하였다. 조정에서 오랑캐에게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단절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공이 이때에 병으로 앓아 누웠다가 이 말을 듣고 심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이 이해에 결정된다.” 하였는데, 이해 12월에 오랑캐가 과연 크게 쳐들어왔다. 《정장군전》 ○ 김시양이 언젠가 조용히 묻기를, “공이 이괄이 반란한 것을 듣고 성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무슨 까닭이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와 이괄의 친분이 형제와 같은 것은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것이오. 또한 문회(文晦) 등에 의해 고발되었던 것은 다행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잡혀 문초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소. 그리고 이괄이 모반할 때, 내가 영변(寧邊) 근방에 있었으니, 만약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다면 나의 본심을 천하에 분명히 밝히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을 버리고 도망나옴으로써 내 본심을 밝혀서 사람들이 절로 믿도록 한 것이었소.” 하였다. 《하담록》 ○ 처음 권율이 군사를 일으켜, 근왕(勤王)할 때, 공이 따라왔다. 군사를 보내어 적진을 정탐케 할 때에 공이 함께 가기를 청하니, 권율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어린아이다. 가서 장차 무엇을 할 것이냐.” 하였는데도, 공이 굳이 청하니 마침내 보내었다. 달려가 적진에 이르렀는데, 적은 벌써 물러갔다. 공이 마을 집들을 둘러보니, 깨어진 독이 거꾸로 엎어진 것이 있었다. 공이 장난으로 쏘았는데, 독 가운데 병든 왜병이 숨어 엎드려 있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다. 드디어 목을 베어 깃대에 달고 오니 권율이 심히 기특하게 여겼다.
- 2020-09-25 | NO.92
-
- 정충신-거지 사행(使行) 2천리
- 조선 중기의 무신이자 광주 지역 아전이었던 충무공 정충신鄭忠信(1576∼1636)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 권율權慄 장군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충신은 거지 복장을 했지요. 임금에게 장계狀啓를 전해야 하는 데 왜군들이 길을 점령하고 있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계를 전달할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자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정충신이 선뜻 자원, 장계를 무사히 전달해 주위를 놀라게 했지요.이 무렵 호남의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권율 장군은 왜적이 침입하자 호남 각지에서 들고 일어선 수천의 의병을 이끌고 전북 일대와 호남 각지에서 왜적을 무찌른 승전의 소식과 이곳 호남의 정세를 의주에 계신 임금에게 알려야만 했어요.그러나 왜적이 팔도에 들끓어 임금에게 보고하는 장계를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은 장계를 행재소에 전달할 사람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도 응하지 않았는데 정충신이 그 중대하고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선뜻 자청하고 나선 것이지요. 주위에서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때는 삼복이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장계를 전달하러 가는 길에 왜군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충신은 행동이 민첩하고 지략이 뛰어난 인물답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온몸에 ‘옻칠’을 발라 나병환자로 가장해서 갈 거예요. 장계를 가늘게 노끈으로 꼬아 배낭을 만들어 등에 지고 걸인행색으로 가면 임금에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별로 배운 것은 없었지만 바탕이 영민한 정충신은 천문지리天文地理와 ‘점술’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적진을 피해 가던 중에도 더러는 정탐까지 수행했습니다. 일부러 적진에 찾아들어가 걸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북행을 계속한 것이죠. 이렇게 해 무사히 행궁行宮에 당도한 그는 메고 간 배낭을 풀어 장문의 장계를 임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왜군으로 가득한 길을 단신으로 뚫고 행재소에 도착, 임금께 장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이런 과정에서 정충신은 한양에서 이항복 선생과 귀한 인연을 맺게 되지요. 병조판서로 선조 임금을 호위하고 있던 오성 이항복이 정충신의 비범함을 한 눈에 알아차리고 그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오성은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비범함에 반해 손수 사서삼경 등 글을 가르쳤어요. 머리가 총명한 정충신을 아들같이 사랑도 했지요. 정충신은 학문이 날로 발전하고 문리文理에 대한 깨달음이 빠른데다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뛰어난 재간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행재소에서 실시되는 무과에 응시해 합격하는 기쁨을 누립니다.정충신은 이항복 선생과의 인연 이후로 정말 나라의 귀중한 재목이 됐지요.정충신은 1621년(광해군 13) 만포첨사로 국경을 수비했으며, 이때 명을 받고 여진족 진에 들어가 여러 추장을 만나기도 했지요. 북방 여진족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방비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략과 덕을 갖춘 명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항복은 일찌기 그를 극찬한 바 있어요."정충신이 만약 칼을 버리고 책을 취하면 일대의 훌륭한 명사가 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1623년(인조 1) 안주 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고, 그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에서 무찔러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습니다. 그 후 승전을 거듭해 포도대장,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지내는 출장입상出將入相의 훌륭한 명신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척추를 이룬, 최대 간선도로인 금남로는 정충신의 군호君號를 딴 이름입입니다.1636년 정충신의 병이 심해지자 왕까지 나서서 “의관은 정충신의 치료에 진력하라.” 며 특별 분부를 했건만 효험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사후 왕은 다시 내시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호상하게 하고, 어복御服을 주어 수의壽衣로 하게 하라.” 관청에서 의로써 장사를 치르게 했습니다. ※거지 사행使行 2천리 주인공 정충신은 전남 나주 출생 고려 명장 정지鄭地(1347∼1391) 장군의 9대손으로 광주목의 좌수를 지낸 금천군 정윤錦川君 鄭綸의 아들이다. 키가 작으면서도 씩씩했고, 덕장이라는 칭송을 들었으며, 민간에 많은 전설을 남겼다. 천문. 지리. 복서. 의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정통했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에게 얽힌 많은 설화가 전해지지만 무등산이 갈라지며 청룡과 백호가 뛰어나와 안겼다는 태몽이 대표적인 이야기다. 저서로는 『만운집晩雲集』, 『금남집錦南集』, 『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 등을 남겼으며, 시호는 충무忠武다.
- 2018-05-28 | NO.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