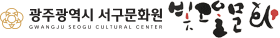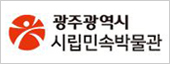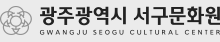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20건
-
- 전식(全湜, 1563~1642) <수수차록(隨手箚錄)>
- 유성룡(柳成龍)의 문인. 정경세(鄭經世), 이준(李埈)과 함께 상산삼로(商山三老)라고 불림沙西集 권6 / 雜著<隨手箚錄>甲寅(1614년)六月。除全羅道都事兼春秋館記注官。八月赴任。監生進初試榜。榜中有羅州牧使子朴㦽,靈光郡守子兪格之名。全尹告監司曰。朴㦽兪格。皆守令子。而冒入參榜。當削去。且此榜一等五人。亦違格例云云。監司卽移文于余及同參試官錄名官處。使之進來。余先馳往。監司見余曰。何取朴,兪二生耶。答曰。取其才而已。他何知也。監司曰。二生之非本道人。公豈不知耶。答曰。此則非試官事。各都目。四官錄其名。入門之官無所禁。入場之士無所擯。試官出題試才而已。其人居住。雖或知之。寧有摘發出送之擧乎。監司郞招錄名官詰之。錄名官在外。曾知余意。亦答曰。二生之冒籍。非不知之。而儒生無一人擯貢者。錄名官何苦自爲退送耶。監司良久謂余曰。削去二生可也。答曰。榜中不足之數。何以充之。監司曰。以落幅陞補可也。余笑曰。出榜大事也。旣出之後。寧復下手也。監司曰。一等五人。大違格例。此亦何如。答曰。此非大端事。鄕漢之試。或五或三。素無定規。凡出榜。皆用會試格例。別試初試。則雖五六百之多。一等只一人。式年初試。則雖十二三之少。一等必三人。鄕試之依會試榜例。何害於事而必欲改之耶。況試官有過誤事。則當狀啓請罪。以治其失。不可更改已出之榜。重誤事體也。監司曰。出與參試官議處可也。答曰。參試官雖欲改之。決不可爲也。其後全尹通言於當路言事者。啓請試官罷職。儒生削榜。自上推考試官。停擧儒生而止。時鄭杺亦自江陵。赴其道監試得中。人以爲爲鄭發。而實全尹之所爲也。向人自矜。不爲隱諱云矣。余於京外之任。皆無罷遞。每因事棄歸。故余不復向人說仕宦事。朝廷亦從此相忘耳。????以出題日久。不無虛疏之弊。請改出以送爲啓。故擧子下來之後。改送新題。擧子輩入廷仰視之。多有不製者。其製之者。爲立馬馳赴之擧矣。自前設科。多所云云久矣。及見此事。然後知近來取士如是之無理也。大學副學。因此大貳云耳。
- 2023-07-06 | NO.120
-
- 전제(田制) 9- 경세유표 제7권 / 지관 수제(地官修制)
- 정전의(井田議) 1정전이란, 전가(田家)의 황종척(黃鐘尺)이다. 황종척을 만들지 않으면 풍악 소리를 바룰 수 없고, 정전을 만들지 않으면 전제(田制)를 정할 수 없다.가경(嘉慶) 임신년(1812)에 가산 역적(嘉山逆賊) 홍경래(洪景來) 등이 다복동(多福洞) 금점을 근거지로 군사를 일으켜서 난을 꾸몄는데, 지금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것은 오직 관에서 채굴하지 않고 백성에게 사채(私採)하도록 허가했던 까닭으로 이런 간악한 도적이 나왔던 것이다.탁지(度支)와 수부(水部)에서 이 일을 주관하면서, 옥당 학사(玉堂學士)를 보내 감채어사(監採御史)로 삼고, 호조 정랑(戶曹正郞)과 공조 정랑으로서 일찍이 광주(光州)나 나주(羅州)의 목사를 지낸 자에게 가서 그 일을 다스리도록 한다. 무릇 군정(軍丁)을 고용하여 금을 고르되 인원 수를 엄하게 정해서, 그 근맥(根脈)을 조사하여 그 성질을 살피고, 이에 대오(隊伍)를 편성해서 일제히 단속하며, 일체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장사치는 죄 다 물리친다. 사방 5리에 목책(木柵)을 설치해서 표를 세우고 백성의 왕래를 금단하여 전력(專力)으로 금을 캐서 호조에 들인다면, 그 틈에 사고를 내는 자가 어찌 있겠는가? 이렇게 계획을 내기를 도모하지 않고, 이에 토호와 교활한 자에게 스스로 광주(礦主)가 되도록 하고, 혹 감영 비장(監營裨將)이나 고을 군교(軍校)에게 가서 감독하도록 하니 천류(賤流)와 소민(小民)이 서로 더불어 부동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백 가지 간사함이 엇갈려 날뛰고 서로 치솟으며, 무뢰배(無賴輩)를 불러들여서 어지럽게 기통(紀統)이 없으니, 그 폐단에 홍경래 따위가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 2022-04-29 | NO.119
-
- 전평호수 주막 사건
- 전평호수 방죽가에 옛날에 주막이 있었지요. 마을에도 주막이 있었지만 한 청년은 엄한 아버지가 두려워서 가까운 주막은 가지 못하고 방죽가 주막을 자주 찾아갔어요. 찾아오는 손님도 당시 그 지역에서는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고, 미인 접대부가 있는, 그럴싸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날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동아전쟁이 한참인 1942년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인 C씨는 한 달이 넘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날씨가 무더운 날, 광주에 사는 친구가 놀러오게 되자 방죽가 주막을 찾았습니다. 파란 물가, 버드나무 고목 밑 산뜻한 주막집에서 점심 때가 좀 지난 시간이었어요. 대낮에 북소리가 나고 젊은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흥에 겨웠지요. 그때 그 집의 풍치에 알맞은 노래로서 주막집의 18번곡인 듯 싶은 일본가요 ‘호반湖畔의 여관’(Kohanno Yado)이 들려 왔구요. 노랫소리가 나는 큰방에는 주재소(지금의 지서)의 수석(지서장)과 면사무소 간부가 함께 있었는데 뇌물성 술대접 자리였던 것입니다. C씨는 친구와 함께 갓 방에 들어갔습니다.윗목에 젊은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술시중을 들었고, 막걸리 두 되짜리 주전자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하필이면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울밑에 선 봉선화’와 ‘조선말’이었습니다. 큰방에 있는 일인 순사를 의식한 저항의 몸짓이었죠.얼마가지 않아 조선 노래를 하지 말라는 전갈을 보내 왔어요. C씨와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술상 두들기는 소리를 더욱 높여가며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자 남자주인은 혹여 시끄러워질까 걱정이 돼 이들 앞에서 방바닥에 고개를 쳐 박고 조용히 떠나주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C씨는 사뭇 단호하고 당당하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못가요. 지금 같은 전시에 경찰관이 백주대낮에 주막에 앉아 여자를 끼고 술타령이라니 그런 비국민이 어디 있소? 그 사람들더러 가라고 하쇼.”집주인의 사정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인 주재소 수석이라면 우는 애도 울음을 뚝 그친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인데다 전시를 빙자한 그들의 지배와 간섭은 무소불위로 끝 가는 데가 없었고, 그들에게 미움을 사면 누구도 무사할 수가 없을 정도의 권력이었어요. 흰 머리가 듬성한 주막 집주인은 체면불구 젊은이들 앞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방바닥에 고개를 쳐 박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지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해서 두 사람이 막 일어서려는 참이었는데 성급한 일본인 수석이 패도佩刀를 손에 들고 그 방으로 쳐들어 왔습니다.“거기 앉아. 이 자식들 너희들 반일주의자인 ‘불령 조선인’(일본에 불만을 품고 항일행동을 하는 조선사람)이지? 그 학생복도 가짜고, 홍 순사 저놈들을 묶어서 주재소로 끌고 가.”수석은 눈을 부라리며 곁에 서 있던 홍 순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뒤따라 온 홍 순사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는 C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C씨의 집안을 무척 존중하는 터였습니다.“홍 차석, 왜 얼른 수갑을 안 채워? 저놈들 자네가 아는 놈들인가?”C씨가 홍순사의 대답이 있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우리도 술손님이고, 당신도 같은 술손님인데 우리는 잡혀가고, 당신은 잡아가고 그런 억지와 모순이 어디 있소? 더구나 댁은 경찰이 아니시오. 이런 평일 날 근무시간에 여잘 끼고 술판을 벌이다니, 그 조선인 여자를 당신은 여자 정신대로나 알고 있는 게 아뇨?”그 자리에 있던 홍순사와 변간부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여자정신대라는 말은 일본군부와 일부 특수계통 관리만이 아는 일종의 군사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C씨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들은 일본인 수석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뭐, 정신대?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수석은 홍순사의 허리에 있는 수갑을 빼들고 물었습니다.“당신의 모국 일본에서 들었소. 그것도 당신과 동족인 일본인 신문기자에게 말이요.”“너 공산주의자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신문기자 그놈도 그렇고?”수석의 얼굴이 노기와 경악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여자정신대 문제는 일본군부에서 기획하고 실행 중인 특수전략이기 때문에 그 실상은 당신도 잘은 모를 겁니다. 나에게 말한 그 분 말로는 조선여자론 모자랄 테니까 곧 일본인 젊은 여자도 끌려갈 거라고 합디다.”C씨는 오히려 침착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씨는 사정을 해서 같이 간 친구를 돌려보내고 자기혼자 주재소에 동행을 했어요. 그동안 면간부의 귀띔으로 C씨의 집안이 일본인 고위층 인사들과도 교분을 갖는 권세가로, 그리 만만찮은 상대라는 것을 수석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재소에 당도하자 수석은 부하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심문을 했어요.그리고 앞으로는 여자정신대문제는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작성한 심문조서를 C씨의 면전에서 박박 찢어버렸습니다.그리고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 되어 말했어요.“나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소학교 고등과 밖에 못나온 무식쟁이라네. 그래서 그 자격지심으로 더러 난 독한 짓도 했지. 알고보니 자네는 좋은 가정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장래가 창창한 사람 아닌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 한때의 혈기로 앞날을 그르쳐선 안 되지. 오늘 젊은 자네에게 배운 것이 많네.”그는 C씨의 두 손을 아프도록 꽉 쥐었어요. 일인 수석 그도 역시 사납고 모진, 갈데없는 일본경찰이었지만 그 성질 값을 하는 호쾌한 일면도 있었지요.이 사건으로 인해 C씨는 부친의 엄명을 받아 여름방학을 고향집에서 더 보내지 못하고 동경으로 추방되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 2018-05-28 | NO.118
-
- 정 금남군의 유허에서〔鄭錦南遺墟〕 -매천집 제4권 / 시(詩)○임인고(壬寅稿)
- 정 금남군의 유허에서〔鄭錦南遺墟〕 - 매천집 제4권 / 시(詩) ○임인고(壬寅稿) 병등 차고 일어나 인장 옆에서 잠들다가 / 兵燈蹴起印傍眠자연스레 풍운 빌려 하늘 위로 올렸네 / 穩借風雲送上天똑같이 당대의 참된 안목이지만 / 一種當時眞眼力권공이 의당 이공보다 앞섰으리라 / 權公合在李公先주문과 기맥의 실버들에 봄이 한창인데 / 朱門綺陌柳絲春거꾸로 최장이 날마다 문에 이르렀네 / 倒見崔張日到門사대부는 원래 나에게 달린 것이거늘 / 士大夫原於我在천추에 어리석은 이는 기승진일세 / 千秋痴絶紀僧眞재주 있는 신하는 형세 판단 유독 밝아 / 才臣審勢眼偏明맹약 먹물 바랠 즈음 죽기를 다투었네 / 盟墨將渝判死爭만약 직접 남한의 일 겪었더라면 / 使也身逢南漢日고심함은 결단코 완성에 뒤지지 않았으리 / 苦心端不後完城하사 받은 집에서 여러 해 병상에 누웠더니 / 賜第多年病臥床줄을 이은 어장은 하늘의 향기 띠었네 / 魚麞絡繹帶天香광산의 풀밭 봄이 와도 돌아온 적 없으니 / 光山春艸無歸日못 믿겠네, 영웅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 不信英雄戀故鄕[주-C001] 임인고(壬寅稿) : 1902년(광무6), 매천이 48세 되던 해에 지은 시들이다.[주-D001] 정 금남군(鄭錦南君) : 조선 인조(仁祖) 때의 무신(武臣)인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을 가리킨다.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종군하다가 이항복(李恒福)의 주선으로 학문을 배웠고, 그해 무과에 급제하였다.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에 공을 세워 금남군에 봉해졌고, 1627년 정묘호란 때 부원수(副元帥)를 지냈다.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복서(卜筮)ㆍ의술(醫術) 등에 밝았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에 《만운집(晩雲集)》, 《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 《금남집(錦南集)》 등이 있다.[주-D002] 병등(兵燈) …… 잠들다가 : 정충신은 조부 때부터 절도영(節度營)에 속한 정병(正兵)이었고, 부(府)에 예속된 지인(知印)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지인은 인장을 관리하는 천리(賤吏)이다.[주-D003] 풍운 …… 올렸네 : 풍운은 난리를 뜻하니, 난리를 평정하여 조정에 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가 〈증헌납사기거전사인징(贈獻納使起居田舍人澄)〉이라는 시에서 자신을 천자에게 천거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양웅에게 다시 〈하동부〉가 있으니, 오직 불고 불어 하늘 위로 올라가길 기다리네.〔揚雄更有河東賦 唯待吹噓送上天〕”라고 하였다.[주-D004] 권공(權公)이 …… 앞섰으리라 : 권율이 이항복보다 먼저 정충신의 재능을 알아보았다는 말이다. 임진왜란 때 권율이 광주 목사(光州牧使)로서 군대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는데, 당시 17세였던 정충신이 적을 정탐하겠다고 자원하여 결국 임무를 완수하였으므로 권율이 크게 기이하게 여겼던 일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은 뒤, 선조(宣祖)의 행재소(行在所)에 보고를 올릴 때도 그를 믿고 맡겼다.[주-D005] 주문(朱門)과 …… 이르렀네 : 화려한 명문가의 자손이 신분이 미천한 정충신과 어울려 지낸 것을 의미한다. 주문은 붉은색을 칠한 왕공(王公)이나 귀족(貴族)의 주택 대문을 말하고, 기맥(綺陌)은 번화한 도로나 풍경이 아름다운 교외의 도로를 말한다. 모두 신분이 귀한 대갓집과 도로를 가리킨다. 최장(崔張)의 최는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을 말하고, 장은 장유(張維, 1587~1638)를 말하는데, 이항복의 권유로 정충신과 교유를 맺었다.[주-D006] 사대부는 …… 기승진(紀僧眞)일세 : 사대부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齊)나라 무제(武帝) 때의 중서사인(中書舍人) 기승진이 사대부가 되고 싶어 무제에게 청하였는데, 무제가 “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강효(江斆)에게 가보라.” 하므로, 강효에게 나아갔으나 그가 홀대하자, 승진이 기가 죽어 물러나 무제에게 고하기를, “사대부는 참으로 천자가 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南史 卷36 江斆列傳》[주-D007] 맹약 …… 다투었네 : 맹약 먹물이 바랜다는 것은 공신으로서 맺은 맹약을 어기는 것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 때의 공신 이괄(李适, 1587~1624)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어 역란을 일으킨 것을 가리킨다. 정충신은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황주와 서울 안산(鞍山)에서 이괄의 군대를 무찔러,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움으로써 진무 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다.[주-D008] 남한의 일 :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해 포위된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측과 강화(講和)를 해서 훗날을 기약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다가 결국 강화론의 주장대로 항복한 일을 가리킨다.[주-D009] 완성(完城)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 또는 창랑(滄浪)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이항복(李恒福)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5년(선조38)에 생원시에서 장원하고, 그해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고,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에서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영의정으로서 각종 제도 개혁에 기여하였으며,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하였다. 양명학(陽明學)에도 조예가 있었다. 문집으로 《지천집》과 《지천주차(遲川奏箚)》가 있다. 척화 일색의 조정에서 홀로 강화론을 주장하여 당시는 물론 성리학적 명분론을 앞세우는 후세 사대부들의 비난을 받았다.[주-D010] 어장(魚麞)은 …… 띠었네 : 임금으로부터 음식물이 내려왔다는 뜻이다. 어장은 어물과 노루 고기로서 귀한 음식물을 가리킨다.
- 2020-09-16 | NO.117
-
- 정간공이 시호를 맞던 날 병으로 가지 못했는데 예랑이 시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서〔靖簡公延謚日以病未赴聞禮郞有韻〕 - 노사집 제1권
- 정간공이 시호를 맞던 날 병으로 가지 못했는데 예랑이 시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서〔靖簡公延謚日以病未赴聞禮郞有韻〕 - 노사집 제1권 사문에서 조서를 맞이함이 놀라운데 / 私門驚見紫泥延길을 앞선 북 징소리 먼 하늘에 은은하네 / 先道鼓鑼隱遠天시호 내림이 전례에 따른 것이라지만 / 節惠縱然因典禮은영은 유난히 증현손까지 후하게 내렸네 / 恩榮偏若篤曾玄사람들 고봉의 미덕을 계승했다 하고 / 人稱克世高峯美일은 우연치 않게 면앙 해와 같았네 / 事不偶同俛仰年삼원의 낭관으로 문장이 특별한데 / 郞位三垣文采別병들어 영현을 뵙지 못함이 부끄럽네 / 漳濱慚負接英賢[주-D001] 정간공(靖簡公) : 정간은 기언정(奇彦鼎, 1716~?)의 시호이다.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중화(仲和), 호는 나와(懶窩)이다. 기대승(奇大升)의 후예이다. 1763년(영조39) 10월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벼슬길에 올랐는데 1771년(영조47)에는 정언이 되었다. 당시 기대승의 후광을 입어 1782년(정조6)에는 당상관으로 특별히 초자(超資)되어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계속 순탄한 벼슬길을 걸었다. 성격이 청렴하고 강직해서 1786년 대사간에 발탁된 뒤, 세 번이나 연달아 이를 역임하다가 1792년에는 대사헌에 취임하여 관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진력하였다. 1795년에는 다시 공조 판서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에 심취하여 관계서적을 조석으로 암송하였다.[주-D002] 조서 : 본문의 ‘자니(紫泥)’는 자색의 인니(印泥)이다. 임금의 조서(詔書)는 무도(武都)의 붉은 진흙으로 봉한다.[주-D003] 시호 내림 : 본문의 ‘절혜(節惠)’란 군주가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줌을 이른다.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선왕이 시호로써 이름을 높이고 한 가지 선으로써 요약했다.〔先王諡以尊名 節以壹惠〕”라고 하였다. 이는 아름다운 시호를 내려 그 이름을 높이되 여러 가지 선행을 다 들기 어려우므로 가장 큰 것을 요약하였음을 말한다.[주-D004] 고봉(高峯)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으로,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이다. 32세에 이황(李滉)의 제자가 되었으며, 이항(李恒)ㆍ김인후(金麟厚) 등 호남의 석유(碩儒)들을 찾아가 토론하는 등 학문에 대한 열정이 컸다. 특히 이황과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8년 동안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논란을 편 편지는 유명한데, 이것은 유학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光州)의 월봉서원(月峰書院)에 배향(配享)되어 있으며, 주요 저서에 《고봉집(高峰集)》ㆍ《주자문록(朱子文錄)》ㆍ《논사록(論思錄)》 등이 있다.[주-D005] 면앙(俛仰) : 송순(宋純, 1493~1583)으로,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수초(遂初), 호는 면앙이다. 1519년(중종14)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1547년(명종2)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지냈다. 1569년(선조2) 대사헌 등을 거쳐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가 치사(致仕)했다. 문집에 《면앙집》이 있다.[주-D006] 삼원(三垣) : 동양 천문학에 있어서의 성좌의 세 구획인 태미원(太微垣)ㆍ자미원(紫微垣)ㆍ천시원(天市垣)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조를 가리킨다.[주-D007] 병들어 : 본문의 ‘장빈(漳濱)’은 병이 들어 몸져누웠다는 뜻의 시어(詩語)이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건안 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유정(劉楨)이 조조(曹操)의 아들인 조비(曹丕)와 절친하였는데, 그가 조비에게 빨리 찾아와 주기를 간청하면서 보낸 시의 내용 중에 “내가 고질병에 심하게 걸려서, 맑은 장수(漳水) 가에 몸져누워 있다.〔余嬰沈痼疾 竄身淸漳濱〕”라는 말이 《문선(文選)》 권23 〈증오관중랑장(贈五官中郞將)〉 4수 중 둘째 시의 첫 구절에 나온다.
- 2020-10-04 | NO.116
-
- 정공(정엄) 묘지명 병서〔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誌銘並序〕 - 성재집
-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증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정공 묘지명 병서〔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誌銘並序〕 - 성재집 제41권 / 가하산필(柯下散筆) : 유중교(柳重敎, 1832~1893)부인은 경주 김씨이며,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 6세손이다. 고(考)는 김연(金堧)으로 목사(牧使)이다.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두었다. 아들 참봉 김대신(金大伸)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딸 넷은 각각 첨정(僉正) 박동언(朴東彦), 봉사 박선(朴瑄), 통사랑(通仕郞) 정민구(鄭敏求), 선교랑(宣敎郞) 기효맹(奇孝孟)과 혼인했다. 김대신의 양자〔系子〕 황(韹)은 선교랑(宣敎郞)에 올랐다. 박동언의 양자〔系子〕 황(潢)은 대사헌을 지냈고, 딸은 승지(承旨) 오익(吳翊)과 혼인했다. 박선의 아들 시영(時英)은 진사(進士)가 되었다. 기효맹의 아들 징헌(徵獻)은 봉사를 지냈다. 증현손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공의 묘소는 광주(光州) 무등산 간좌(艮坐) 언덕에 있으며, 부인은 부좌(祔左)했지만 봉분은 달리했다. 이전에는 묘지명이 없었다. 금상 경진년(1880, 고종17), 공의 몇 대손 정인직(鄭寅直)이 여러 부형의 명을 받고 와서 중암 김평묵 선생에게 신도문(神道文)을 청하고, 또 중교에게는 묘지명을 써 달라고 부탁했는데 뜻이 매우 간절했다. 생각해 보니, 공은 이른 나이에 이름이 나서 밝은 시대를 만나 직언(直言)과 혜정(惠政)으로 위아래에서 신임을 받았다. 저렇듯 혁혁하니, 금석(金石)에 새겨 후세에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또한 효를 근본으로 하고 배움을 바탕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더욱 귀하다. 안타까운 점은 수명이 길지 못하여, 살아계실 때 그가 쌓은 것을 모두 펼치지 못했고, 또 돌아가신 후 두 번이나 병란을 겪으면서 문적(文籍)이 산일되어 버린 것이다. 사우와 강학한 것은 후학에게 은택이 되어야 하지만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하나 공에게 어떤 흠이 되겠는가? 묘지명은 다음과 같다.공은 평소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밤 늦도록 의관도 벗지 않았다. 또 손수 약을 달이고, 변을 맛보고,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복상 중에는 상복을 벗지 않고 피눈물을 흘렸으며,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여위어 이듬해 죽었다. 이 날이 경진년(1580, 선조13) 12월 3일이며, 향년 쉰 셋이다. 돌아가실 때, 부인이 직접 영결(永訣)하고자 했으나 예(禮)에 따라 거절하고, 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임금 은혜를 갚지 못하고, 어머니 상을 마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 32년 후, 신해년(1611, 광해군3) 조정은, 문충공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의 상소에 따라 그 마을에 정표를 하고 사헌부 대사헌에 추증했다.임자년(1552, 명종7), 생원시 장원, 진사시 제3등으로 뽑혔고, 무오년(1558, 명종13),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에 보임되었으며, 예문관 검열(藝文舘檢閱)과 대교(待敎)에 천거되었다. 얼마 후,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이조랑(吏曹郞), 삼사(三司)의 차관을 역임했다. 갑자년(1564, 명종19), 유연(柳淵)의 옥사가 있었는데, 애매한 사건으로 유연이 죽게 되었다. 공은 당시 장령(掌令)으로서 굽은 옥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항언(抗言)했는데, 그 풍채가 온 조정을 압도했다. 얼마 후, 여산 부사(礪山府使)로 나갔다. 관리와 백성은 그의 어진 정치를 마음에 품고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만력(萬曆)연간 계유년(1573, 선조6)에 남원 부사(南原府使)가 되었으며, 치적이 으뜸이었다. 임금은 특별히 정옥(頂玉)을 하사하고 친서〔璽書〕를 내려 위로했으며, 아울러 이전에 어사대에서 홀을 바로잡고 직언했던 일을 포상했다. 갑술년(1574, 선조7),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부모의 노환으로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조정은 그가 사는 곳을 살펴 나주 목사(羅州牧使)에 임명했는데, 부모를 편히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정무를 맡고 풍년이 들어 은혜가 아래까지 미쳤다. 어머니 상을 당하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통곡하며 전송하는 자가 끊이지 않고 길에 이어졌다.공은 휘(諱)가 엄(淹), 자가 문중(文中), 자호가 양촌(楊村)이다. 정씨(鄭氏)의 본은 전라도 광주이다. 먼 조상은 고려 문하찬성사 정신호(鄭臣扈)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정귀진(鄭龜晉)이 이조 참의로서 예조 판서에 추증되었는데, 문장을 잘 지어 그 이름이 《동국문선(東國文選)》에 올랐다. 이 분이 공의 5세조이다. 고조는 정지하(鄭之夏)이며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관은 사헌부 장령에 올랐고,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증조는 정계우(鄭繼禹)이며 진사가 되었지만 덕(德)을 수양하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품자(品資)는 수의교위(修義校尉)이며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조(祖)는 정윤적(鄭允績)이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고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고(考)는 정만종(鄭萬鍾)이며 호가 조계(棗溪)이다. 문장에 뛰어났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릇이 컸으며 문과(文科)에 급제했다. 예문관 검열(藝文舘檢閱)에 제수되고 호당(湖堂)에 선발되었으며, 내직(內職)으로는 네 조(朝)의 참판을 역임했고, 외직(外職)으로는 팔도 관찰사를 모두 지냈다. 비(妣)는 정부인(貞夫人) 안동 권씨이며 승의랑 승금(承金)의 딸이다. 공은 그의 셋째 아들이다. 가정(嘉靖) 7년 무자년(1528, 중종23)에 태어났다. 스무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어, 두 형을 사우(師友)로 삼아 공부에 힘쓰고 행실을 닦았다. 자라서, 당시 명사(名士)와 함께 사귀었는데 눌재 박상(訥齋 朴祥),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제봉 고경명(霽峰 高敬命),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이 그의 평생 지기(知己)이다. 호남(湖南)에 살 때부터 그 명성이 서울에까지 자자하여, 사람들은 모두 그가 상경하기를 기다렸다.조정에 들어가 홀(笏)을 꼿꼿이 세우면 / 入而正笏노종도(魯宗道), 조변(趙抃)의 풍모가 있고 / 有魚頭鐵面之風외직에 나가 백성을 다스리면 / 出而鳴琴소부(召父)와 두모(杜母) 같은 은택이 많았다네 / 多召父杜母之惠이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의 두 말을 새기니 / 勒玆聖祖之兩言영원히 증명할 수 있으리라 / 足徵我公於百世[주-D001] 호당(湖堂) : 문신 가운데 문장이 뛰어난 사람에게 휴가를 주어서 오로지 학업을 닦게 하던 서재(書齋). 1426년(세종8)에 시작되었고, 그 후 1515년(중종10)에 동호(東湖) 북쪽 기슭, 즉 지금의 두모포(豆毛浦)에 창설하였는데, 이때부터 ‘호당’이라 일컬었다. 독서당(讀書堂)이라고도 부른다.[주-D002] 유연(柳淵)의 옥사 : 유연이 그의 형 유유를 죽였다고 하여 일어난 옥사(獄事)이다. 당시 사안이 애매했는데, 달성령(達城令) 김지(金禔)가 채응규(蔡應圭)를 유유(柳游)라고 하여 그 아우 유연(柳淵)을 죽였다. 이후 김지는 자신의 죄를 승복하였다. 이항복은 유연을 위해 《유연전(柳淵傳)》을 짓기도 했다.[주-D003] 거사비(去思碑) :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기리기 위하여 그 지방 백성들이 세운 공덕비이다.[주-D004] 정옥(頂玉) : 당상관(堂上官)의 조관(朝冠)에 매다는 옥관자(玉貫子)를 말한다.[주-D005] 노종도(魯宗道) : 성품이 강직하여 바른말을 잘했는데, 귀척 대신이 그를 꺼려하여 ‘어두참정(魚頭參政)’이라 불렀다. 이 말은 그의 성(姓)인 ‘노(魯)’ 자의 머리에 ‘어(魚)’ 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낸 말이다. 《宋史 卷286 魯宗道列傳》[주-D006] 조변(趙抃) : 중국 송(宋)나라 때 구주(衢州) 서안(西安) 사람이다. 자는 열도(閲道)이다. 송나라 인종(仁宗) 때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있으면서 권세가나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까지도 거리낌 없이 탄핵하였으므로 철면어사(鐵面御史)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그가 촉(蜀) 지방에 들어갈 때 거문고 하나, 학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간이(簡易)하게 정치를 했다고 한다. 《宋史 卷316 趙抃列傳》[주-D007] 백성을 다스리면 : 원문은 ‘명금(鳴琴)’이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공자의 제자 자천(子賤)이 선보(單父)에 수령(守令)이 되어 가서 거문고를 타면서 백성을 다스린 고사가 전한다.[주-D008] 소부(召父)와 두모(杜母) : 한나라 때 인물을 빗대어 지방 장관의 선정(善政)을 비유한 말이다. 전한(前漢)의 소신신(召信臣)과 후한(後漢)의 두시(杜詩)가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다 같이 덕정(德政)을 베풀었으므로 남양 백성들이 “앞에는 소부가 있고 뒤에는 두모가 있다.〔前有召父 後有杜母〕”라고 칭송한 고사가 전한다. 《漢書 卷89 循吏傳 召信臣》;《後漢書 卷31 杜詩列傳》[주-D009] 이에 …… 새기니 : 선조(宣祖)는 남원 부사 정엄의 치적을 기리면서, “入而正笏 有魚頭鐵面之風 出而鳴琴 多召父杜母之惠”라는 글을 내려 표창했다. 《重菴集 卷46 楊村鄭公淹墓碣銘》
- 2020-12-23 | NO.115
-
- 정광-등서석음(登瑞石吟)
- 瑞石靑春也自好 서석대의 푸른 봄을 좋아하네雖將松岳舊顔來 송악에 있던 나를 누가 데려왔나一回含淚一回哭 한 번 눈물에 또 한 번 통곡하네 水咽出溪鬱此懷 물과 산골짜기 우울한 회포를 삼키네백제 가요 무등산가(無等山歌)는 가사가 전해오지 않으니, 무등산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이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가면 620년 전에 터를 잡은 기념비적인 공간이 있다. 하남정씨(河南程氏)의 시조, 정사조(程思祖)의 2세인 정광(程廣)이 은거했고, 묻힌 땅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사조는 원나라 사람으로 1351년 12월에 고려 공민왕의 왕비인 노국공주를 모시고 개경에 들어온 인물이다. 그는 노국공주를 보필하면서 어사대부(御使大夫, 관리의 감찰 업무를 맡는 관청의 정삼품 벼슬)를 지냈고, 훗날 공신으로 책봉되어 정일품인 삼한삼중대광(三韓三重大匡)으로 추증되었다. 그를 따라온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정도(程度)는 오부부사(五部副使)를 지냈지만 후손이 없어 대가 끊겼다. 둘째 아들 정광은 아버지를 따라온 직후인 135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중성(殿中省, 왕실 살림을 관장하던 부서) 판사(判事)에 이르렀다.
- 2018-09-06 | NO.114
-
- 정금남에 대한 만시 십이 운[挽鄭錦南 十二韻] - 계곡선생집 제29권
- 정금남에 대한 만시 십이 운[挽鄭錦南 十二韻] - 계곡선생집 제29권/ 오언 배율(五言排律) : 장유(張維 1587~1638)서석산(瑞石山)의 수려한 기운 한 곳에 모여 / 瑞石鍾靈秀출중한 영재가 세상에 나왔어라 / 英才出等夷높은 나무 옮겨 앉아 굳센 깃털 다시 닦고 / 遷喬刷勁翮천리마 뒤에 붙어서 앞질러 멀리 치달렸지 / 附驥軼高馳 병서(兵書)의 비의(秘義) 통달한 독보의 경지 / 獨達韜鈴秘단소정한(短小精悍)한 자태라고 모두들 일컬었네 / 皆稱短小姿일찍이 절역에 사신으로 가 / 曾充絶域使멀리 그 이름 알리기도 하였다오 / 贏得遠人知대도가 대궐 문을 기웃거리고 / 大盜闚丹極혜성(彗星)이 궁전에 떨어졌을 때 / 妖星隕玉墀공이 그야말로 흉도를 소탕하여 / 公能掃兇孽한 번 싸워 도성을 수복했어라 / 一戰復京師대려처럼 이어질 빛나는 공훈 / 帶礪勳盟重실력과 인망 어울리는 사령관의 깃발 / 旌旄望實宜국궁진췌(鞠躬盡瘁) 그 은혜에 보답하려다 / 酬恩期盡瘁병에 걸려 홀연히 하직하고 말았구나 / 嬰疾遽長辭적막하도다 청상악(淸商樂) 들리잖고 / 寂寞淸商闋소조하도다 대수가 쓰러졌네 / 蕭條大樹萎흉노를 어느 때나 없앨 수 있을런가 / 匈奴幾時滅가신 이의 혼백을 만인이 사모하네 / 精爽萬人思기련과 나란한 금남의 무덤 / 塚與祁連並그 이름 청사(靑史)에 길이 빛나리 / 名應汗簡垂모르긴 몰라도 기린각(麒麟閣) 위에 / 不知麟閣上금남 같은 공신이 다시 나올까 / 誰繼卽圖詞[주-D001] 정금남(鄭錦南) : 금남은 정충신(鄭忠信)의 봉호(封號)이다.[주-D002] 서석산(瑞石山) : 광주(光州) 무등산(無等山)의 별칭이다.[주-D003] 높은 나무 …… 치달렸지 :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의 사랑을 받으며 그 휘하에서 종군(從軍)하던 중, 그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에 갔다가, 당시 병조 판서이던 이항복(李恒福)으로부터 부자지간과 같은 각별한 은총을 받으며 학문과 무예를 닦아 무과(武科)에 급제한 일을 말한다. 《海東名將傳》 《國朝人物考》 높은 나무 운운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벌목(伐木)의 “出自幽谷 遷于喬木”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으로 신분 상승을 가리키고, 천리마 운운은 《사기(史記)》 백이열전(伯夷列傳)의 “안연이 학문을 독실하게 하긴 했지만, 공자라는 천리마 꼬리에 붙어서 치달렸기 때문에[附驥尾] 그 행실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한편 두보(杜甫)의 시에 “司空出東夷 童稚刷勁翮”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杜少陵詩集 卷16 八哀詩 1》[주-D004] 단소정한(短小精悍)한 자태 : 작달막한 체구에 정명(精明)하고 강한(强悍)한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 유협열전(游俠列傳)에 “곽해(郭解)의 사람됨이 단소정한하였다.”고 하였으며, 전주(前注) 두보의 동시(同詩)에 “短小精悍姿 屹然强寇敵”이라는 표현이 있다.[주-D005] 일찍이 …… 가 : 광해군 13년에 건주(建州)로 들어가 후금(後金)의 정세를 탐지하고 돌아온 일을 말한다.[주-D006] 대도가 …… 기웃거리고 : 인조(仁祖) 2년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주-D007] 대려처럼 …… 공훈 :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에 책훈(策勳)된 것을 말한다. 대려(帶礪)는 “황하가 허리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닳아 없어질 때까지[黃河如帶 泰山如礪]”라는 말이다. 《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주-D008] 실력과 …… 깃발 :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이어 부원수(副元帥)에 임명된 것을 말한다.[주-D009] 청상악(淸商樂) : 고대 한족(漢族)의 민간 음악으로 여기서는 군악(軍樂)을 가리킨다. 참고로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畫角三聲刁斗曉 淸商一部管絃秋 他時麟閣圖勳業 更合何人居上頭”라는 구절이 있다. 《白樂天詩集 卷17, 河陽石尙書 破迴鶻 迎貴主 過上黨 射鷺???? 繪畫爲圖 猥蒙見示 稱歎不足 以詩美之》[주-D010] 대수(大樹) : 동한(東漢)의 대장 풍이(馮異)가 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논공행상이 벌어질 때마다 혼자 나무 그늘 아래로 피했기 때문에 “大樹將軍”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하는데, 바로 정충신을 가리킨다. 《東觀漢記 馮異傳》[주-D011] 기련과 …… 무덤 : 금남군의 묘역이 높은 산마루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기련(祁連)은 흉노의 말로 하늘[天]이라는 뜻이다. 금남군의 무덤은 서산군(瑞山郡)의 북쪽 마힐산(摩詰山)에 있다.[주-D012] 기린각(麒麟閣) : 공신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기념하는 누각을 말한다.
- 2020-09-12 | NO.113
-
- 정기록 正氣錄
- 저작자 고유후(高由厚) 발표시기 1599년(선조 32) 발행 고용후 조선시대 문신·의병장 고경명과 맏아들 종후·둘째아들 인후의 충절 정신과 그 사실을 기록 1599년에 간행한 실기. 충절기록이다. 1책. 목판본. 책의 이름을 ‘정기록’이라 한 것은 중국 송나라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정기가(正氣歌)」에 비유해서 이 책의 서문(序文)을 지은 윤근수(尹根壽)가 거기에서 두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고경명의 아들 유후(由厚)가 이 책을 편찬하고 1599년(선조 32) 유후의 아우 용후(用厚)가 증보, 간행하였다. 본문은 전라도내에 보낸 격서(檄書), 제주절제사 양대수(楊大樹)에게 보낸 격서, 제도(諸道)에 보낸 격서, 각 도에 보낸 통문, 전라도도순찰사에게 보낸 격서, 재상에게 보낸 서한과 별지(別紙), 담양최우(崔遇)에게 보낸 서한, 해남·당진 두 원에게 보낸 격서 등이 수록되었다.이 밖에 도내에 발송한 복수문(復讐文), 두 번째 도내에 보낸 격서, 각 사찰의 승도에게 보낸 통문, 제주에 보낸 격서, 제주 삼가(三家)에 보낸 통문, 이적(李適)과 주고받은 서한과 별지, 도내에 보낸 격서, 진사 백진남(白振南)에게 답한 편지 등을 실었다.또한 윤근수·이정구(李廷龜)·이덕형(李德馨)·이항복(李恒福)·유근(柳根) 등의 서문이 있다. 이외에 정경세(鄭經世)·신흠(申欽)·박승종(朴承宗)·윤훤(尹暄)과 명나라의 어사 손원화(孫元化)와 고용후·김수항(金壽恒)·신익성(申翊聖)·임성헌(林聖憲)·조명교(曺命敎)·박광일(朴光一)·조현명(趙顯命) 등의 발문이 있으며, 사제문(賜祭文)·충렬공시장(忠烈公諡狀) 등이 수록되었다. 부록으로 신도비문·묘갈명·연보 등을 실었다.그런데 인조 이후의 발문은 모두 중간할 때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그 뒤 몇 차례 중간되었다. 1977년 충렬공 제봉(霽峯)고경명의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다음해에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 2020-12-04 | NO.112
-
- 정단(正壇) 32인 - 홍재전서 제60권
- 정단(正壇) 32인 - 홍재전서 제60권 / 잡저(雜著) 7 : 정조대왕(正祖大王, 1752~1800) 사판(祠版)에는 ‘충신지신(忠臣之神)’이라고 쓰고, 제사의 의식은 축문이 있으며 - 축문은 본릉의 한식절 수향(受香) 때 같이 싸 가지고 감 -, 제품(祭品)은 밥 한 주발, 소탕(素湯) 한 대접, 나물과 과일 각 한 소반, 술 한 잔이고, 제관은 부근의 찰방이나 수령으로 한다.축문상례로 씀 내가 즉위한 몇년 세차 간지 모월 모일에 신(臣) 무슨 벼슬 아무개를 보내어 안평대군(安平大君) 장소공(章昭公) 이용(李瑢), 금성대군(錦城大君) 정민공(貞愍公) 이유(李瑜), 화의군(和義君) 충경공(忠景公) 이영(李瓔), 한남군(漢南君) 정도공(貞悼公) 이어(李????), 영풍군(永豐君) 정렬공(貞烈公) 이천(李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양(李穰), 예조 판서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행 병조 판서 삼군도진무사 일성부원군(日城府院君) 정효전(鄭孝全), 증 의정부 영의정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증 영돈녕부사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행 판돈녕부사 정민공(貞愍公) 송현수(宋玹壽), 돈녕부 판관 권완(權完), 의정부 영의정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 의정부 좌의정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이조 판서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 판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 증 의정부 좌찬성 행 도총부 도총관 충숙공(忠肅公) 성승(成勝), 증 병조 판서 별운검 충강공(忠剛公) 박정(朴崝), 증 의정부 좌찬성 행 형조 판서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 증 이조 판서 행 승정원 우승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증 이조 판서 행 형조 참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증 이조 판서 행 집현전 직제학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증 이조 판서 행 예조 참판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증 이조 판서 행 성균관 사예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증 병조 판서 행 도총부 도총관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 증 사헌부 지평 하박(河珀), 의정부 좌참찬 정간공(貞簡公) 허후(許詡), 증 홍문관 부제학 행 집현전 부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증 이조 판서 행 순흥 부사 충장공(忠莊公) 이보흠(李甫欽), 증 공조 참판 영월군 호장 엄흥도(嚴興道)의 신위(神位)에 고하나이다.예로는 함께 제향되어야 하고 / 禮䙡與享의로는 묘정(廟庭)에 배향되어야 하니 / 義取配庭서른 명 남짓한 사람이 / 餘三十人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 炳烺日星갈사가 먼 것을 꺼려서 / 嫌遠葛祠가까이 있는 모옥으로 나아가니 / 就近茅屋서로 돌아보며 흠향함이 / 相將顧歆매년 한식 때일세 / 每年寒食임금과 신하를 일체로 제향하여 / 一體君臣위에는 각이고 아래는 단이니 / 上閣下壇천추만세에 이르도록 / 萬歲千秋길이 옥란을 보호하소서 / 長護玉欄계유년(1453, 단종1), 병자년(1456, 세조2), 정축년(1457, 세조3)에 죽음으로 섬긴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趙遂良) 등 236명의 종사(從祀)하는 신위와 함께 흠향하소서.<중략> 증 의정부 영의정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참판 정충경(鄭忠敬)의 아들이며, 문종의 맏딸 경혜공주(敬惠公主)에게 장가들었다.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종(悰)에게 크게 의지하고 그의 집에 거둥하여 거처하기도 하였다. 을해년(1455, 세조1)에 빈청(賓廳)이 그가 몰래 양빈(楊嬪)을 섬기고 또 유(瑜)와 결탁하였다고 논죄(論罪)하여 영월로 귀양 보냈다. 공주가 병이 나서 상왕이 상에게 고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지금 상왕께서 사자를 보내어 ‘영양위의 공주가 병이 났다’고 하시니, 이는 아마 종을 돌려보내라는 뜻인 듯하다. 내가 듣고 보니 황공하구나. 의금부는 놓아 보내라.” 하였다. 종은 병자년(1456, 세조2)에 광주(光州)에 안치되었다가 신사년(1461, 세조7)에 승려들과 결탁한 혐의를 받고 끝내 죽고 말았다. 공주는 종을 따라 귀양을 가서 몸소 극도의 고생을 겪었지만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 죽자 곧바로 불려 왔다. 아들 미수(眉壽)는 당시 7세의 나이로 공주를 따라 대내(大內)로 들어왔는데, 광묘(光廟 세조)께서 측은히 여기시어 “문종의 외손이 너 한 사람뿐이라는 말인가.” 하고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어 미수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성종의 잠저에 모시라고 명하였다. 예종 원년에 하유하기를, “지난날 내가 광묘를 모셨을 적에 광묘께서 하교하시기를, ‘경혜공주의 아들은 난신의 아들로 논죄하면 안 된다’ 하기에, 내가 곧장 그 하교를 받아 썼다. 미수를 서용(敍用)하라.” 하여, 미수가 우찬성의 벼슬을 지냈다. 영종 기묘년(1759, 영조35) 종에게 영의정이 추증되고 헌민(獻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윤근수(尹根壽)의 《월정만록(月汀漫錄)》을 상고해 보면, 종이 죽고 나서 공주가 순천(順天) 고을의 노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세조실록》에 의거하면, 기묘년(1459, 세조5)에 광주(光州)에 안치된 정종과 그의 아내에게 의복을 내려 주었을 뿐, 그 뒤 순천으로 유배한 사실은 없다. 실록의 초본(抄本)에만 경진, 임오, 을유, 병술 4년이 빠져 있으니, 이는 아마 참고될 만한 사실이 없어서 생략한 것이겠고, 《월정만록》은 당연히 오류이다. 그러나 지금 신사년(1461, 세조7)에 소환한 것으로 적으면서 특별히 영양위(寧陽尉)의 묘지문을 증거로 삼았으니, 당시에 이미 영양위가 죽었다는 사실 역시 믿을 만하다. 또 《해평가전(海平家傳)》에는 공주가 유배지에서 아들을 낳은 것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대내로 데려다 친히 길렀는데, 예닐곱 살이 되어 궁정에서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을 보고 세조가 누구의 아이냐고 묻자 정희왕후가 곧장 전각에서 내려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실록을 상고한 바, 종이 을해년(1455, 세조1)에 유배지로 갔다가 곧바로 풀려나서 병자년에 비로소 광주에 안치되었고, 처첩과 자녀들이 같이 따라가 살기를 자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주가 유배지로 따라간 시기는 당연히 병자년일 것이고 병자년에서 신사년까지는 겨우 5년 동안인데, 설령 병자년에 곧바로 아들을 두었다 하더라도 예닐곱 살이 되도록 자랐다면 공주가 소환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때까지 대내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거니와, 또 과연 유배지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올 리도 없으니, 이 말은 매우 믿을 수 없다. 예종이 일찍이 “종의 아들과 그의 아내를 들여 뵙도록 하니, 세조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눈물을 훔치며, 나로 하여금 전교를 써 내려서 연좌를 윤허하지 말도록 하셨다. 내가 지금 어찌 감히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한 전교가 국사에 실려 있는데, 하신 말씀이 정녕하고, 영양위의 유사(遺事)에 미수(眉壽)가 공주를 따라 대내로 들어갔다고 한 기록이 실록과 합치되므로 지금 영양위의 유사를 따라 쓴다.
- 2020-09-30 | NO.111
-
- 정도전- 극복루에서
- 정도전이 용진사 극복루에 오른 것은 무열대사無說大師가 지은 기문를 읽고 오르고자 했다고 그가 읊은 시에서 이르고 있다.曾讀山人記 일찍이 산인(無說山人)의 기를 읽고서思登克復樓 극복루(克復樓)에 오르리라 생각했다오試尋苔徑細 이끼 낀 오솔길을 더듬어 찾아來入洞門幽 깊숙한 동문(洞門)에 들어를 왔네-삼봉집 제2권
- 2020-04-28 | NO.110
-
- 정도전-동정의 시운을 받들어 차운함[奉次東亭詩韻]
- 水流竟到海 물은 흘러도 종당 바다로 가고 雲浮長在山 구름은 떠도 항상 산에 있다오 斯人獨憔悴 이 사람은 홀로 시들어 가며 作客度年年 나그네로 한 해 한 해 보내고 있네賃屋絶低小 빌린 집이 너무도 작고 낮아서朝暮熏炊煙 아침 저녁 더워라 밥 짓는 연기有時散紆鬱 이따금 우울증을 풀어 보자고 步上東山巓 걸어서 동산 마루에 오른다茂珍遙望城 아스라이 무진성 바라보니 中有高人閒 그 가운데에 한가한 고인이 있네 目送飛鳥去 눈으로 나는 새를 보내나니 我思空悠然 내 생각 부질없이 유유하구려-삼봉집 제1권조선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이 창건 전에 광주에 유배왔다가 1년을 보냈다. 이때도 광주가 무진군(茂珍郡)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018-07-06 | NO.109
-
- 정봉현-早發光州(아침 일찍 광주를 출발하다)
- 馬車曉待板橋頭 말수레는 새벽에 판교 끝에서 기다리는데 于役關心孰與謀 행역(行役)을 우려하는 마음 누구와 도모할까暑去還愁尋舊襖 더위가 물러가 옛 두루마기 찾기를 근심하고雨來却怕作洪流 비가 오니 홍수가 될까 두려워하네-운람선생문집(雲藍先生文集)정봉현(鄭鳳鉉)은 구한말 시기 사람으로 노사 기정진의 문인이다.
- 2018-07-10 | NO.108
-
- 정봉현-留光州城南(광주성 남쪽에 머물다)
- 今過頓殊舊所知 오늘 지나감에 문득 옛 모습과 다르니 方謀西笑故淹遲 서울로 가려다가 일부러 머물렀다네衰年霜髮三千丈 노쇠한 나이에 백발이 삼천장인데卓午鍾聲十二年 정오의 종소리는 12년 전 그대롤세
- 2018-07-10 | NO.107
-
- 정순방-양파정을 지나며(過楊波亭)
- 楊波水上浩然歸 양파정 물길이 도도히 돌아 흐르는데可識當年世與違 지금에 이르러 세상과 어긋났음을 알겠네晴日浮光金自躍 맑은 햇빛은 물위로 금빛으로 출렁거려輕風弱絮雪如飛 가벼운 바람에도 버들솜은 눈처럼 날리네詠觴太適人皆醉 시와 술 어울려 사람들 모두 취하고坐卧平安客亦依 앉든 눕든 편안하니 길손도 의지하네亭上尤好同看月 정자에서 함께 달구경하기 좋으니不嫌昏夜叩江扉 밤에 강가 사립문 찾음도 무방하리-초당집(草堂集)정순방(鄭淳邦, 1891-1960)의 자는 표덕(表德)이며 호는 초당(草堂)이다.
- 2018-07-10 | NO.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