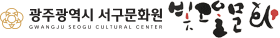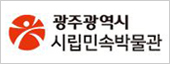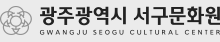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20건
-
- 풍재(風災)의 상황을 순영(巡營)에 보고하다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 - 光州牧使○ 영조(英祖) 39년(1763) 8월 14일풍재(風災)의 상황을 순영(巡營)에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본부(本府)의 농형(農形)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에 대략 첩보하였습니다. 이달 초4일 아침부터 동풍(東風)이 크게 일어나 3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불다가 초7일 인시(寅時 오전 3시~5시)에 그치더니, 비가 또 저녁부터 밤새도록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흩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초8일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에 동풍이 다시 비를 대동하고 불다가 초9일 저녁에 이르러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비가 개었습니다. 그런데 개천과 도랑이 넘쳐흐른 바람에 물 주변의 전답(田畓)이 또 간간이 떨어져나가거나 토사(土沙)가 뒤덮은 환난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이미 익은 올벼는 바람이 지나간 곳마다 간간이 낱알이 떨어지기도 하였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은 곳도 많았는가 하면 익어 가는 늦벼와 늦게 이앙하여 이삭이 막 패는 벼 및 전지의 팥ㆍ콩ㆍ기장ㆍ벼 등은 더욱더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대 건조한 곳에 가장 늦게 이앙하여 지금 막 이삭을 머금고 있는 벼는 역풍(逆風)이 짓밟아서 전혀 열매를 따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다래가 약간 남아 있는 목화(木花)도 모두 시들고 손상되어 전부 농사를 실패하였습니다.그중에 동면(東面)의 하번암(下磻巖)과 산동(山東), 남면(南面)의 산동(山洞), 북면(北面)의 보현(寶賢)과 고사(高寺) 등 5방(坊)은 협곡에 가까운 지대여서 혹독하게 풍재를 입어 혹은 온 들이 재해를 입기도 하고 혹은 일자(一字)의 전 지역이 재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면보(面報)에 백성의 하소연이 매우 분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해 보니 낱알이 약간 떨어진 올벼는 돌아볼 것도 없고 늦게 이앙하여 이삭을 머금고 아직 열매를 이루지 못한 늦벼는 비가 지나간 뒤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꼿꼿이 서서 말라버렸으므로 보기에 수심을 자아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산동(山東)ㆍ산동(山洞)ㆍ고사(高寺) 등 3방(坊)은 이른바 전 들판과 전 일자(一字)가 재해를 입었다는 백성들의 말이 더러 실정에 지나친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자(一字)나 일필지(一筆地)의 재해가 다소 천심의 구별이 있으므로 평명(坪名)과 자호(字號)를 전부 들어 재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번암과 보현 2방(坊)은 전 지역이 재해를 입은 곳이 가장 많아 열매를 따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는 논곡식만 그렇지 않고 밭의 각종 곡식 중에 풍재(風災)를 입은 곳이 도처마다 된서리를 맞아 시들어 하얗게 되어버렸으므로 매우 애긍하고 참담하였습니다.금년의 농사는 가뭄과 장마가 번갈아 도래한 바람에 이미 많이 재해를 입은 데다 뜻밖에 풍재로 입은 손상이 또 이처럼 심하므로 결국 흉년의 탄식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민사(民事)를 생각할 적에 고민과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린 상황은 곧바로 치보(馳報)해야 합니다만 지역이 광대하여 각 면(面)에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자세히 조사하는 사이에 자연히 지연되었으니, 또한 매우 황송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모두 첩보합니다.제사(題辭)계문(啓聞)하겠다. 첩보는 접수하였음.[주-D001] 자호(字號) : 어떤 사물의 차례를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차례에 따라 매긴 호수(號數). 토지의 경우 5결(結)마다 하나의 자호를 부과하였음.
- 2023-08-17 | NO.30
-
- 한유천(韓柳川)에게 보냄 - 성소부부고 제20권
- 한유천(韓柳川)에게 보냄 신축년(1601) 8월 - 성소부부고 제20권 / 문부(文部) 17 ○ 척독 상(尺牘上) : 양천(陽川) 허균(許筠 1569~1618)해양(海陽 광주(光州)의 고호)의 모임에 감히 즐겁게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부사(府使)가 있어 참견할 수 없는 형편이니 공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사람들이 혹은 저의 이번 행차를 소상(蕭湘)의 만남이라고 비웃는데, 이것은 충분히 피할 수는 있으나 역시 꼭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젋은 시절은 번개처럼 빠른데, 한 차례의 환락은 충분히 만종(萬鍾)의 녹봉에 해당됩니다. 참으로 그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욕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어찌 나의 털구멍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꼭 의리에 해롭지도 않는데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공께서 음식을 드시다가 이것을 보시면 반드시 웃음이 나서 밥상 가득히 입 속의 밥을 뿜고 말 것입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주-D001] 한유천(韓柳川) : 선조ㆍ광해군 때에 벼슬이 호조 판서ㆍ영돈령부사에 이르렀던 한준겸(韓浚謙)을 말함. 유천(柳川)은 그의 호.[주-D002] 소상(瀟湘)의 만남 : 기이하게 서로 만나는 것을 뜻함. 소상은 소상우(瀟湘雨)의 준말로, 원(元) 나라 양현지(楊顯之)가 지은 극곡(劇曲) 이름.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지방관(地方官) 장상영(張商英)이 딸 취란(翠鸞)을 데리고 부임하는 도중, 회하(淮河)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었을 때 취란은 어옹(漁翁)에게 구조를 받았다. 이것을 인연으로 취란은 그 어옹의 조카 최통(崔通)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후 최통이 과거에 급제하여서는 시관(試官)의 딸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 고을에 부임해 왔다. 취란이 그를 찾아가자 그는 무정하게 배척하여 취란을 관권(官權)으로 사문도(沙門島)에 유배하였는데, 그 유배 도중 임강역(臨江驛)에서 아버지와 딸이 기이하게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 2020-09-22 | NO.29
-
- 향중(鄕中)에 체문(帖文)을 하달하다-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 光州牧使영조(英祖) 39년(1763) 7월 초6일 향중(鄕中)에 체문(帖文)을 하달하다본관(本官, 광주목사光州牧使)이 부임한 지 지금 3년이 되었으나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폐막을 바로잡거나 구제한 바가 없으므로 고인(古人)처럼 녹봉을 받은 만큼 일을 하지 못하여 부끄러워하고 있다.재 취합해 놓은 쌀이 40포(包)가 있어서 각 면(面)에 내주었으나 수량이 넉넉하지 않아 하나의 폐막을 없애는 밑천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향중(鄕中)에서 편의에 따라 조처하여 목전에 직면한 공공방역(公共防役)의 일에 혹시라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폐단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주-D001] 체문(帖文) : 수령(守令)이 관하의 면임(面任)ㆍ훈장(訓長), 향교의 유생 등에게 유시하는 문서.
- 2023-08-17 | NO.28
-
- 향집강안(鄕執綱案)을 봉인(封印)하여 바칠 것을 지시하는 순영(巡營)의 관문(關文), 1766.6.18.-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영조(英祖) / 영조(英祖) 42년(1766)6월 18일 향집강안(鄕執綱案)을 봉인(封印)하여 바칠 것을 지시하는 순영(巡營)의 관문(關文)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가 상고(相考)하는 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향집강의 명색문안(名色文案)에 명단의 표를 붙인 수가 매우 많은데, 향중(鄕中)의 권한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수많은 부류를 불러들이고 끌어모아 읍과 촌락을 횡행한 바람에 백성들이 고초를 받는다고 한다. 이른바 교중회(校中會)ㆍ서원회(書院會)ㆍ읍중회(邑中會) 등이 없는 달이 없는가 하면 절일(節日)에 도처의 각 사찰마다 모여 놀면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침해하는 폐단이 하나뿐이 아니라고 한다. 아울러 다른 가호(家戶)에 빌려준 곡물의 권한을 대신 받아 그 호주(戶主)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면서 강제로 결역(結役)의 값을 징수하되, 결주(結主)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이 밖에도 그들이 기세를 부리며 횡행하는 허다한 버릇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이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류의 폐단이 반드시 끝없을 것이다. 이에 관문을 보내는 바이니, 관문이 도착한 즉시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우두머리로 폐단을 저지른 두세 사람의 이름을 적발하되, 그들이 범한 죄목과 아울러 신속하게 첩보함으로써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하고, 이른바 향적(鄕籍)과 집강안(執綱案)도 일체로 수색해 넣은 다음 봉인하여 올려야 할 것이다.
- 2023-10-16 | NO.27
-
- 향집강안(鄕執綱案)을 올리는 일에 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 1766.9월 초2일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영조(英祖) / 영조(英祖) 42년(1766)9월 초2일 향집강안(鄕執綱案)을 올리는 일에 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이번에 도착한 사또(使道)의 관문에 이른바 향적은 바로 본주(本州)에서 전 고려조 이래 명공(名公)과 거유(巨儒)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한 문안인데, 향청(鄕廳)의 높은 벽장 가운데 깊이 간직한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굳게 봉인해 놓았으므로 평상시에 개폐(開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정묘년(丁卯年, 1747, 영조23) 간에 새 문안을 편성하였으나 그때 소요가 크게 일어난 바람에 작파하여 사용하지 않고 단지 옛날 문안 2건만 있는데, 그것도 70여 년 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향집강의 명색이 기록된 문안이 아니고 바로 한 고을 향당(鄕黨)의 고로(古老) 성명을 기록해둔 것이므로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향집강은 지금 문안이 없고 향로(鄕老) 6원(員), 향유사(鄕有司) 6원 등의 명색을 판자에다 새겨서 향청(鄕廳)의 벽에 걸어두고 이를 허목판(虛目板)이라 이르는데, 향유(鄕儒) 중에 연로자의 이름표를 그 명색의 밑에 붙여 놓고 거행합니다. 그 수가 무려 18원이나 되지만 문안으로 작성된 책은 없고 현판에다 죽 명단을 붙여 시행하고 있으니, 문안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할 지 지시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목사(牧使)가 부임한 뒤로 향회(鄕會)를 연 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앞장서서 폐단을 저지른 사람이 아직 발각되지 않았습니다만 각별히 엄하게 금지하여 차후에 만약 그러한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대로 적발한 다음 이름을 지적하여 첩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모두 첩보합니다.제사(題辭)이른바 현판은 즉시 파쇄(破碎)한 뒤에 첩보해야 할 것이다.
- 2023-10-16 | NO.26
-
- 향집강안(鄕執綱案)을 올리는 일에 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 1766.8.22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영조(英祖) / 영조(英祖) 42년(1766)8월 22일 향집강안(鄕執綱案)을 올리는 일에 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이번에 도착한 사또(使道)의 관문에 이른바 향적은 바로 본주(本州)에서 전 고려조 이래 명공(名公)과 거유(巨儒)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한 문안인데, 향청(鄕廳)의 높은 벽장 가운데 깊이 간직한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굳게 봉인해 놓았으므로 평상시에 개폐(開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정묘년(丁卯年, 1747, 영조23) 간에 새 문안을 편성하였으나 그때 소요가 크게 일어난 바람에 작파하여 사용하지 않고 단지 옛날 문안 2건만 있는데, 그것도 70여 년 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향집강의 명색이 기록된 문안이 아니고 바로 한 고을 향당(鄕黨)의 고로(古老) 성명을 기록해둔 것이므로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향집강은 지금 문안이 없고 향로(鄕老) 6원(員), 향유사(鄕有司) 6원 등의 명색을 판자에다 새겨서 향청(鄕廳)의 벽에 걸어두고 이를 허목판(虛目板)이라 이르는데, 향유(鄕儒) 중에 연로자의 이름표를 그 명색의 밑에 붙여 놓고 거행합니다. 그 수가 무려 18원이나 되지만 문안으로 작성된 책은 없고 현판에다 죽 명단을 붙여 시행하고 있으니, 문안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할 지 지시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목사(牧使)가 부임한 뒤로 향회(鄕會)를 연 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앞장서서 폐단을 저지른 사람이 아직 발각되지 않았습니다만 각별히 엄하게 금지하여 차후에 만약 그러한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대로 적발한 다음 이름을 지적하여 첩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모두 첩보합니다.제사(題辭)이른바 현판은 즉시 파쇄(破碎)한 뒤에 첩보해야 할 것이다.
- 2023-10-16 | NO.25
-
- 허균-광주서사(光州書事)
- 鳳笙亭畔獨徘徊 봉생정 정자 가에 외로이 서성대니宋玉無心賦楚臺 송옥은 고당부(高唐賦)를 지을 생각 없었어라山鳥似迎佳客語 산새는 손을 맞아 이야기 나누자는 듯 野梅如待故人來 들 매화는 벗님 오길 기다리는 것도 같네愁侵衰鬢千莖雪 시든 귀밑 시름 스며 터럭마다 눈이라면恨結柔腸一寸灰 유한 창자 한이 맺혀 한 치 마음 재가 됐네 公館漏闌廊月黑 공관에 밤이 늦어 달빛이 어슴푸레曲欄深閤影枚枚 굽은 난간 깊은 문은 그림자 아른아른 * 광주에서 즉사(卽事)를 쓰다 - 성소부부고 제1권 남정일록(南征日錄) : 양천(陽川) 허균(許筠 1569~1618)
- 2018-07-31 | NO.24
-
- 허종-暮春二十七日到光州軒前春白花盛開次板上韻以記之
- 故園無數蔽烟岑 고향은 무수히 연기 낀 봉우리가 가렸는데借此能開萬里襟 이를 빌려 만리의 흉금을 털어놓는다兩眼風流須縱觀 두 눈은 풍류보기를 필경 멋대로 하는데共階松竹是知音 앞산의 송죽(松竹)만이 내 마음을 아는 친구로다.滿枝點注靑春色 모든 가지는 점점이 청춘의 빛을 드러내고間葉遮成白日陰 사이 사이의 잎은 가리어 대낮에 그늘을 만드는구나西北去年那有爾 서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왔지만, 어찌 너 같은 것 있겠는가一樽相賞莫違心 한 동이 술로 서로 유쾌하게 하여 마음을 변치 말 것이로다-상우당집(尙友堂集)허종(許琮, 1434-1494)의 자는 종경(宗卿), 종지(宗之)이며 호는 상우당(尙友堂)이다. 조선시대 문신이요 정치인, 누정시인이요 대신으로서 군직(軍職)에 제수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희경루에 올라 읊은 시로 알려져 있다.
- 2018-07-26 | NO.23
-
- 현고(顯考) 장사랑(將仕郞) 경기 참봉(慶基參奉) 기 부군(奇府君)에 대한 묘기(墓記)- 고봉집 제3권
- *고봉집 제3권 / [비명(碑銘)] 현고(顯考) 장사랑(將仕郞) 경기 참봉(慶基參奉) 기 부군(奇府君)에 대한 묘기(墓記) 선부군(先府君)의 휘는 모(某)요, 자는 자순(子順)이며, 성은 기씨(奇氏)이니, 행주인(幸州人)이다. 증조의 휘는 건(虔)인데 판중추부원사(判中樞府院使)로 시호는 정무공(貞武公)이며, 증조비는 정경부인 홍씨(洪氏)이다. 조고의 휘는 축(軸)인데 행 풍저창 부사(行豐儲倉副使)로 사헌부 장령에 추증되었으며, 조비는 영인(令人) 정씨(鄭氏)이다. 선고의 휘는 찬(襸)인데 홍문관 부응교이며, 선비는 숙인(淑人) 김씨이다. 부군은 성화(成化) 정미년(1487, 성종18) 12월 정해일에 출생하였는데, 6세에 부친을 잃었다. 장성하자 높은 뜻이 있어 아우 준(遵)과 함께 공부하였는데 하루에 수백 자를 외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자에 힘을 써 경사(經史)를 통달하고 옛날과 지금의 일을 꿰뚫었다. 공은 널리 배우고 예(禮)로 몸을 단속하고자 하였고, 오로지 과거에 급제하여 녹을 먹으려는 계책을 하지 않았다.아우가 먼저 조정에 올라 이름을 드날렸는데 불행히도 견책을 받아 죽자 부군은 이미 당세에 벼슬할 뜻이 없었다. 그러나 모친인 숙인께서 당(堂)에 계셨으므로 남을 따라 과거에 응시하였다. 가정(嘉靖) 원년인 임오년(1522, 중종17)에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며, 그 후 5년에 재상의 천거로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에 제수되고 장사랑(將仕郞)에 올랐다. 다음 해인 무자년(1528)에 모친상을 당했으며, 상을 마치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마침내 광주(光州)에 거주하였다. 집은 광주 읍내의 서북쪽 40리쯤 되는 곳에 있었으니, 지방 이름을 고룡(古龍)이라 하고 동네 이름을 금정(金井)이라 하였다.부군은 집에 있을 때에 쓸쓸하여 일이 없는 듯하였다. 화목(花木)을 심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구경하였으며, 서사(書史)를 열람하여 득실을 상고할 뿐이었다. 말년에 흉년을 만나 아침저녁의 끼니가 걱정인데도 태연히 자처하였다. 을묘년(1555, 명종10) 1월 신해일에 정침(正寢)에서 별세하니 향년 69세였다.부군은 천품이 정직 성실하고 소탈하여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엄하면서도 까다롭지 않고 검박하며 사치하지 않았다. 책을 볼 때에는 대의를 통달하기에 힘썼으며, 일찍이 장구(章句)를 표절이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은 시문이 수백 편이다.전배(前配)는 남양 방씨(南陽房氏)인데 일찍 별세하였고, 후배(後配)는 유인(孺人) 강씨(姜氏)인데 관향이 진주(晉州)이다. 부친의 휘는 영수(永壽)로 충좌위 사과(忠佐衛司果)이며, 조고의 휘는 학손(鶴孫)으로 장례원 사평(掌隷院司評)이며, 증조의 휘는 희맹(希孟)으로 의정부 좌찬성을 지내고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유인은 단정하고 공손하며 은혜로워 부군에 배필할 만하였다.5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대림(大臨)이요, 차남은 대승인데 생원이며, 막내는 대절(大節)이다. 나머지는 모두 요절하였다. 유인은 부군보다 22년 전에 별세하였는바 집 뒤 2리쯤 되는 갑좌경향(甲坐庚向)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부군이 별세하자, 그해 3월 경신일에 유인의 무덤 남쪽에 장례하니 선산이기 때문이었다.선비께서 별세할 때에 여러 아들들은 모두 10세가 넘지 못하였다. 부군께서는 홀아비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자식들을 부지런히 어루만지고 가르쳐 장성함에 이르렀는데, 모두들 미련하고 어질지 못해서 가정의 교훈을 만분의 일도 현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죄악이 쌓여 마침내 부군에게 화가 미쳐 별세하였으니, 슬피 울부짖으매 애통한 마음이 뼛속에 사무친다. 이에 감히 묘기를 이와 같이 짓는 것이다. 묘표에 글을 적는 일은 후일을 기다려 할 것이다. 슬픈 마음 하늘처럼 다함이 없으니, 아, 애통하다.
- 2020-09-10 | NO.22
-
- 호남(湖南) 의병 -연려실기술 제17권
- 호남(湖南) 의병 -연려실기술 제17권의병장 고경명은 이미 죽었고, 김천일은 경기 좌의병(左義兵) 진중으로 갔다. 사자(士子)들이 흩어진 군사 8백 명을 모으고, 전 부사 화순(和順) 사람 최경회(崔慶會)를 추대하여 맹주로 삼았다. 7월 26일에 깃발과 북을 광주(光州)에 세우고 골(鶻)자로 신표를 삼았다. 전라우도에서 군사를 거두어 남원으로 향하면서 격문을 지어 돌리고 효유하였다.○ 10월에 진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적군이 사방으로 나뉘어서 약탈하였다. 경회가 군사를 단성(丹城)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적군이 갑자기 닥치니 장수와 군사들이 놀라서 무너졌다.○ 11월에 통정에 오르고, 계사년 2월에 우병사(右兵使)에 임명되었으며, 6월에 진주 전투에서 죽었다.○ 7월에 보성(寶城) 사람 임계영(任啓英)은 동지 여러 사람과 함께 격문을 전하여 군사를 모집해서 향토를 지킬 계획으로 본국을 출발하여 낙안(樂安)ㆍ순천(順天)을 거쳐 그 역시 남원으로 향해 갔는데, 가는 도중에 군사 천여 명이 얻었다. 좌의병장(左義兵長)이라고 일컬으면서 호(虎)자로 신표를 삼았다. 처음 인장에는 호랑이를 그렸으나 뒤에는 호자를 썼다. ○ 남원 사람 전 참봉 변사정(邊士貞)은 흩어진 군사를 불러 모아 수십일 안에 2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적개의병장(敵愾義兵將)이라고 불렀다. 진주 전투에 부장 이잠(李潛)을 파견하였는데,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 남원의 백성들이 흩어진 군사를 불러 모아 향병(鄕兵)이라 부르면서 정염(丁焰)을 장수로 추대하였다.○ 순천 무사인 강희열(姜希悅)은 처음에는 고경명을 따라 군사를 일으켰는데, 금산(錦山)에서 패하자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군사를 불러모아 전진하였다.○ 해남 사람 진사 임희진(任希進)과 영광(靈光) 사람 첨정(僉正) 심우신(沈友信)과 태인(泰仁) 사람 민여운(閔汝雲)이 각각 군사를 모집하여 영남으로 갔는데, 모두 진주 전투에서 죽었다.○ 해남의 임시 장군 성천기(成天祇)는 뇌진군(雷震軍)이라고 써서 신표를 삼고 국가의 일에 힘을 다 하였다.○ 임피 사람 진사 채겸진(蔡謙進)ㆍ이이남(李以南)이 의병을 일으켰다.○ 계사년 8월에 전라 우의병(全羅右義兵)과 복수병(復讐兵) 선비들이 나머지 군사를 수습하여 전 제독관 화순 사람 최경장(崔慶長)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고 계의(繼義)라고 써서 신표를 삼았다. 경장은 경회의 아우이다.○ 11월에 계의군(繼義軍)을 해체시키고 그 군량을 초승군(超乘軍 김덕룡(金德龍)의 군대를 칭하는 것으로 초승(超乘)은 말을 훌쩍 뛰어서 탄다는 뜻이다.)에 귀속하게 하였다.○ 적군이 지례(知禮)로부터 호남을 침범할 때에 알수 없는 5, 백 명의 사람들이 청학장군(靑鶴將軍)ㆍ백학장군(白鶴將軍)이라고 자칭하면서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쏘아 죽였다.
- 2020-09-24 | NO.21
-
- 호조 참판을 사직한 상소〔辭戶曹參判疏〕- 서형수
- 명고전집 제3권 / 소계(疏啓)호조 참판을 사직한 상소〔辭戶曹參判疏〕삼가 아룁니다. 신은 조정에 나가지 않고 칩거하며 분수를 지켜온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지방관을 지내고 사행(使行)을 다녀온 것은 감히 그 직임을 자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상께서 보살펴 주신 하늘 같은 은혜 때문이었으니, 보잘것없는 충정(衷情)이 생각마다 북받쳐 말을 하려니 목이 멥니다.조정 밖에서 하는 일이라면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어디로든 가서 오직 명에 따르겠다는 것이 신이 밖으로 표방하고 가슴에 새겨 온 다짐입니다. 이 때문에 고을 수령이 되어 일산을 쓰고 인끈을 차는 영광을 많이도 받았고, 고관의 신분으로 부절(符節)을 들고 사행길에 오르는 등 점점 더 융숭한 총애를 받았지만, 신의 처지로 어찌 아무 탈 없는 사람들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신하로서의 도의(道義)가 큰 분한(分限)으로 이미 정해진 마당에 관례대로 으레 사양만 하는 것은 가식(假飾)에 가깝겠기에 직임이 제수될 때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응했던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천지요 부모이신 우리 성상께서만은 신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위태로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압니다.신은 반년 동안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조정에 올라 성상의 옥음(玉音)을 직접 들었으니, 어린 자식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천리와 인정상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신이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호조 참판에 제수하는 소패(召牌)가 내렸으니, 벼슬을 제수받으면 사은숙배하는 신하의 도리상 어찌 감히 황급히 받들어 숙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비록 규례에 저촉되어 잠시 소명(召命)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내 “구애하지 말라”는 특교를 받아 그런대로 신하로서의 도리를 행할 수 있었으니, 신의 진심이 드러나고 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관직에 나아가는 일로 말하면, 아,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논할 수 있겠습니까.신은 연전에 왕명을 받들어 《대학유의(大學類義)》를 교열(校閱)하였는데, 그때 구준(邱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읽고는 저도 모르게 수없이 읊조리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임금은 신하를 자식처럼 대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아비처럼 섬기지 않고 임금은 신하를 가족처럼 길러주는데 신하가 나랏일을 집안일처럼 보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니다.”아, 이는 천고(千古)의 충신과 지사(志士)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신의 평소 맹세와 염원은 오직 이 마음을 보존하자는 것뿐이니, 어찌 굳이 조정에서 벼슬하여 영화와 녹봉을 거머쥔 뒤에야 망극한 성은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의복이 신분에 걸맞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기가 집중되고, 인품에 비해 복이 지나치면 귀신의 노여움이 닥칩니다. 신은 환해(宦海)의 풍파 속에 거의 죽어가던 몸으로 성상의 망극한 은혜를 입었으니, 성상께서는 정적(政敵)들의 집중포화 속에서 신을 빼내어 살려주시어 여생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뱀이 야광주로 보답하고 참새가 흰 옥고리로 보답한 일을 본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슨 마음으로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닥침을 생각지 않고 세상에서 활개 치며 더 높은 벼슬에 올라 차마 목숨을 살려주신 우리 자애로운 성상의 지극한 은덕을 저버리겠습니까.아, 만나기 어려운 밝은 시대에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주시니, 목숨이 다하도록 노력해도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안일을 탐하여 옹송그리고 있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혹여 밝으신 성상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천지조화 같은 은혜를 곡진히 베푸시어 신의 벼슬을 체차하고 산직(散職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에 있게 해 주신다면, 신은 성상을 영영 떠나 나랏일을 외면하지 않고 때때로 벼슬에서 물러난 비정규 인원으로서 서책을 편집하고 교정하는 등의 일에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다보니 글자마다 어조가 너무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신이 상소문을 작성하여 올리려던 참에 승정원의 직임으로 옮겨 제수하신 명을 또 받았으니, 더욱더 황공합니다. 그러나 신의 구구한 처지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 달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왕명을 어기게 되었으니, 성상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메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피눈물로 간절히 기원하며 두 손 모아 명을 기다립니다.[주-D001] 호조 참판을 사직한 상소 : 【작품해제】 명고가 51세 때인 1799년(정조23) 11월 20일에 올린 상소이다. 이 상소가 《승정원일기》 1799년(정조23) 11월 20일 조에는 ‘행 좌승지 서형수(行左承旨徐瀅修)’가 올린 상소로 실려 있으며, 뒤의 〈한성부 좌윤을 사직한 상소[辭左尹疏]〉에서 이 상소의 언급 “조정 밖에서 하는 일이라면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어디로든 가서 오직 명에 따르겠다는 것이 신이 밖으로 표방하고 안으로 가슴에 새겨 온 다짐입니다.”를 인용하면서 “작년 겨울 승지에 제수하셨을 때”의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소를 올린 시점의 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사직 상소 제목의 상례(常例)에 따르면 이 작품의 제목은 ‘좌승지를 사직한 상소[辭左承旨疏]’가 되어야 한다.명고는 1799년 7월 8일에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차출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온 뒤 11월 17일에 귀국 보고를 하였는데, 이날 바로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이틀 뒤인 19일에 좌승지에 제수되었다. 좌승지에 제수된 시점이 호조 참판에 대한 사직소를 작성하고 미처 올리기 전이었다. 이 때문에 기왕에 작성해 둔 호조 참판 사직 상소 말미에 좌승지에 대한 사직 의사를 간단히 덧붙여 올린 것인데, 이로 인해 이 상소는 호조 참판을 사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좌승지를 사직하는 내용은 말미의 한 문장에 불과하게 되었다. 문집을 편차할 때 내용의 비중을 고려하여 제목을 정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상례에는 맞지 않다.명고는 이해 사행을 떠나기 직전에 영변 부사(寧邊府使)로 재직 중이었는데, 아직 해유장(解由狀 벼슬아치가 물러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한 내용을 적은 문건. 실제 근무 일수, 재정 관계 문건과 그 정확성 따위를 적음)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호조 참판과 좌승지에 새로 제수하는 것이 격식에 맞지 않았지만 정조는 “구애하지 말라[勿拘]”는 특교(特敎)를 내려 그대로 제수하게 하였다. 《承政院日記 해당 날짜》이 상소에서 명고는 1791년(정조15) 우승지(右承旨)를 지낸 것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조정의 벼슬에는 나가지 않고 지방관과 임시 벼슬에만 응해온 자신의 정상(情狀)을 들어 호조 참판과 좌승지를 차례로 사직하였다. 정조가 이에 대해 “사직하지 말라”는 비답을 내리지만 명고는 끝내 응하지 않는다.[주-D002] 신은 …… 되었습니다 : 명고는 우승지로 재직 중이던 1791년(43세)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전최(殿最 근무 성적 평가) 문서를 임금의 주관 하에 개봉하여 결재하는 자리에 규정을 어기고 불참했다는 이유로 추고(推考) 당한 이후, 같은 해 성천 부사(成川府使), 1796년(48세) 광주 목사(光州牧使), 1799년(51세) 영변 부사(寧邊府使) 등 외직(外職)으로만 돌고 중앙의 관직은 맡지 않았다.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6月 15日ㆍ24日, 20年 7月 17日, 23年 6月 19日》이는 임자년(1792, 정조16)에 정동준(鄭東浚) 등이 명고의 집안을 무고(誣告)했기 때문으로(《明皐全集 卷3 辭左尹䟽, 卷4 辭刑曹參判䟽 》), 1792년부터 이해까지가 햇수로 8년이 된다.[주-D003] 사행(使行)을 다녀온 것 : 명고는 1799년 7월 8일에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차출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온 뒤 11월 17일에 귀국 보고를 하였다.[주-D004] 반년 …… 들었으니 : 명고는 1799년 7월 8일에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차출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온 뒤 11월 17일에 귀국 보고를 하였다.[주-D005] 비록 …… 있었으니 : 명고가 미처 해유장(解由狀)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제수가 보류되는 바람에 사은숙배를 하지 못하다가, “구애하지 말라”는 특교로 인해 그대로 제수되어 사은숙배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명고는 1799년(51세) 6월부터 영변 부사(寧邊府使)의 직임을 수행하다가 7월 8일에 진하 겸 사은부사로 차출되어 연경에 갔으며 귀국 보고를 한 11월 17일 당일에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니, 영변 부사의 직임을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겨를이 없었다. 이는 새로운 벼슬을 제수하는 데 있어 하자(瑕疵) 사항이므로 이조(吏曹)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해유장 제출 여부에 구애하지 말라”는 특교를 내렸다. 《承政院日記 正祖 23年 7月 8日, 11月 17日ㆍ19日》[주-D006] 신은 …… 교열(校閱)하였는데 : 《대학유의(大學類義)》는 정조가 송(宋)나라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대학연의(大學衍義)》와 명(明)나라 구준(丘濬, 1421~1495)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서 초록할 부분에 직접 비점을 찍고 규장각 신하들 및 신구(新舊) 초계문신(抄啓文臣)들에게 명하여 초록과 교정을 시킨 다음 《대학장구》의 각 장(章) 밑에 주석 형태로 덧붙여 1799년 간행한 책으로, 모두 21권 10책(규장각 소장 청구번호 : 奎291-v.1-10)이다. 《홍재전서(弘齋全書)》 〈군서표기(羣書標記)〉에는 20권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전본보다 1권이 적으나, 권차별 항목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명고는 이때 광주 목사(光州牧使)였는데, 전(前) 초계문신의 자격으로 초록 내용의 1차 교정을 수행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22年 9月 6日》[주-D007] 임금은 신하를 자식처럼 …… 아니다 : 송 태조(宋太祖)가 장수(將帥)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핀 일에 대해 명(明)나라 구준(丘濬)이 한 말이다. 《大學衍義補 卷130 將帥之任 中》[주-D008] 뱀이 야광주로 보답하고 : 수(隋)나라 임금이 대궐 밖에 나갔다가 큰 뱀이 토막 난 것을 보고 약을 써서 잘 봉합해 주었는데, 1년여 뒤에 뱀이 야광주를 물어와 보답했다고 한다. 《淮南子 覽冥訓》[주-D009] 참새가 …… 일 : 한(漢)나라 양보(楊寶)가 9세 때 올빼미의 공격으로 나무 밑에 떨어져 개미에게 뜯기는 노란 참새를 구해다가 100여 일 동안 간호해 살려 보냈다. 참새가 밤에 노란 옷을 입은 동자로 나타나 자신은 서왕모(西王母)의 사자라면서 흰 옥고리 4개를 주며 양보의 자손이 옥고리처럼 깨끗이 지조를 지켜 삼공(三公)에 오르기를 축원하였다. 뒤에 과연 그의 후손이 4대에 걸쳐 모두 대신(大臣)이 되었다고 한다. 《搜神記 卷20》
- 2023-12-04 | NO.20
-
- 홍명원- 仍任後次洪廣文見贈
- 그대로 부임한 뒤에 홍광문의 시를 차운하여 보여주다華堂淸簟午眠初 맑은 날씨 화려한 마루에 졸음이 온 한낮瑞石濃光畫不如 서석산의 짙은 풍광이 그림보다 아름답네.顧我未堪懷故土 내 고토를 생각하는 마음 가누지 못하는데傍人還擬賀新除 옆 사람들은 나의 새로운 부임을 축하하네. 從他邑里仍愁痛 타향을 쫓아다니며 시름에 잠긴 신세 愧殺雲煙自卷舒 스스로 거두고 펴는 구름과 내(烟)에 부끄럽네.休把詩篇強張大 시로써 억지로 과장하지 말게.穎川才術本空疏 영천의 재주가 본시 거칠었으니歸期直指雁來初 돌아갈 시기는 바로 기러기 올 때이니紫綬黃堂坐自如 붉은 인끈 황당이 천진스레 앉았구나.爲要佳賓虛上席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 상석을 비워두고更憐幽鳥下前除 산새 사랑하여 앞뜰로 내려서네.耽閑不必同何遜 한가함 즐기는데 하손과 같을 필요 있나.治劇還非慕仲舒 바쁜 고을 다스림에 동중서를 사모하지 않네.大火鑠金須暫避 큰불이 쇠를 녹일 때는 잠시 피해야 하니, 此翁身計未全疏 이 노인의 계책이 전혀 엉성한 건 아니네. -해봉집(海峯集) 권2홍명원(洪命元, 1573-1623)의 자는 낙부(樂夫)이며 호는 해봉(海峯)이다.
- 2018-07-26 | NO.19
-
- 홍명원- 하모당기(何暮堂記)
- 堂以何暮名何 識實也 蓋自有州而有衙 衙徙而基廢且百年 燒于兵燹 寓于民廬 而後斯堂作 非暮也耶 歷賢守宰八九輩 倉廨門樓鄕射之所靡不具 而斯堂獨後焉 非暮而何 嗟夫 荊榛灌莽 滿目蕭然 而一朝突兀 望之翬飛 則父老歎其何暮 窪庭局簷 累肩疊蹠 而廊廡縵廻 步驟安閑 則吏胥歎其何暮 濕寢雨立 男女勃谿 而庖房庫廏各得其所 則僕御歎其何暮 接席傾床 尊卑雜沓 而華筵秩秩 獻酬有容 則賓客歎其何暮 至於梅窓暖而朝睡甘 夏簟淸而晝棋宜 街槐脫葉而遠岫呈狀 山雪肆虐而奧室排寒 太守歎其何暮 此堂之所以得名 而名與實稱也 堂旣名 客有嘲余曰 叔度之謠 史氏記其異政 老郞之詩 昌黎美其高唱 今子掇此而名堂 無乃近於自譽耶 余應之曰否 詩取短章 不全以辭 政事文章則吾豈敢 若以堂之興廢 歎人之來暮 則吾亦無讓焉 遂笑而爲之記당을 ‘하모’라고 명명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대개 고을이 있고서부터 관아를 두었는데, 관아가 옮겨가자 터가 황폐해진지 거의 100년에 병화에 소실되어 민가에 기우한 이후에 이 당이 지어졌으니 늦었지 아니한가. 어진 수령 8~9인을 거쳐 창해와 문루, 향사의 장소를 갖추지 않음이 없었는데 이 당만 홀로 뒤쳐졌으니 늦은 것이 아닌가. 아! 가시덤불과 잡목이 눈 가득 쓸쓸하다가 하루아침에 우뚝 솟아 바라보면 꿩이 나는 듯 하니 부로들이 어찌 늦었나 하고 탄식하였고, 움푹 팬 뜰과 좁은 처마 아래 어깨를 움츠리고 발걸음을 좁게 하다가 회랑과 처마가 길게 둘러 걸음이 편안하고 한가하니 아전들이 그 늦은 것을 탄식하였다. 습기 찬데 눕고 빗속에 서서 남녀가 다투다가 주방과 방, 창고와 마구간이 각각 제자리를 잡으니 하인들이 그 늦음을 탄식하였고, 자리를 붙이고 상을 기울이며 존비가 뒤섞여 있다가 화려한 잔치자리가 질서정연하고 헌수(獻酬)함에 위의(威儀)를 갖추니 빈객들이 그 늦었음을 탄식하였다.게다가 매화창가에 아침잠이 달콤하고 맑은 대자리는 낮에 바둑이 어울리며, 거리의 회나무에 낙엽이 지면 먼 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산설(山雪)이 사나울 제 아랫목에서 추위를 물리칠 때면 태수도 그 늦었음을 탄식할 것이니, 이것이 ‘하모당’이란 이름을 얻고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이유이다. 하모당의 이름을 얻고 나자 손님 중에 나를 조롱하는 이가 있어 말하기를 “범숙도의 노래는 사관이 그 기특한 정사를 기록하였고 노랑(老郞)의 시는 창려(昌黎)가 높은 곡조임을 찬미하였다. 이제 그대가 이런 일들을 주워서 당의 이름으로 삼으니 자기 자랑에 가깝지 않은가”하였다. 내가 응대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시는 단장(短章)만을 취하였으니 문사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정사와 문장은 내가 어찌 자부하겠는가만, 만약 당의 흥폐 때문에 사람이 늦게 온 것을 탄식하는 것이라면 나 또한 사양하지 않겠다”하고 드디어 웃으며 기문을 썼다.
- 2018-07-30 | NO.18
-
- 홍명원-無等山禱雨祭文 무등산기우제문
- 伏以五月之旱。猶可爲也。七月之旱。不可爲也。斯老農之恒言。實痛迫之苦辭也。恭惟神明。茲土之主。巨壑藏雷。高嶂洩霧。有禱斯驗。靈應不忒。雖以上年之旱全湖地赤。惟茲一邑。不違耕作。得免流轉。伊誰之力。迄于今歲。神施益普。來牟大熟。跛躄鼓舞。播種以時。禾穀奮張。農功垂畢。節近登場。方將牲酒惟馨。賽我明靈。奈何流火之辰。驕陽愆候。今日不雨。明日不雨。十日已久。況又倍之。芃芃者槁。翼翼者萎。高者以焦。濕者以坼。不苗則已。苗者可惜。旣苗而秀。胡不實之。比如九仞之山。一簣便虧。八珍之饌。近口還奪。斯固吾人之所腐心。鬼神之所矜恤者也。卑職受命朝廷。爲吏于茲。慢神病民。罔敢恣爲。如或有罪。罪實在身。降此大災。何辜于民。嗚呼。隱隱靈壇。明神其臨。芬芬黍稷。明神歆之。旣靈于古。今何獨異。茲竭微誠。冀蒙神賜。宜揮半腹之雲煙。亟洒滿空之銀竹。一日甘霔。蘇我百穀。-해봉집(海峯集) 권3
- 2018-07-10 | NO.17
-
- 홍명원-祭瑞石山文
- 瑞石之山 雄于南方 兒孫月出 高揖天王 洩雨藏雲 神施斯普 豈惟傳聞 吾身親睹 去歲茲辰 驕陽愆候 沐浴虔告 果紆冥佑 三農不失 萬寶以成 耿耿祉哉 惟神之靈 迄于今年 耕種孔時 如何亢旱 又此秋期 不苗則已 苗而且穗 穗枯不實 民將何恃 一日二日 庶蒙神賜 映空浥塵 杯水車薪 陳誠不早 是余之愆 茲敢宿齋 大呼于神 隱隱靈壇 洋洋其臨 明神不遠 監此赤心 沛乎其澤 蘇我百穀 民亦戴神 於千萬億-해봉집(海峯集) 권3홍명원(洪命元, 1573-1623)의 자는 낙부(樂夫)이며 호는 해봉(海峯)이다.
- 2018-07-10 | NO.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