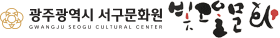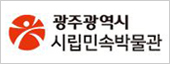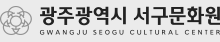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20건
-
- 동강유집 제6권 / 칠언율시(七言律詩)- 풍영정 신익전
- 동강유집 제6권 / 칠언율시(七言律詩)풍영정에서 규암의 시에 차운하여 본도 도사에게 보내어 화답을 구하다〔風詠亭次圭菴韻呈本道亞使求和〕여러 해 바삐 애쓰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 勞碌多年未卜休높은 누각 올라오니 시름 더욱 보태지네 / 登臨快閣迥添愁구름 덮인 봉우리 은은하게 평야를 둘러싸고 / 雲岑隱約圍平野안개 낀 물은 아련히 모래톱을 드러냈네 / 煙水微茫露小洲이 날의 한가로움은 묵은 빚 갚은 것인데 / 此日偸閑還宿債벽에다 시를 쓴 옛 현인 누가 남았는가 / 昔賢題壁問誰留덧없는 인생 어느덧 과거지사 되었는데 / 浮生俛仰成陳迹깨끗한 마음과 행적만은 천추에 남으리 / 唯有雙淸自萬秋[주-D001] 풍영정(風詠亭) : 전라도 광주목(光州牧) 서쪽 20리에 있는 정자이다.[주-D002] 규암(圭菴) : 송인수(宋麟壽, 1499~1547)로,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미수(眉叟)ㆍ태수(台叟), 호는 규암(圭菴)이다. 1521년(중종16)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참판, 대사헌,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주-D003] 덧없는 …… 되었는데 : 왕희지(王羲之)의 〈삼월삼일난정시서(三月三日蘭亭詩序)〉에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사이에 벌써 과거의 일이 되고 만다.〔俛仰之間, 已爲陳迹.〕”라는 구절이 있다.[주-D004] 깨끗한 …… 남으리 : 두보(杜甫)의 〈병적(屛迹)〉에 “백발로 명아주 지팡이 끄니 마음과 행적 둘 다 깨끗함이 기뻐라.〔杖藜從白首, 心迹喜雙淸.〕”라는 구절이 있다.
- 2023-12-04 | NO.390
-
- 동강유집 제6권 / 칠언율시(七言律詩)- 화순 현감 홍명하 의 시에 차운하다
- 동강유집 제6권 / 칠언율시(七言律詩)화순 현감 홍 사군 명하 의 시에 차운하다 4수 〔次和順洪使君 命夏○四首〕몇 번이나 어가 모시고 궁중에 입직하였나 / 幾度鳴鑾直禁廬수령이 되어 실컷 신선 생활을 누리는구나 / 一麾贏得臥仙居머나먼 유람은 다시 시상을 제공할 것이니 / 遠游聊復供詩思오만한 관리가 어찌 문서에 묻혀 지내랴 / 傲吏寧堪事簿書우연히 받은 높은 벼슬 마음과 어긋나니 / 簪組倘來心已左풍진 속에 늙어 가매 귀밑머리만 듬성듬성 / 風塵老去鬢全疏어찌하면 산에 오를 나막신 함께 수리할까 / 何當共理尋山屐서석산 맑게 갠 빛이 하늘에 닿았는데 / 瑞石晴光切太虛둘째 수〔其二〕가파른 서석산은 광려산과 같으니 / 巉巖瑞石似匡廬곳곳의 절간들이 스님들의 거처로다 / 面面祗林開士居생각해보니 지난 가을 좋은 벗과 함께 / 憶在去秋携好伴매번 그윽한 곳에서 불경을 읽었다네 / 每逢幽境閱禪書가마 잠시 멈추고서 술잔 조금 돌리고 / 籃輿乍憩傳杯細평상에서 조는데 경쇠 소리 드문드문 / 花榻閑眠叩磬疏이제껏 뜻에 맞게 그런대로 자족했으니 / 適意向來聊自足세상사 영고성쇠가 모두 헛된 일이라네 / 世間榮落摠成虛셋째 수〔其三〕한 언덕에 조용한 집을 지으려 했더니 / 一丘曾擬結幽廬수령 되어 냇가 대숲을 버리고 말았네 / 爲郡聊拚水竹居잠시 좋은 흥취 일다가도 문서에 묻히고 / 乍有好懷仍簿牒금서를 함께 즐길 벗이 없으니 어찌하랴 / 奈無良友共琴書봄이 돌아온 뜨락엔 매화 꽃망울 터지고 / 春回庭院梅顋拆구름이 머문 바위산엔 빗줄기 성글구나 / 雲逗巖巒雨脚疏흘러가는 세월은 백발을 재촉하는데 / 荏苒風光催鬢髮이별 뒤 초승달 몇 번이나 기울었나 / 別來新月幾盈虛넷째 수〔其四〕시름이 몰려와 적막하게 집에 칩거하니 / 愁來悄悄掩齋廬벼슬살이 되레 절간에서 참선하는 듯하네 / 官況還如定釋居봄 경치 지려 하니 시 짓는 일을 그만두고 / 春事欲闌休覓句낮잠에서 막 깨어나니 책 뽑기도 성가시네 / 午眠纔罷漫抽書숲 언덕에 비 개자 새소리 경쾌하고 / 林皐雨霽禽聲滑정원에 부는 미풍에 대 그림자 성기네 / 庭院風微竹影疏지나간 자취는 잠시도 잡아둘 수 없으니 / 陳迹片時留不得즐거웠던 어제 만남도 지난 일이 되었네 / 昨拚良晤已成虛[주-D001] 화순 …… 차운하다 : 이 시는 홍명하(洪命夏)가 화순 현감(和順縣監)으로 재직 중이던 1644년(인조24)에서 1648년(인조28) 사이에 지은 것인데, 이때 저자는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재직 중이었다.[주-D002] 오만한 관리 : 세상을 오시(傲視)하고 예법에 구애되지 않는 관리를 말한다. 장주(莊周)가 몽(蒙) 땅 칠원(漆園)이란 곳의 관리로 있으면서 재상으로 초빙하는 초(楚)나라 위왕(威王)의 청을 거절하였는데, 진(晉)나라 곽박(郭璞)의 〈유선시(遊仙詩)〉에 “칠원에는 오만한 관리가 있다.〔漆園有傲吏〕”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文選 卷21》[주-D003] 우연히 …… 벼슬 : 《장자》 〈선성(繕性)〉에 “헌면이 내 몸에 있는 것은 내가 타고난 성명이 아니요, 외물이 우연히 내 몸에 와서 붙어 있는 것일 뿐이다.〔軒冕在身, 非性命也, 物之儻來寄也.〕”라고 하였다.[주-D004] 산에 오를 나막신 : 남조 때의 문인 사영운(謝靈運)이 평소 깊고 험준한 명산을 오르기 좋아하여 매양 밀칠한 나막신을 신고 등산을 했는데, 특히 산을 오를 적에는 나막신의 앞굽을 뽑고, 산을 내려갈 적에는 나막신의 뒷굽을 뽑아서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宋書 卷67 謝靈運列傳》[주-D005] 서석산(瑞石山) : 전라도 광주(光州)에 있는 산이다. 무등산(無等山)이라고도 한다.[주-D006] 광려산(匡廬山) : 중국의 여산(廬山)을 가리킨다. 주(周)나라 때에 광유(匡裕)라는 사람의 일곱 형제가 이곳에 집을 짓고 은거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2023-12-04 | NO.389
-
- 동경(同庚)인 광주(光州) 이낙안(李樂安) (조원調元) 에게 부치다- 사가시집 제22권
- 동경(同庚)인 광주(光州) 이낙안(李樂安) (조원調元) 에게 부치다- 사가시집 제22권 이웃에서 종유한 지 지금 그 얼만가 / 隣遊今幾日멀리 이별한 지도 역시 오래이구려 / 遠別亦多時길이 멀어 꿈만 자주 꾸게 되더니 / 道阻煩長夢서신 받으니 그리움에 위로가 되네 / 書來慰所思호남 땅은 한가하여 적막할 텐데 / 湖南閑寂寞한양에선 늙은 몸이 분주한다오 / 漢北老犇馳동갑끼리 우리 서로 만나 본다면 / 同甲如相見희어진 두 귀밑털에 응당 놀라리 / 應驚兩鬢絲*낙안(樂安) 이조원(李調元) *《사가집(四佳集)》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시문집이다.
- 2020-09-21 | NO.388
-
- 동계초당기 東溪草堂記
- 매천 황현 <매천집> 권6- 동계초당기 東溪草堂記曾子固序劉向《新序》,推論一道德同風俗,爲王者之極功。其說蓋美矣。然此以三代之盛,漸摩薰漬之極,自無異言異行者而言耳,非所與論於秦、漢以後也。嗚呼!大樸旣散,虛僞日滋,微窺國家之所尙,則群下靡然趨之,遂成一代之俗。自宋儒創明理學,人人知卑功利,人人知排異端,可謂道德一而風俗同矣。然治天下則蔑其效,且在當時號爲是學者,尙往往有可議,况其愈下者乎?我朝立國,與趙宋同,眞儒輩出,庶幾洛、建之盛。而積勢所趨,浮慕成痼,及其久也,未嘗無虛僞之混焉。夫前史所傳隱逸獨行之倫,不必皆說心說性,而奇偉卓絶輝映千古者何限?乃近世之士則生前稍自修飾,身後必有幾卷文字,劈理抽氣,張皇飣餖,又推所謂立言者而成其誌狀,則又未甞非儼然道學先生。然上焉而無梁鴻、徐穉之苦節,下之求其有林逋、魏野性情之詩而亦不可得,依假剿襲,惟理學是云,不幾於自欺而欺世乎?故余嘗謂“後之撰本朝史者傳儒學,將不勝其夥,而傳隱逸,將不勝其寥寥也”。豈士之懷奇蘊寶者盡出爲當世之用,而無枯黃之歎歟?抑道德一風俗同,庶幾古昔之盛,而小子狂簡未能有以測識歟?元陵之世有申光宅先生者,世居瑞石山中,自號東溪處士,就所謂東溪者,構草堂其上,漁樵畊讀而終其身。子孫至今遵其遺矱,斤斤其勿替。而至於草堂之旣仆而復新,鄕邦之士從而詠歌之不衰,則是其卓行隱德必有所以遯世无悶之實。而所少者,幾篇性理文字耳,叔世澆漓之時,其回淳返樸如處士者,曷可少哉?往年余過瑞石東麓,見其溪潭澄泓,竹木葱蒨,雞鳴犬吠,杳然嵐雲之際,意其有隱君子,而路忙未之入焉。今而聞之,蓋草堂之所在也。噫!余雖不獲登斯堂,把酒賦詩以悅處士之風,而庶幾異日錄處士之跡,以備湖南耆舊隱逸之遺,則斯堂者未必非藥囊畵師之徵爾。증자고(曾子固)는 유향(劉向)의 《신서(新序)》에 대한 서(序)에서, 도덕이 일치되게 하고 풍속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왕자(王者)의 최고 공적이라 추론(推論)하였는데, 그 논리가 대체로 훌륭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삼대(三代)의 태평성대에 정치 교화가 최고조에 달하여 전혀 말이나 행동을 달리하는 자가 없던 시절을 두고 말한 것이지, 진한(秦漢) 이후까지 함께 논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아아, 삼대 이후로는 극도의 질박함이 사라지고 허위가 날로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무엇을 숭상하는지 눈치를 살피고는 다들 그쪽으로 휩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당대의 풍속이 되곤 하였다. 그 뒤 송유(宋儒)들이 성리학을 천명하면서 사람들이 공리(功利)를 경시하고 이단(異端)을 배척할 줄 알게 되었다. 이른바 도덕이 일치되고 풍속이 동일하게 되었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이때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실제적인 공효가 없었던 데다, 당시에 이 학문을 한다고 일컫던 자들조차 종종 논란이 될 만한 점이 없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보다 낮은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우리 조선이 나라를 세운 것이 송(宋)나라와 같고 진유(眞儒)가 배출된 것도 정주(程朱)의 융성기에 버금간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가 누적되면서 표면상의 존모(尊慕)가 고질이 되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허위가 혼재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대체로 지난 역사책에 전해지는 남다른 행실의 은일지사(隱逸之士)들이 모두 마음과 본성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위대하고 우뚝한 절행(節行)으로 천고에 빛날 자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에 비해 근세(近世)의 선비들을 보자. 하나같이 생전에는 선비입네 치장하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몇 권의 문집을 남기며, 이(理)와 기(氣)를 분석하여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소위 그 입언(立言)들을 추숭(推崇)하여 묘지(墓誌)와 행장(行狀)을 만든다. 그렇게 보면 모두 의젓한 도학선생(道學先生) 아닌 사람이 없다.그러나 그들은 위로 양홍(梁鴻)이나 서치(徐穉) 같은 굳은 절개도 없고, 아래로 임포(林逋)나 위야(魏野) 같은 성정(性情)이 담긴 시(詩)를 쓸 능력도 없다. 오로지 남의 학설을 표절하여 성리학은 이런 것이라는 말들만 늘어놓으니, 어찌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후세에 조선의 역사를 찬술하는 자가 유학자의 열전(列傳)을 낼 때에는 너무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은일지사의 열전을 쓸 때에는 기록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말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선비 중에 특출한 재덕을 지닌 선비가 모두 나와서 당세에 등용되고 영락(零落)된 채 탄식하는 이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도덕이 일치하고 풍속이 동일해진 것이 옛날의 태평성대와 같아진 결과, 광간(狂簡)한 사람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일까? 영조(英祖) 때에 신광택(申光宅) 선생이란 분이 있었다. 대대로 서석산(瑞石山) 산중에 살면서 동계처사(東溪處士)라고 자호(自號)하였다. 그는 이른바 동계(東溪)라는 곳에 나아가 그 시냇가에 초당(草堂)을 짓고는, 고기 잡고 나무 하고 밭 갈고 책 읽으면서 한평생을 보냈다.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그분이 남긴 법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준수하며 살고 있다. 그러다 초당이 무너져서 다시 짓게 되자, 이 고장의 선비들이 모두들 변함없이 그 덕을 기리고 송축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그분의 뛰어난 행실과 은일의 덕은, 세상을 피해 숨어 살되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은 실제가 분명 있다 하겠다. 다만 그에게 부족한 것은 몇 편의 성리학에 대한 글뿐이니, 이런 말세의 경박한 시대에 순박(淳朴)의 원형으로 돌아간 처사와 같은 사람을 어찌 하찮게 볼 수 있겠는가.왕년에 나는 서석산 동쪽 산기슭을 지나다가, 시내가 맑고 대나무가 푸르며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아득히 푸른 운기(雲氣)가 도는 곳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때 저곳에는 아마도 은거하는 군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당시에는 노정이 바빠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그곳이 바로 동계초당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아, 내 비록 그 초당에 올라가 술 마시고 시 읊으며 처사의 풍모에 열복(悅服)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행여 훗날 처사의 자취를 기록하여 호남(湖南)의 중망 있는 노인과 은일지사의 유전(遺傳)에 대비한다면, 이 초당이 바로 약초 캐는 은일지사가 살았던 증거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리라.[주-D001] 증자고(曾子固) : 자고는 송나라 때의 문장가 증공(曾鞏)의 자이다.[주-D002] 유향(劉向) : 전한(前漢)의 학자로, 자는 자정(子政)이다. 《열녀전(列女傳)》, 《설원(說苑)》 등의 저서가 있다.[주-D003] 신서(新序) : 유향이 편찬한 책으로 10권이다. 춘추 시대부터 한대(漢代)까지의 일사(逸事)를 기록하였다.[주-D004] 양홍(梁鴻) : 후한(後漢) 때의 현사(賢士)로, 평릉(平陵) 사람이다. 부인 맹광(孟光)과 서로 공경했다는 거안제미(擧案齊眉)의 고사가 있는데, 이 부부는 패릉(覇陵)의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은거하며 살았다.[주-D005] 서치(徐穉) : 후한 예장(豫章) 사람이고 자는 유자(孺子)이다. 그 역시 평생 벼슬에 응하지 않은 채 은거하고 살았으므로 남주(南州)의 고사(高士)로 일컬어졌다.[주-D006] 임포(林逋) : 967~1028. 북송 때의 시인으로, 평생 은거하며 매화와 학을 길렀으므로 매처학자(梅妻鶴子)의 고사가 있다.[주-D007] 위야(魏野) : 960~1019. 북송 때의 시인으로, 자는 중선(仲先)이다. 저서로 《초당집(草堂集)》이 있다.[주-D008] 선비 …… 것일까 : 김소영은 이 구절을 예시하며 반어적 수법을 통해 당대의 유학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반어적 수법을 매천 산문의 한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김소영, 매천 산문의 표현형식 연구, 한문학보 제18집, 2008》[주-D009] 서석산(瑞石山) : 광주 무등산(無等山)의 옛 이름이다.[주-D010] 그에게 …… 글뿐이니 : 실제로 동계처사에게 성리학에 관한 글이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이 구절 또한 성리학에 관한 글을 남겨야 학자로 대접받는 당시 세속의 기준을 비판하려는 반어적 표현법이다.[주-D011] 약초 …… 증거 : 대본에는 ‘藥囊畫師之徵’으로 되어 있다. 의미상 ‘은일지사가 살았던 증거’라는 뜻으로 쓰인 듯하나 이에 대한 전거는 찾지 못하였다.
- 2020-08-19 | NO.387
-
- 동명집 제5권 / 오언율시(五言律詩) 189수; 이후
- 동명집 제5권 / 오언율시(五言律詩) 189수홍주의 수령인 이후가 지은 근민당에 부쳐 제하다〔寄題洪州李使君 垕 近民堂〕홍주 고을 바로 호서 큰 고을인데 / 邑是湖中巨맡은 사람 오늘날의 한의 양리네 / 人今漢吏良정사 폄에 그 근본을 능히 알아서 / 能知爲政本드디어는 근민당을 지어 세웠네 / 遂作近民堂비 온 뒤엔 푸릇푸릇 보리 자라고 / 雨後靑靑麥봄이 오면 곳곳마다 뽕잎 돋아서 / 春來處處桑모든 이들 노래하며 즐기는 것이 / 歌聲盡懽樂어양 땅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리 / 不獨在漁陽[주-D001] 이후(李垕) : 1611~166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중(子重), 호는 남곡(南谷)이다. 1644년(인조22)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50년(효종1)에 지평(持平)에 제수되었으며, 은진 현감(恩津縣監), 광주 목사(光州牧使), 홍주 목사(洪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1667년(현종8)에 사간으로 있다가 온성(穩城)에 유배되었다.[주-D002] 근민당(近民堂) : 홍주(洪州)의 관아에 있던 당이다.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이계집(耳溪集)》 권3에 홍양호가 홍주 목사에 제수되고서 지은 〈근민당한영(近民堂閒咏)〉이 있다.[주-D003] 어양(漁陽) …… 것이리 : 홍주 고을 백성들이 모두 선정(善政)을 베푼 혜택을 받을 것이란 뜻이다. 후한(後漢) 때의 어진 수령인 장감(張堪)이 어양 태수(漁陽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여 노래하기를 “뽕나무엔 붙은 가지가 없고, 보리 이삭은 두 갈래가 생기었네. 장군이 고을을 다스리니, 즐거움을 감당치 못하겠네.〔桑無附枝 麥穗兩岐 張君爲政 樂不可支〕”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31 張堪列傳》
- 2022-05-06 | NO.386
-
- 동명집 제8권 / 칠언고시(七言古詩) 61수; 금포가〔錦袍歌〕
- 동명집 제8권 / 칠언고시(七言古詩) 61수금포가〔錦袍歌〕그댄 보지 못하였나 / 君不見금남군 정 절도사를 / 錦南鄭節度그댄 보지 못하였나 / 君不見함릉군 이 사군을 / 咸陵李使君이 두 영웅 발해 바다 동쪽에서 태어나서 / 兩雄挺生渤海左삼한 사직 곤륜산과 같이 안정되게 했네 / 三韓社稷安崑崙장안에선 선비들 다 이 두 영웅 기리거니 / 長安布衣尙雄俠안 그러면 무슨 수로 장군 알 수 있었으랴 / 不然何以知將軍올해 내가 수천 리 밖 외방 향해 나아가자 / 今年我向數千里이별 임해 비단 한 필 내게 선사해 주었네 / 臨別贈我一段綺그들 위해 옷 마름해 그들의 정 받았으매 / 爲君裁衣領君情서생인 나 비단옷을 입자 모두 놀라누나 / 書生衣錦人皆驚양쪽 소매 휘저으매 쌍 원앙이 날거니와 / 兩袖披拂雙鴛鴦왼 소매엔 숫원앙이 수놓이었고 / 左袖雄鴛鴦오른쪽엔 암원앙이 수놓이었네 / 右袖雌鴛鴦두 원앙이 나란하게 함께 날지 못하거니 / 鴛鴦不得長比翼인생에서 서로 그리는 걸 어찌 원망하랴 / 人生何恨長相憶서로 간에 떨어져서 그리워하매 / 長相憶이를 보자 괜히 머리 희게 세거니 / 對此空白首차라리 이 비단 도포 훌훌 벗어 남에게 줘 / 不如脫袍贈他人신풍에서 술 사 먹게 하는 것이 더 좋으리 / 留却新豐典春酒[주-D001] 금포가(錦袍歌) : 남은경은 이 시를 정두경의 시문학 가운데 가행시(歌行詩)로 분류하고, 가행시 가운데서도 영물적가행(詠物的歌行)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시는 3, 5, 7로 이루어진 장단구로 된 작품이다. 이 시는 시구의 내용에 따라 압운(押韻)도 양(揚)하다가 억(抑)하고, 다시 양하다가 억하는 변화를 이루어 시인의 감정의 기복을 그리고 있고, 압운의 소밀(疏密)에 의해 속도의 변화도 이루어 시인 정서의 격변을 알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 기본 글자는 7자로 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 내용을 강조해야 할 때는 글자 수를 3자와 5자를 이용해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였다. 《남은경, 東溟 鄭斗卿 文學의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44쪽》[주-D002] 금남군(錦南君) 정 절도사(鄭節度使) :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을 가리키는 듯하다. 정충신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이다. 1592년(선조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1624년(인조2)에는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고 있던 중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이 되어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鞍山)에서 무찔러 진무 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에 봉해졌다. 정묘호란 때에는 부원수를 지냈고, 이후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주-D003] 함릉군(咸陵君) 이 사군(李使君) : 이해(李澥, 1591~1670)로,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자연(子淵), 호는 농옹(聾翁)이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함릉군에 봉해졌다. 1624년에 개성부 유수가 되었으며, 이후 형조 판서를 지냈다. 1652년(효종3)에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처음에 충정(忠靖)으로 시호를 받았다가, 숙종 때 충민(忠敏)으로 개시되었다.[주-D004] 곤륜산(崑崙山) : 전설 속에 나오는 최고의 영산(靈山)으로, 중국의 서쪽 지역에 있으며, 서왕모(西王母)가 이곳에 산다고 한다.[주-D005] 신풍(新豐) : 중국의 지명으로, 이곳에서는 아주 맛 좋은 술이 생산되는데, 그 술을 신풍주라고 한다. 왕유(王維)의 시에 “신풍 땅의 맛 좋은 술 한 말에 만 전이고, 함양 땅의 유협 중엔 젊은이가 많네.〔新豐美酒斗十千 咸陽遊俠多少年〕”라고 한 구절이 있다. 《王右丞集 卷14 少年行》
- 2022-05-06 | NO.385
-
- 동몽교관 증 사헌부 지평 권공 행장 - 명재유고 제43권
- 동몽교관 증 사헌부 지평 권공 행장(권필) - 명재유고 제43권 :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선생의 성은 권(權)씨이고 휘는 필(韠)이다.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며 안동(安東) 사람이다. 문충공(文忠公) 근(近)의 6세손이다. 조부 승지 휘 기(祺)는 아들 둘을 두었으니, 장남 벽(擘)은 관직이 참의에 이르렀고 호는 습재(習齋)이며, 차남 경(擎)은 생원이다. 선생은 습재의 아들로서 생원의 후사가 되었다.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달리 영특하여 9세에는 글을 지을 줄 알았다. 19세에 초시(初試)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복시(覆試)에 또 수석으로 합격하였는데 한 글자를 잘못 써서 탈락하였다. 이로부터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임진년(1592, 선조25) 4월에 친구 구용(具容)과 함께 대궐에 나아가 항소(抗疏)를 올렸다. 상소에 이르기를,“유성룡(柳成龍)과 이산해(李山海)가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쳤으니 실로 오늘날의 진회(秦檜)와 양국충(楊國忠)입니다. 그들을 참수하여 백성들에게 사죄하게 하소서.”하였는데, 비답이 없었다.신축년(1601, 선조34)에 명나라 사신 고천준(顧天埈)과 최정건(崔廷健)이 조서를 반포하는 일로 나왔다. 월사(月沙) 이공 정귀(李公廷龜)가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떠나려 하면서 아뢰기를,“전부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는 반드시 문인을 널리 선발하여 제술관으로 삼았습니다. 유학(幼學) 권필이 시재(詩才)가 상당해서 비록 벼슬은 없지만 명성이 자자하니, 데리고 가게 해 주소서.”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권필의 이름은 지금 처음 들었다. 그가 지은 시문을 구해 볼 수 있겠는가?”하니, 정원에서 시고(詩藁) 수십 편을 베껴서 올렸다. 상이 크게 칭찬하고 이어 관직을 주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받지 않고 백의로 종사하였다. 당시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 남곽(南郭) 박동열(朴東說), 남창(南牕) 김현성(金玄成) 및 차천로(車天輅) 등이 모두 문장으로 이름이 났는데 일행이 되어 같이 일하게 되자 모두 선생에게 앞자리를 양보하였다. 그 뒤에 상서(尙書) 유근(柳根)이 원접사가 되어 또 선생에게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선생이 병으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예조 판서인 월사가 선생의 가난함을 걱정하여 천거하여 동몽교관에 제수되었다. 규례로 보면 의당 관디 차림으로 해조에 나아가 참알해야 한다. 그런데 선생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두승(斗升)의 쌀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평소의 뜻이 아니다.”하고는 즉시 그만두고 떠났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강화부(江華府)에 들어가 오천(五川) 가에 초당을 짓고 우거하였는데, 배우는 자들이 존경하는 자세로 날마다 문에 나아왔다. 심지어는 식량을 싸 들고 미투리를 삼아 신고 천리 먼 곳에서 와서 따르는 자도 있었다. 선생의 집이 가난하여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직접 땔나무를 해다가 밥을 지어 먹었는데, 모두들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을 사람 양택(梁澤)이란 자가 그 아비를 죽였으므로 마을에서 연명(聯名)하여 관아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양택이 뇌물을 많이 써서 고발한 자들이 도리어 죄를 받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억울하게 여겼으나 감히 말할 수가 없었는데, 선생이 상소를 올려 그 죄를 바로잡았다.현석촌(玄石村) 강가로 돌아와 문을 닫고 교유를 끊었는데 오직 동악공과 체소(體素) 이춘영(李春英),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 등 몇몇 공들과 서로 왕래하였다.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이첨(李爾瞻)과 유희분(柳希奮) 등이 정사를 주도하였다. 이이첨이 선생의 이름을 사모하여 일찍이 교제를 청하고자 하였는데, 선생이 사절하고 만나 주지 않았다. 하루는 친구 집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담을 넘어 피하였다. 이에 이이첨이 몹시 유감을 품게 되었다.선생은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도 기탄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혹 술자리에서 시를 지으며 시정(時政)을 기롱하고 풍자하였다.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이 전시(殿試) 대책(對策)에서 정사의 잘못된 점을 극력 말하니 광해군이 삭과(削科)하라고 명하였다. 선생이 그 말을 듣고는 개탄하여 시를 짓기를,궁궐 버들 푸르고 꽃은 어지러이 나는데 / 宮柳靑靑花亂飛성안 가득 벼슬아치들 봄볕에 아양 떤다 / 滿城冠蓋媚春暉조정에서는 다 같이 태평성대 축하하거늘 / 朝家共賀昇平樂그 누가 위태한 말 포의 입에서 나오게 했나 / 誰遣危言出布衣하였다. 시가 세상에 나와 전송되어 궐 안에 유입되자 광해군이 보고는 매우 노하였다. 마침 승지 황혁(黃赫)이 무고를 입어 형을 받아 죽고 그 사위 조공 수륜(趙公守倫)이 연좌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광해군이 조공의 집 문서를 수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르러 보니 궁류시(宮柳詩) 절구 한 수가 우연히 어떤 책 겉장에 끼워져 있었다. 드디어 선생을 체포하라고 명하여 선생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 조공이 고문을 받고 벽을 사이에 둔 곳에 있었는데 선생의 자를 부르며 말하기를,“여장(汝章)이 나로 말미암아 죽는구나.”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죽었다. 선생이 소리 죽여 통곡하였다. 다음 날 국문할 때 광해군이 직접 힐문하기를,“네가 말한 궁류(宮柳)는 누구를 지적하는 것인가?”하였으니, 이는 외척을 지척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것으로, 마침내 형장을 치며 고신(拷訊)하도록 명하였다. 백사(白沙) 이공 항복(李公恒福)이 당시 국문에 참여하였다가 자리를 피하며 아뢰기를,“권필은 일개 방외의 선비인데 시안(詩案)으로 죄를 얻는다면 성세(盛世)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러한 구유(癯儒)에게 혹 중형을 가한다면 선비를 죽였다는 오명을 면하기 어려우니, 형장을 가하여 고신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는데, 광해군이 듣지 않았다. 이 상공은 차마 보지 못하고 마침내 총총히 나갔다.다음 날 또 진계하여 힘써 간쟁함으로써 사형을 면하고 경원(慶源)에 유배되는 처벌을 받았다. 숭인문(崇仁門) 밖에 나가 길가의 민가에서 죽으니 임자년(1612, 광해군4) 4월 7일이다.선생은 기사년(1569, 선조2)에 태어나 이때 이르러 향년 겨우 44세였다. 원근에서 듣고 애통하고 억울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문인 심척(沈惕) 등이 그가 죄 없이 죽은 것을 슬퍼하여 대부분 과거 공부를 포기한 채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고양(高陽) 위양리(渭陽里) 선영 곁에 안장하였다. 12년 뒤인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가 즉위하여 제일 먼저 선생에게 사헌부 지평을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 사제(賜祭)하였다.부인 송씨(宋氏)는 호남의 고사(高士) 제민(濟民)의 딸로서 선생이 졸한 뒤 24년이 지난 숭정 병자년(1636)의 난리에 적을 만나 목을 매서 자결하였다. 선생의 묘에 부장하였다. 아들 항(伉) 또한 시를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고 일찍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관직은 청하 현감(淸河縣監)에 이르렀다. 딸은 사인 최계창(崔繼昌)에게 시집갔다.청하 현감은 두 번 아내를 맞았는데 모두 이씨이다. 전처에게 1녀를 두었으니 감찰 정휴(鄭庥)의 처가 되었다. 후처에게 1남을 두었으니 속(謖)이다. 측실에게 2남을 두었으니 밀(謐)과 조(調)이다. 1녀의 사위는 조윤한(趙胤漢)이다. 속은 자식 없이 요절하였다. 현종조에 선생은 절행(節行)이 있으므로 제사를 끊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선생의 형의 증손 수(㥞)를 속의 후사로 삼도록 명하였으니 대개 특별한 은전이었다. 최계창은 2남을 두었으니, 장남 최선(崔宣)은 참봉이고 차남은 최헌(崔憲)이다.수가 선생의 제사를 모시게 되자 즉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을 찾아뵙고 발문을 받아 묘갈명으로 삼고 또 나에게 행장을 짓도록 하였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수가 더욱 굳게 청하였다.삼가 살피건대 선배들이 선생을 논한 것이 이미 있다. 상촌(象村) 신 문정공(申文貞公)은 말하기를,“공은 소탈하고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추진하는 성격이었다. 사소한 의절(儀節)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세상을 도외시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시와 술로 스스로 즐겼다.”하였고, 월사(月沙) 이 문충공(李文忠公)은 말하기를,“공은 풍류가 있고 재기가 뛰어났으며 오묘한 언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기운은 우주를 좁게 여기고 안목은 천고 시대를 넘나들었다. 그의 포부는 속인들이 엿보고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이미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려 하지 않고 기이한 재주와 의리를 품은 채 혼탁한 세상에 항거하며 개탄하였다.”하였다. 계곡(谿谷) 장 문충공(張文忠公)은 말하기를,“공은 이마가 넓고 입이 크며 미간이 넓었으며 체구가 크고 기상이 호방하였다. 언론은 우뚝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따금 농담을 섞어 말하였다. 성격이 술을 몹시 좋아하였고 술을 마신 뒤에는 말하는 것이 더욱 호탕해졌는데, 오만한 자세로 시를 음영할 때면 풍채가 한가롭고 명랑하였다.”하였다.아, 이 세 군자는 모두 문장이 훌륭한 거공(鉅公)으로서 인물평을 할 만한 분들인데, 월사는 선생과 막역한 교분이 있었으니, 그 말이 모두 믿을 만하고 징험할 만하다. 이 세 분의 말로 미루어 보면 선생의 인품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선생은 후모(後母) 김씨를 지성껏 모시어 질병이 있으면 약시중을 들면서 의대를 풀지 않고 새벽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집이 몹시 가난하였는데, 친구 가운데 재신이 된 자가 혹 음식과 옷감을 보내면 모두 김씨에게 보내고 한 가지 물건도 자기 것으로 남겨 두지 않아서 자신은 항상 거친 밥에 나물국을 들었다. 처자가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지만 여유가 있는 듯이 생활하고 조금도 가슴속에 불평하는 뜻이 없었다.다섯 형제가 모두 시를 잘하여 그들과 함께 놀며 글 짓는 것을 참된 낙으로 여겼다. 평소 허여하는 사람이 적었으니, 이를테면 명리(名利)를 따르는 자나 부유한 집의 자제들과는 더욱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다. 부귀와 영달에 대해서는 담담하였다. 일찍이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선비 한 사람이 만나 말하는데, 모두 나라를 위해 악한 것을 숨기는 의리를 알지 못하였다. 선생이 질타하니 모두 부끄러워하며 감복하였다. 여기서 선생의 떳떳한 행실을 볼 수 있다. 종손인 모관(某官) 집(諿)과 모관 열(說)이 기록한 것이다.선생이 일찍이 벗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장차 물러나 산야에 은거하여 마음을 거두고 본성을 길러서 옛사람이 말한 도를 구하려고 생각하여 송나라 제현들의 서책을 구해다가 읽고 사유하였다. 비록 감히 스스로 터득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의(文義) 사이에 분명하게 마음에 닿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 그러므로 흔쾌히 학문에 정진한 지 이제 6, 7년이 되었네.”하였으니, 당시 선생의 나이가 31세였다. 만년에는 박잠야(朴潛冶) 선생과 만나 경외하며 심복하여 단 몇 마디를 나누고서 사표(師表)로 인정하였다. 잠야 또한 매우 공경하고 중히 여겨 선생이 졸하자 애도하여 마지않았다. 그가 말하기를,“여장은 증점(曾點)의 뜻이 있어서 종전의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정주(程朱)의 학문을 좇아 장차 파죽지세(破竹之勢)를 이룰 참이었는데, 반년도 못 되어 하늘이 참혹한 화를 내렸으니, 우리 유도(儒道)의 불행이다.” 하였다. 묘갈명에서 말한, 관심을 돌려 성리학에 종사한 뒤 사문(斯文)에 앞서 도달하여 기수(沂水)에 목욕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그의 시는 천부적인 재주에서 나왔으므로 후일 시 짓는 자들은 제일로 추대하였다. 계곡은 말하기를,“공이 호걸의 자질로서 전일한 뜻으로 학문하여 오로지 시에서 재능을 발휘하였다.”하고, 마침내 탄식하기를,“그런데 세상에서 지우(知遇)를 입은 것은 단지 한 번 중국 사신을 접반하게 된 것뿐이었고, 참혹하게 화를 당한 것도 결국 시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니, 하늘이 공에게 재주를 준 것이 영광스럽게 한 것인가, 아니면 재앙을 준 것인가.”하였다. 그리고 묘갈명에서는 시종 선생을 시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참으로 선생의 시를 선생의 여사로 본 것이다.아, 우리 조선에서 인재가 성대하기로는 명종ㆍ선조(宣祖) 연간이 제일이다. 선생은 늦게 나와서 비록 한 가지 기예로 이름을 날렸지만 또한 우뚝하게 서서 미칠 수 있는 자가 없었으니 세상에 매우 드문 특이한 인물이라 하겠다. 한 번 변하여 도에 이르기를 거의 횡거(橫渠)의 용기에 근접하였으니, 고명하게 뻗어 나가 조만간 높은 경지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나 그 시를 읊으며 그 풍도를 들으면 모두 쇄신하여 명리를 천시하게 되고 완악하고 나약한 뜻을 분발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이 세상의 교화에 보탬을 준 것이 또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내가 늦게 태어나 학문이 비루하여 선생을 알기에 부족하다. 또 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다 드러낼 수가 없다. 삼가 전해지는 말을 위와 같이 정리한 다음 수에게 돌려보내어 훌륭한 논객이 함께 정정해 주기를 기다린다. 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재주가 있는데 또 이 일을 서둘러 잘해내고 있으니, 역시 선생의 덕을 이을 만하다고 하겠다.[주-D001] 진회(秦檜)와 양국충(楊國忠) : 진회는 송 고종(宋高宗) 때 재상으로, 금(金)나라와 화친(和親)을 적극 주장하였다. 《宋史 卷473 秦檜列傳》 양국충은 당 현종(唐玄宗) 때의 권신(權臣)으로 양 귀비(楊貴妃)의 오빠이다.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을 충동하여 촉(蜀)으로 피란하게 하였다. 《舊唐書 卷106 楊國忠列傳》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한 간신인데, 1592년(선조25) 당시 좌의정 유성룡(柳成龍)은 강화를 주장하였고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는 임금을 파천하게 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주-D002] 마침 …… 되었다 : 1612년(광해군4) 2월에 일어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을 말한다. 김직재가 황혁(黃赫)과 더불어 역모하여 진릉군(晉陵君) 이태경(李泰慶)을 세우려고 하였다는 고변이 들어와 100여 명이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옥사로, 대북파가 소북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무옥으로 밝혀졌다. 조수륜(趙守倫)은 편지를 왕래했다는 죄목으로 연루되었다. 《국역 연려실기술 제19권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주-D003] 외척 : 유희분(柳希奮) 등 광해군의 처가인 유씨(柳氏)들을 말한다.[주-D004] 구유(癯儒) : 산택 사이에 은거하는 수척하고 청렴한 학사(學士)를 뜻한다.[주-D005] 상촌(象村) : 신흠(申欽, 1566~1628)의 호이다.[주-D006] 월사(月沙) :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호이다.[주-D007] 계곡(谿谷) : 장유(張維, 1587~1638)의 호이다.[주-D008] 박잠야(朴潛冶) : 잠야는 박지계(朴知誡, 1573~1635)의 호이다. 저서로는 《잠야집(潛冶集)》이 있다.[주-D009] 여장은 …… 불행이다 : 한국문집총간 80집에 수록된 《잠야집》 권6 〈제이방숙문(祭李方叔文)〉에 나온다.[주-D010] 기수(沂水)에 목욕하게 되었다 : 기수는 노(魯)나라 도성 남쪽에 있는 물 이름이다. 공자(孔子)가 일찍이 제자들에게 각기 포부를 물었는데, 모두들 정치에 관심을 두었으나, 증점(曾點)만은 “봄에 여러 친구들과 기수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고 시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공자는 자연을 즐기려는 그의 높은 뜻을 칭찬하였다. 《論語 先進》 이 때문에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말로 흔히 쓰이게 되었다. 여기서는 유학에 입문하여 성리학을 이루게 된 것을 말하였다.[주-D011] 횡거(橫渠)의 용기 : 횡거는 송(宋)나라 학자 장재(張載)이다. 《심경(心經)》 〈군자반정(君子反情)〉에 주자(朱子)가 “횡거는 학문한 공력이 일반인들보다 뛰어나서 허물을 고치는 데에 더욱 용감하였고……” 하였다. 장재가 젊어서 지기(志氣)가 뛰어나 병사(兵事)를 좋아하였는데 범중엄(范仲淹)에게 가르침을 듣고는 번연히 뜻을 바꿔 도학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권필(權韠)이 처음에는 시문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후반에 성리학에 관심을 두고 매진하게 된 것을 장재가 용감하게 진로를 바꾼 데에 비유하여 말하였다.
- 2020-09-23 | NO.384
-
- 동문선 제116권 / 뇌(誄); 채순희
- 동문선 제116권 / 뇌(誄)중서시랑 평장사 태자 소사 채공 뇌사(中書侍郞平章事太子少師蔡公誄詞)이규보(李奎報)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고, 70이 되어서는 벼슬을 내놓고, 정신을 깨끗이하며, 천성을 수양하여 능히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며 일생을 착하게 살아간 이는 고금에서 구한다 하더라도, 많이 얻을 수 없는 것이온데, 우리 소사(少師) 채공은 이것을 향유하였다. 공의 휘는 순희(順禧)이고, 가계는 광주(光州) 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아무인데, 벼슬이 아무 관직에까지 이르렀다. 공이 의종(毅宗) 때 내정(內廷)에 적을 두고, 명종(明宗)이 선위할 때까지도 오히려 임금의 측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상감께서 일찍이 수창궁(壽昌宮)에 계실 때 적신(賊臣) 조원정(曹元正)과 석린(石麟)들이 불궤(不軌)를 도모할 때 밤에 담을 넘어 금중(禁中)에 들어와 난을 일으켰다. 이날 밤에 대궐 안에 들어와 숙직하던 가까운 신하들이 난리를 듣고 놀라고 무서워서 모두 담을 넘어 피해 달아났는데, 공만이 홀로 자신(紫宸 임금 있는 내정)에 입시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임금님의 곁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상감께서 감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빠른 바람에 굳센 풀이 있음을 안다’ 하더니, 바로 그대를 이름이로다.” 하였다. 벼슬이 오조(五朝)에 이르러 두루 높은 자리를 거쳤고, 금상폐하 아무 해에 이르러 지위가 중서시랑 평장사 태자 소사(中書侍郞平章事太子少師)에 나아갔다. 사직을 원하여 물러와 평안히 있을 때, 거문고와 술로 소요하였다. 대체로 몇 해를 지나 운명할 시기가 문득 이르러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슬프고 영화스러운 시종(始終)이 다 갖추어져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이것은 대장부가 일컬을 만한 것이다. 천성이 너그럽고 온화하여 대중을 용납하니, 일찍이 노한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비록 헌 자리에 토한 아전을 용서하고, 국을 쏟는 종을 용서하는 자라도 그 어찌 이에서 더하겠는가. 그러나 조석(曹石)의 난리에 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센 기개가 독특한 절개를 볼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인자(仁者)는 반드시 용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음이 들려오자, 상감께서 애도하여 정사 들으심을 폐하시고, 유사에게 칙명하여 명기(明器)와 노부(鹵簿 필요한 의장)를 갖추도록 하였다. 아무 산에 장사 지내시고, 시호를 아무공이라 내리며, 거듭 소신에게 명하여 사실을 엮어서 뇌사를 짓게 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왕좌(王佐)의 재주를 먼저 기량을 점치게 하였네. 과감한 우리 공이여, 기량을 지님이 본래부터 달랐다. 조석이 난을 일으켜 밤에 금문(禁門)을 두들기자, 내신들이 쥐구멍을 찾아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공이 홀로 들어가 지킴이 신색(神色)이 변하지 아니하니, 나중에 시드는 절개를 날이 추어진 뒤에야 바로 알겠도다. 절개를 지킴이 이와 같으니 귀하고 영달함이 옳겠도다. 과연 다섯 임금님의 재상이 되어, 덕망이 태형(台衡)에 높았다. 급히 서둘러 벼슬에서 용감하게 물러나니 이름이 온전하고 덕이 높았다. 하늘이 어찌 조상하지 아니하리요. 나라의 들보가 부러졌는데, 임금님이 마음으로 슬퍼하여 임종에 물건과 시호를 보내어 예를 갖추게 하였다. 누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요. 소신(小臣)이 뇌문(誄文)을 지었나이다.” 하였다.[주-D001] 헌잘에 …… 용서하고 : 한 나라 선제(宣帝) 때에, 병길(丙吉)이라는 정치가가 정승으로 있을 때에, 그의 마차를 속관이 타고 가다가 술이 취하여 모두 토(吐)해서, 그 있는 자리를 더렵혔다. 그것으로 하여 그 속관을 면직시키려 하니, 병길이, “그것은 겨우 정승의 방석 하나 더럽힌 일인데, 면직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주-D002] 국을 …… 자 : 후한(後漢) 장제(章帝) 때에 유관(劉寬)이란 사람이 성질이 매우 너그러워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가를 시험하는라고, 그가 조회에 들어가려고 관복(官服)을 입은 위에다가 종을 시켜서 잘못한 체하고 국을 엎질렀으나, 단지 “네 손은 데지 않았느냐.” 하고, 아무말도 더하지 않았다.[주-D003] 나중에 …… 알겠도다 : 《논어》에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는 말이 있는데, 일기가 더운 여름에는 어느 나무나 다 푸르지만, 가을이 되어 날이 차면 모두 낙엽이 지고 오직 소나무ㆍ잣나무만이 푸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을 인간사회에 비유하면, 보통 때에는 모두 애국지사이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면 참으로 애국 애족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다.[주-D004] 태형(台衡) : 하늘의 삼태성(三台星)은 인간의 정승을 맡은 별이라 하여, 또 정승은 이 세상을 저울질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태형은 정승을 말하는 것이 된다.
- 2022-05-06 | NO.383
-
- 동문선 제97권 / 설(說); 경렴정 명 후설(景濂亭銘後說)
- 동문선 제97권 / 설(說)경렴정 명 후설(景濂亭銘後說)정도전(鄭道傳)겸부(謙夫) 탁(卓)선생이 광주(光州) 별장에 못을 파고 연꽃을 심고, 못 가운데에 흙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짓고 날마다 올라서 즐거움을 삼았다. 익재(益齋) 이문충공(李文忠公)이 그 정자를 경렴(景濂)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염계(濂溪)의 연꽃을 사랑하는 뜻을 취하여 우러르고 사모하고자 해서이다. 그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 물건에 마음을 쓰게 되니, 느끼기를 깊이하고 후하게 하기를 지극히 해서이다.일찍이 생각하건대, 옛 사람이 화초에 있어서 각각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굴평(屈平)의 난초와 도잠(陶潛)의 국화, 염계의 연꽃이 그것이다. 각각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써 물건에 붙였으니 그 뜻이 은미하다. 그러나 난초는 꽃답고 향기로운 덕이 있고, 국화는 은일(隱逸)의 높은 것이 있으니, 두 사람의 뜻을 볼 수 있다. 또 염계의 말에 이르기를, “연은 꽃 중의 군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연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 누구인고.” 하였으니,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으로써 남과 함께 하는 것이 성현의 마음 씀이다.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 주는 이가 없음을 탄식하고 후에 알아주는 자를 무궁한 세상에서 기다렸으니, 진실로 연이 군자 되는 것을 안다면 염계의 즐거움을 거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인하여 성현의 즐거움을 알아내는 것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황노직(黃魯直)이 말하기를, “주무숙(周茂叔)은 가슴 속이 쇄락(洒落)하여 산들 바람과 개인 달 같다.” 하였고,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주무숙을 본 뒤로는 매번 중니(仲尼)와 안자(顔子)의 즐거운 곳과 즐거워하던 것이 무슨 일인가를 찾아 보게 하였다. 이 뒤로부터 바람을 읊조리고 달을 읊고 돌아온다 하는 것에 내가 증점과 같이 하였다.” 하였다. 내가 가만히 혼자 생각하건대, 염계를 경모하는 것에 방법이 있으니, 모름지기 쇄락의 기상(氣象)을 알아서 증점과 같은 뜻이 있는 연후에야 말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문충공이 지은 명(銘)에 말하기를, “발을 걷고 꿇어 앉아 있노라면 바람과 달이 가이 없다.” 하였으니, 이 한 구절이 옛 사람이 단정한 공안(公案)이다. 어떻게 하면 한 번 그 정자에 올라서 함께 참여할까.
- 2022-05-06 | NO.382
-
-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 고이(考異) ; 진훤(甄萱)의 별전(別傳) 175
- 2022-05-07 | NO.381
-
- 동사강목 제10하; 광주(光州))의 백저포(白苧布) 세를 덜어주다
- 동사강목 제10하경술년 고종 37년(송 이종 순우 10, 몽고 황후칭제 2, 1250)춘정월 최항이 여러 고을의 별공(別貢)과 어량(魚梁)ㆍ선박(船舶)의 세를 그만두게 하였다.항은 교정별감첩(敎定別監牒)으로 청주(淸州)의 설면(雪綿), 안동(安東)의 견사(蠒絲), 경산(京山)의 황마포(黃麻布), 해양(海陽 지금의 광주(光州))의 백저포(白苧布) 등의 별공 및 김주(金州)ㆍ홍주(洪州) 등지의 어량과 선박의 세를 덜어주고, 또 여러 도의 교정수확원(敎定收穫員)을 소환하고 그 소임을 안찰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인심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뒤에 다시 전과 같아져서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였다.○ 몽고에 사신을 보냈다.○ 궁궐을 승천부(昇天府)에 지었다.이때에 몽고가 고려의 조정이 육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문책하므로 이것을 경영하여 장차 옮길 것처럼 하였다.
- 2022-05-07 | NO.380
-
- 동사강목 제11상 , 몽고군이 무등산에 주둔하고 압해도 공격에 실패하다
- 동사강목 제11상 신해 고려 고종 38년부터, 을해 고려 충렬왕 원년까지 25년간병진년 고종 43년(송 이종 보우 4, 몽고 헌종 6, 1256)8월 최항이 신흥창(新興倉)을 열어서 그의 가병(家兵)을 진휼하였다.○ 장군 송길유(宋吉儒)를 보내어 청주(淸州) 백성을 섬으로 옮기게 하였다.○ 몽고군이 갑관강(甲串江) 밖에 둔쳤다.앞서 차라대가 해양(海陽)의 무등산(無等山)지금의 광주부(光州府 동쪽 10리에 있다 꼭대기에 주둔하였다. 군사 1천 명을 남쪽으로 보내 노략질하고 또 수군[舟師] 70척[艘]을 거느리고 압해(押海)지금의 나주(羅州) 압해현(壓海縣) 를 쳤다. 압해 사람들이 큰 배[大艦]에다 대포를 설치하고 기다리니, 차라대가 바라보고 말하기를,“우리 배가 포를 맞으면 다 부숴질 터이니 당해낼 수가 없다.”하고, 다시 배를 옮겨서 공격하게 하니, 압해 사람들이 옮기는 곳을 따라 대포를 비치하므로, 차라대가 이기지 못할 줄 알고 마침내 수공(水攻)하는 기구를 파해 버리고 왕준ㆍ홍복원 등과 더불어 갑관강 밖에 이르러 크게 기치를 늘어세우고, 밭에 말을 먹이며 통진산(通津山)에 올라 강도의 형세를 바라보고, 물러가 수안현(守安縣)폐현(廢縣)으로 지금 통진부(通津府) 남쪽 15리에 있다 에 주둔하였다.
- 2022-05-07 | NO.379
-
- 동사강목 제16하; 왜적이 규봉사 일대에 숨다
- 동사강목 제16하신유년 전폐왕 우(前廢王禑) 7년(명 태조 홍무 14, 1381)하4월 순문사(巡問使) 이을진(李乙珍)이 무등산(無等山)에서 왜적을 쳐서 이를 모두 섬멸하였다.왜적이 지리산(智異山)으로부터 무등산 지금의 광주(光州)에 있다. 으로 도망해 들어와 규봉사(圭峯寺) 암석 사이에 목책(木柵)을 쳤는데, 3면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좁은 길이 절벽에 잇대어 있어 겨우 한 사람이 통행할 정도였다. 이을진이 결사대 1백 인을 모아 높은 곳에 올라가 돌을 굴리고 화전(火箭)을 쏘아 목책을 불사르니, 적들이 다급하여 벼랑에 떨어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적들은 해변으로 달아나 소선(小船)을 훔쳐 타고 도망갔는데, 소윤(少尹) 나공언(羅公彦)이 빠른 배로 추격하여 모두 죽여버렸다.
- 2022-05-07 | NO.378
-
- 동사강목 제17상; 왜(倭)가 광주(光州)를 함락하다
- 동사강목 제17상기사년 후폐왕 창(後廢王昌) 즉위년(6월 즉위)추7월 도당(都堂)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폐왕(廢王)에게 의대(衣帶)를 바쳤다.우(禑)의 생일이기 때문이었다. 곧 우를 여흥(驪興)으로 옮겨서 그 고을의 군사로 숙위(宿衛)하고 세(稅)를 거두어서 공봉(供奉)하게 하였다.○ 왜(倭)가 광주(光州)를 함락시켰다.
- 2022-05-07 | NO.377
-
- 동사강목 제17하; 원상(元庠)을 광주(光州)에 유배하다
- 동사강목 제17하경오년 공양왕 2년(명 태조 홍무 23, 1390)하4월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다.○ 이색 등을 옮겨 다시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이색은 함창(咸昌)에, 정지(鄭地)는 횡천(橫川)에, 이림(李琳)은 철원(鐵原)에, 이귀생(李貴生)은 고성(固城)에, 우인열(禹仁烈)은 청풍(淸風)에 유배하고, 이을진(李乙珍)ㆍ이경도(李庚道)는 곤장을 쳐서 유배하고, 왕안덕(王安德)은 풍주(豊州)에, 우홍수(禹洪壽)는 인주(仁州)에, 원상(元庠)은 광주(光州)에 유배하였다.
- 2022-05-07 | NO.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