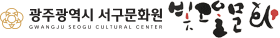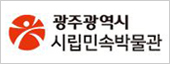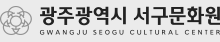이야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305건
-
- 박군(朴君) 상현(尙玄) 에게 답함 - 명재유고 제17권
- 박군(朴君) 상현(尙玄) 에게 답함 - 명재유고 제17권 윤증(尹拯)미발설(未發說)에 대해서는 주자와 율곡이 논한 바가 있어 아래에다 수록해 놓았으니, 이 두 조목을 자세히 음미해 본다면 기형(奇兄)과 그대가 한 말의 득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대체로 남헌(南軒)은 “중인(衆人)에게는 미발(未發)의 중(中)이 없다.”라고 하였고, 주자는 “혹 이런 때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율곡의 주장은 더욱 분명하였는데, 기형이 여기에서 견해를 취했으나 단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어긋나고 말았으니, - 예를 들어 정(情)을 가리켜 각자 갖추고 있는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대의 말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남헌의 학설만 받들고 회옹(晦翁)의 학설을 추종하지 않은 것은 단지 중인의 정이 절도에 맞지[中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기(氣)에 악(惡)이 있다고 하여 성(性)이 선(善)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중(中)하면 반드시 화(和)하고 화하면 반드시 중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한 말은 더욱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정말 이 말대로라면 중을 이루고 화를 이루기[致中致和] 위해 어찌 각각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까.[별지]주자가 호광중(胡廣仲)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흠부(欽夫)의 미발론(未發論)은 진실로 분별(分別)이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만 그가 말한 ‘없다[無]’는 것은 본래 이 이[理]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욕(物慾)에 이끌려서 맑고 고요한 때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또한 사람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性)이 고요한 사람에게 이런 때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경(敬)으로써 주재할 줄 모르면 혼매(昏昧)하고 박잡(駁雜)해져서 스스로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끝내는 필시 없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 퇴계(退溪) 선생이, “흠부의 주장에서 중인(衆人)은 미발(未發)할 때가 없다.”라고 항상 말하였으므로 선생이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 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중(中)이라는 것은 대본(大本)을 의미하니, 어찌 선이니 악이니 말할 수 있겠는가. 중인의 마음은 혼매(昏昧)하지 않으면 반드시 산란(散亂)하여 대본이 서 있지가 않다. 그러므로 중이라 말할 수 없다. 요행히 일순간이나마 미발(未發)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미발할 때에는 전체가 맑아져서 성인(聖人)과 다름이 없게 된다. 다만 별안간에 그 본체(本體)를 다시 잃고서 그에 따라 혼매하고 산란해지므로 그 중을 얻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성학집요(聖學輯要)》〈정심장(正心章) 함양조(涵養條)〉에도 보입니다. - [문]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인생이정(人生而靜)’ 이상(以上)에 대해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며[不容說], 성(性)을 말하는 순간 이미 성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성을 말할 때는 단지 〈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계지자선야(繼之者善也)’를 말할 뿐이니, 맹자가 ‘성선(性善)’이라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른바 ‘계지자선야’라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자의 말뜻을 살펴보건대, ‘인생이정’은 곧 ‘미발(未發)한 때’를 나타내고, ‘이상(以上)’은 ‘이전(以前)’을 뜻하니, ‘미발지전(未發之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성의 본체가 지극히 고요하여 볼 수 있는 형적이 없기에 이에 대해 말할 수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성(性)을 말하는 순간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성을 말하는 순간 이미 정(情)과 섞여 있어 본래의 성이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을 말할 때는 단지 〈계사전〉에 나오는 「계지자선야」를 말할 뿐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건대, ‘성을 말하는 순간’ 운운한 것은 아마도 ‘선(善)으로 성(性)을 말한 것’을 이르는 것이지 ‘성(性)이라 이름 한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만약에 ‘성이라 이름 하면 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문의(文義)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중용(中庸)》에서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 했고, 《예기(禮記)》에서는 ‘인생이정천지성야(人生而靜天之性也)’라 하였는데, 이 말들은 모두 사람이 태어난 이후[人生以後]에 그 본체를 가리켜 성(性)이라 이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자는 무슨 까닭으로 사람이 태어난 후에도 이기(理氣)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성(性)이 아니라고 말했겠습니까? 대체로 성(性)은 말하기도 어렵고 이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발현된 선(善)의 단서로 인하여 성(性)이 선하다고 말한 것이니, 이른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발현되었기 때문에 성(性)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자가 말한 것은 인(人)과 물(物)이 태어나기 전을 말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주 선생(朱先生)이 이 설을 풀이한 것이 앞뒤로 같지 않으니, 부디 정론(定論)을 보여 주십시오.[답] “성(性)을 말하는 순간 이미 성(性)이 아니다.”라는 구절에 쓰인 두 성(性) 자는 서로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아랫글에서 또 “모든 사람이 성을 말한다.[凡人說性]”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성을 말한[說性]” 이 문장의 성과 같은 뜻입니다. 이 때문에 그대가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나 그 실상은 단지 이와 같을 뿐입니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오는 몇몇 말씀들은 여간 친절하지 않아서 모두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대처럼 의심을 가질까 염려하였으므로 또 “말없이 이해하고 별도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보라.”는 말씀을 하였던 것이니, 이 말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 단락은 “생지위성(生之謂性)”을 전반적으로 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이 바로 기이고, 기가 바로 성이다.[性卽氣 氣卽性]”라고 말했고, 또 “선(善)은 본디 성(性)이니, 어찌 또한 성(性)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생지위성(生之謂性)이니, 성을 말하는 순간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성(性)의 본체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성(性) 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형기(形氣)에 떨어진 뒤에 나온 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본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평이하게 보아도 이미 그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대의 설과 같이 “설성(說性)”의 ‘성’ 자를 ‘선(善)’ 자로 본다면 윗글에서 말한 “생지위성(生之謂性)”의 본뜻과 도리어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합니까? 말씀하신 주자의 여러 설들은 단지 “성선(性善)”과 “계선(繼善)”의 뜻을 말한 것뿐으로 아마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문] 보내 준 편지에, “‘설성(說性)’의 ‘성(性)’ 자를 ‘선(善)’ 자로 본다면 윗글에서 말한 ‘생지위성’의 본뜻과 도리어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말한 것은 ‘성(性)’ 자를 ‘선(善)’ 자로 본 것이 아니라, 성(性)의 선(善)함을 말한 것뿐입니다. 아랫글의 “‘모든 사람들이 성을 말할 때는 단지 〈계사전〉에 나오는 「계지자선야(繼之者善也)」를 말할 뿐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건대, ‘성을 말하는 순간’ 운운한 것은 아마도 ‘선(善)으로 성(性)을 말한 것’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성을 말하면서 선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이미 정(情)이지 성(性)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性)을 말하는 순간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윗글에서 이미 “선(善)은 본디 성(性)이니, 어찌 또한 성(性)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성(性)이 동(動)하여 감발(感發)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 성(性)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곧바로 선악(善惡)을 가지고 성(性)이라 할까 염려되어 또다시 “‘인생이정(人生而靜)’ 이상(以上)에 대해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며[不容說], 성(性)을 말하는 순간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하였던 것이니, 대체로 성의 본체가 지극히 고요하여 볼 수 있는 형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말할 수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그런데 그대가 보내 준 편지에서, “주자(朱子)의 여러 설들은 단지 ‘계선(繼善)’과 ‘성선(性善)’의 뜻을 말한 것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주자가 이르기를, “성(性)은 성일 뿐이니,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不容說]”의 뜻을 풀이한 것입니다. 또 “다만 이 성(性)은 본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 성의 본체이다. 이것은 마치 물[水]이 단지 물인 것과 같아서 별도로 한 글자도 덧붙일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불용설(不容說)’의 뜻을 풀이한 것이지, ‘계선(繼善)’과 ‘성선(性善)’의 뜻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주자어류》에서 이른 바 “별도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보라.”라고 한 것은 주자가 엄시형(嚴時亨)에게 답한 말이며, 구희손(歐希遜)에게 답한 말 또한 이와 같습니다. 대체로 계선과 성선의 설이 가리키는 바가 같지 않은데 정자가 이를 인용하면서 같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두 분이 의심이 나 질문을 하게 되었고 주자가 이에 답을 한 것입니다.정자의 생각은 아마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인성(人性)이 발(發)하기 시작할 때는 천리(天理)가 동(動)하기 시작할 때와 그 뜻이 차이가 없으니, 이은[繼] 뒤에 그 선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천리이고, 발(發)한 뒤에 그 선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인성인데, 그 형적으로 인하여 그 성을 말하기로는 피차가 한가지이므로 인용하면서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져 들어가면 정자의 취지가 통창(通暢)하고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주자가 두 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또한 의심이 없을 수 없다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에 인용된 주자의 말을 보면, “천도(天道)의 유행(流行)이 이와 같으므로 인성(人性)의 발현(發現)이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여, 주자는 이에 대해 전후로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어 이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미발지설(未發之說)에 대하여 기우(奇友)와 왕복하며 논변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끝내 의혹을 풀어 드리지 못한 듯합니다. 보내 준 편지에 중화(中和)를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공효(功效)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 공부(工夫)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릇 중화라고 하는 것은 성정(性情)의 덕(德)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미 중(中)이라 한다면 이는 체(體)가 확립된 뒤를 가리키고 이미 화(和)라고 한다면 이는 용(用)이 행해진 뒤를 가리킵니다. 체와 용은 근원이 하나여서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우에게 준 편지〉에서 말한, “서로가 체용(體用)이 되므로 둘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말한 치중(致中)과 치화(致和)는 공부(工夫)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본디 내외의 구별이 생기게 되니, 어찌 둘로 나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다시 회답해 주기 바랍니다.보내 준 편지에서 날더러 남헌(南軒)을 학설만 받들고 회옹(晦翁)의 학설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남헌과 주자가 과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자 초년의 소견은 기형(奇兄)의 견해와 같았지만 말년에 와서 그 오류를 깨달아 마침내 연평(延平), 정자(程子) 및 남헌의 설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경부(張敬夫)에게 준 편지〉에 “이 설은 더욱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스스로 주를 달았던 것이다. 또 주자가 쓴 〈중화구설서문(中和舊說序文)〉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자가 전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인(衆人)에게는 미발(未發)의 중(中)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임택지(林擇之)에게 답한 편지〉와 《주자어류》 제12편에 유지(劉砥)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말한 “중인(衆人)에게는 미발(未發)의 중(中)이 없다.”라고 한 것은 중인에게 원래 이 이치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하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율곡이 이른 바 “일순간이나마 미발할 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미발할 때에는 전체가 맑아져서 성인(聖人)과 다름이 없게 된다.”라고 한 것은, 단지 성(性)의 본체는 본래 선(善)해서 불선(不善)의 싹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 중인들이 모두 미발의 중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질에 구애되어 대본을 세우지 못한다면 될 법한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기형은 미발의 중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보아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한 반면에, 나의 생각은 미발의 중이 비록 천명지성이기는 하지만 본디 본체가 확립된 것을 지칭한 것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여쭐 때 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에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드리오니, 부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주-D001] 박군(朴君) : 박상현(朴尙玄, 1629~1693)을 가리킨다. 자는 경초(景初), 호는 우헌(寓軒),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전라도 광주(光州)의 진곡(眞谷)에서 학문에만 전념한 학자이다. 아들 박광일(朴光一)을 송시열에게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였고, 그의 문집인 《우헌집(寓軒集)》에 송시열과 주고받은 편지가 여러 편 있으며, 송시열은 그를 모년지기(暮年知己)로 허여하였다고 한다. 《우헌집》에는 기정익(奇挺翼)에게 보낸 11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성리학의 격물, 이기, 태극에 관한 내용들이다. 《韓國文集叢刊解題 4輯 寓軒集, 遜齋集》[주-D002] 기형(奇兄) : 기정익(奇挺翼)을 가리킨다.[주-D003] 남헌(南軒) : 장식(張栻)으로 남헌은 호이며, 자는 흠부(欽夫)이다.
- 2020-09-16 | NO.140
-
- 박상 과 박순을 위하여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 사연을 방계(防啓)하는 건 - 서원등록
- 박상(朴祥)과 박순(朴淳)을 위하여 광주(光州)에 있는 사우(祠宇)에 사액(賜額)을 청하는 호남(湖南) 선비들의 상소 사연을 방계(防啓)하는 건 - 서원등록(書院謄錄) : 현종(顯宗) 4년(1663) 생원(生員) 송해(宋垓) 등의 상소에 근거하여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상소의 사연을 보니, 호남(湖南)의 많은 선비들이 고(故) 응교(應敎) 신(臣) 박상(朴祥)과 고 상신(相臣) 박순(朴淳)을 위하여 광주(光州) 지역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병향(並享)한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액호를 내려주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여서 이렇게 상소를 올려 호소한 것입니다. 박상의 문장과 기절(氣節), 박순의 학문과 덕망이 한 문하에서 이어 나와, 진실로 사림(士林)들이 함께 흠모하고 경앙(景仰)하여, 그들의 마을에 사우를 건립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천 리나 되는 먼 곳에서 상소하여 액호를 내려주기를 청하였으니, 한 지방에서 존경하고 흠모하는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에 사액하는 것을 반드시 매번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신 성명(成命)이 있었으므로, 해조(該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상소의 사연을 처리할 수 없으니,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 2020-12-17 | NO.139
-
- 박상, 박순, 기대승을 합향하는 건- 서원등록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을 합향(合享)하는 것을 점이(粘移)하는 건- 현종(顯宗) 12년(1671) : 서원등록(書院謄錄)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하는 일. 이전에 접수한 본도(本道)의 관문(關文)에 점련(粘連)한 광주 목사(光州牧使)의 첩문(牒文)에, “본주(本州)에는 예로부터 눌재(訥齋)와 사암(思庵) 두 선생의 사우가 덕산(德山)에 있으며,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선생의 사우가 월봉(月峯)에 있습니다. 한 고을 안에 각기 서원을 건립하였으니, 유생들의 모임이 서로 나누어지고, 향사하는 예 또한 너무 간략하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고을 안의 많은 선비들이 일찍이 이러한 병통 때문에 월봉의 옛터에 새로 담장을 세우고 재사(齋舍)를 크게 지어서 합향(合享)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봉서원이 이미 덕산(德山)이라는 은액(恩額)을 받았지만 아직 임금께 아뢰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우〔宮宇〕를 합하는 것은 미안하므로 관문에 덧붙여서 해조(該曹)에 이첩(移牒)합니다. 여러 신하들의 신위를 합쳐 모시는 것은 근례(近例)가 있습니다. 이 서원을 이미 중건하여서 합향하는 예를 지금 차례로 거행하도록 해조에 전보하는 일을 일일이 말하여 많은 선비들이 청원(請願)하는 연유를 갖추고 첨부하여 이첩하였거늘, 많은 선비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한 고을에 여러 현인(賢人)들을 합향하는 것입니다. 지세(地勢)와 사리(事理)로 볼 때 어찌 편리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직 사액하지 않은 서원이기 때문에 이미 사액한 곳에 합향하는 것은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아 임금께 아뢰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회이(回移)하였는데, 지금 본주의 유생들이 올린 정서(呈書)를 보니, 이러한 일은 반드시 본조(本曹)에 먼저 고하여서 제사(題辭)로 허락을 받은 후에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賢書院)과 옥천(沃川)의 창주서원(滄洲書院)에 합향할 때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본조에 있는 문서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병술년(丙戌年)의 숭현서원(崇賢書院)과 기유년(己酉年)의 창주서원(滄洲書院)에 합향할 때 모두 사유를 첨부하여 이첩해서 임금의 재결을 받아 시행하였는바, 전례가 이미 이와 같았음을 의거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세 현인(賢人)을 합향하는 일은 다시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원하는 대로 거행하게 하고, 이러한 뜻을 알려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에게
- 2020-12-17 | NO.138
-
- 박상-광주향안 서문(光州鄕案序), 訥齋先生續集卷第四
- 訥齋先生續集卷第四 / 序 金文谷編 吾州之座首金叔讓,別監金敬寶,薛崇。价別監柳子華簡訥齋曰。我朝鮮受命以來。倣周卿大夫之制。州與府與郡與縣與。設留鄕所。以鄕之有職秩名望者補其員。長曰座首。亞曰別監。所所攝之公事。長主之而亞佐之。長不可顓也。亞不可擅也。所以耳目於本官。而司其聞睹焉。又於都下。置之邸。以管各邑之鄕所。而在朝之土姓。或寓居者爲之。隨其品級之崇卑。而有堂上,郞廳殊稱焉。夫所謂邸者。如西京徹侯朝請之邸舍。而文皇帝自代邸。入主劉壐者是已。然則鄕所與京邸。相爲表裏。而鄕所之統京邸。如縣之事大府。京邸之待鄕所。如大府之制小縣。上下相維。輕重相校。其來久矣。是以。求署邸官者。猶夫求辟鄕所也。本州自徐伐國之置都督。歷濟迄麗。遂洎本朝。雖沿革之循環。而世爲文獻之邦。豈不徽哉。雖然。利所在。人必走雜之。故短褐瑣夫。一朝而搦千金之權。則百家之市。無寧居者。利在千金。而不在夫短褐也。今夫爲員於鄕所者。貳邑長而尸一鄕之權柄。里胥之所俯伏而聽命矣。閭井之所輭恧而附威矣。大則賦租傭調之亦罔或搖。其利之茂弘不止是。而人之視之者。若短褐者之千金。此則所謂鄕所者。弄一鄕趨競之別種利權。而行胸臆作威勢於其間。誠非國家樹置之本旨也。是以。馬醫夏畦之族。籧篨戚施之黨。夤緣旁請。猥受差札。則乃比黃麻之拜除。內必誇談於妻孥。外必詡慠於人人。心自語曰。某鄕吏可詰某事。醻我昔素之隙也。某里胥可追某釁。報我造次之嫌也。於是乎交蹀城郭。偵謁君侯。狨瞰顏色。狙若揮使。言瞢淑不。應捷於響。施渾義悖。讚之如流。噓我宿灰而擬焰雲焉。決我濫觴而望襄陵焉。以闚看爲之精神。以向背爲之變通。戚或莫之弔也。喜或莫之慶也。經營溪壑。胚茁兇胞。陰殖鬼蜮。借月朝而恣邑吠。翕鴟翰而鳳咮。或鴒原鬩墻。而加諸人以終鮮之刺。或床裯反目。而責人以綠衣之詩。襲蒸豚於竹林。而嘆棘人之不見。懷伏弩於馬陵。而稱下泉之元伯。鑽核飮羊。而曰彼愧拔葵也。吮癰舐痔。而曰彼甘拂鬚也。以衛靑孱派。而抵王謝之閥。以枚皐分支。而抗崔盧之系。顧顧自得。兩手攫取苞苴曰。我門淡泊如水也。喔咿謀漏徭稅曰。我性慷慨奉公也。至於聞鷄孜孜者。私焉利焉而止。而杯酒之微。潮迅睚眦。錐刀之細。飆激訾訐。首矯癖而後辭裘。淫比黨而笑不同。公共之義財義田。例視靑氈。朘摋無贏。筵必曲而席必密。謔嬲倡優。坡肉河醑。雷殷牙頰。狠伺部長。仇睇薦紳。毒鏃潛發。霜鐔暗飛。有識者之遁避也。若參乎之勝母。翟也之朝歌。誰能景仰而遷喬乎。列城滔滔。而吾邦且甚。朝廷之嘗議革罷者。不亦是之懲也。某俱傖父曹也。際承板蕩。叨具厥位。蠲慮刻志。思出尋常。庶譽叔祀。而未得其方。揚子雲曰。鄭衛調。俾夔因之。不可以致箾韶矣。固宜彗舊摛新。罔或沿籍乎。在昔里胥之怙十惡者。必抵以法。而不用邪㒃。士民之離八刑者。必摘以實。而不小私搆。死喪相赴。疾病相訊。喜吉相慶。患難相恤。送來迎往。鷄豚春秋。又不可闕一。而自我作元綰。名楮板。使後人知某也爲別監。永垂恒式焉。子亦州之裔學。身任翰墨。盍敍之悉乎。訥齋辭曰。吾嘗出位評國。囮孼周行。萬死投荒。幸保聖明。懲羹至矣。敢又撩蛇虺於桑梓耶。再扣之。略不休則曰。匹夫而化鄕人者。蘇老泉有是說矣。夫然後知員鄕所者之殿一鄕也。猶流之有源也。猶影之有表也。猶網之有綱也。猶裘之有領也。源淸則流必淸焉。表正則影必直焉。綱擧則目必張焉。領絜則裘必順焉。理之然也。若夫搥刴所莊之恕。而悶昏蠢之未曉者。譬若溷其源而惡流之濁也。枉其表而怪影之曲也。失其綱而患網之紊也。截其領而疑裘之倒也。天下寧有是哉。昔王彥方。一處士也。而化奸宄爲君子。而不拾道之遺。何蕃。一學士也。而叱六館之士。而不從朱泚之叛。借使王,何之輩。生今之世。居今之俗。而處於鄕大夫之任。則二代偸末之習。不終日遷革。而雖有煽亂如朱泚。而人不或動。不必遺布勸善。而跖膽變爲夷腸。矧且不跖不泚者乎。雖然。問世之治亂。必觀其人。問人之賢不肖。必以世考之。孟子曰。誦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蓋惟合抱之木。不生於步仞之丘。千金之子。不出於三家之市也。今也二三子。莫非蟬嫣簪紱之後。而龍拔鰌泥。虎跳狐丘。冀挽回其汚俗。反敝軌於夷庚。其用意則今日之彥方也。今日之何蕃也。是必欲人之廉也。則捐金於虛牝。欲人之恥也。則關口於壺飧。欲人之禮也。則鳲鳩之不忒。欲人之義也。則葛藟之不回。俠窟輕薄。思所以弭之。則處以長者之淵塞。豪臼梗武。思所以戢之。則晴割斯須之機心。爲源以淸之。爲表以正之。爲綱以張之。爲領以絜之。蓼莪白華之撫蹈懿轍。而曾閔之範䦱矣。斗粟尺布之劬勞縫舂。而姜肱之被遍矣。下位分宅。則羊舌郈成之風。斯達焉。夫唱婦隨。則白頭扊扅之歌。孰賡焉。死喪相赴以下之數事。次第力遵。而薄也歸厚。澆也向醇。東陵鉅猾。慕夷叔之抗致。蒲中縱甿。希黔婁之卓軌。號呶登於俎豆。囂訟息於虞芮。刀筆桀黠。自爾馴。桑濮詖蕩。自爾貞。凶悍之區。革爲鄒魯之域。苟婾之習。轉入胥陸之天。居是邦而非大夫者。無復荑也。違彥聖而好不遂者。無復騫也。詩曰。無競維人。四方其訓之。四方且順之。而況於一鄕乎。而況於匹夫乎。古語曰。一夫善射。百人決拾。其此之謂乎。如是而頑不卽者。牒州主而究竟之。謁邸官而評彈之。大或黜異鄕邊。或作遂 小或削損徒籍。斯亦可也。苟或內幽瑕纇。而圖工表襮。則雖日撻里胥之驁逆。而求其齊。衷必不帖也。雖日擊衣冠之囂悖。而要其馴。勢必相掎也。莊周所謂化聲之相待。不在此耶。人將曰。是同浴而譏裸裎。非愚則惑矣。且也謄錄姓字。以傳於世。則後之歷數者。必曰。某也吶。某也詐。某也溫愨。某也奸惎。某也羊質而虎皮。某也言姚而履跖也。豈不凜凜哉。正德丙子仲冬日。訥齋眞逸書。
- 2018-07-12 | NO.137
-
- 박순문 (제방) 에게 답하다〔答朴舜聞, 濟邦〕 - 노사집 제4권
- 박순문 (제방) 에게 답하다〔答朴舜聞, 濟邦〕 - 노사집 제4권 : 봄여름 사이에 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한 번도 차도를 묻지 못하였네. 그 뒤에 오곡(午谷)에 사는 당질을 통해 이미 쾌유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본래 연약한 몸이어서 반드시 여증의 괴로움이 많을 것이니, 걱정스러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여름에는 장마로 지체되었고 가을에는 또 무단히 3개월 동안 헛되이 나다니다가 돌아오니 눈이 이미 이어진 산에 쌓여 있었네. 몸소 찾아갈 계책을 이미 이루지 못했으니 다시 한 차례 사람을 보내 안부를 살필까 하였으나, 피로한 종이 춥다고 해서 우선 햇볕이 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데 뜻밖에 먼저 사람을 보내고 편지까지 주었으며 편지 끝에 적어 보낸 선물 또한 나의 가난함을 짐작한 것이니, 그 위로되고 감사함을 말로 형용하기 어렵네. 중당(重堂)의 건강이 좋지 않다가 곧 좋아졌다고 하니 매우 축하하네. 어른들 모시며 조섭하는 그대의 몸도 크게 탈이 나지 않은 듯한데, 건강을 말끔히 회복했는지 모르겠네.무슨 글을 일과로 공부하며 외우는가? 이것이 궁금하네.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야 옛날부터 어찌 몰랐겠는가마는 요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있네. 예전에는 들떠 지내느라 세월을 헛되이 버림을 면치 못했고 이제는 또 저물어가는 늘그막에 정력이 쇠약하니, 궁려(窮廬)의 탄식이 적지 않네. 그러나 오히려 힘쓰고 채찍질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네. 그대 같은 이는 나이가 나에 비하면 아직도 넉넉하게 남았으니, 마땅히 병 조리하고 어른들 식사를 살피는 여가에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야 하네. 참으로 할 말이 많지만 얼굴을 대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어렵네.[주-D001] 박순문(朴舜聞) : 박제방(朴濟邦, 1808~?)으로, 기정진의 문인이자 인척이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순문, 호는 안호(安湖)이다. 칠졸재(七拙齋) 박창우(朴昌禹)의 후예로 광주(光州)에서 살았다.[주-D002] 나의 …… 것이니 : 원문의 지중(知仲)은 자신의 사정을 잘 알아준다는 뜻으로, 포숙아(鮑叔牙)가 그의 벗인 관중(管仲)의 행위를 다 이해해 주었다는 관포지교(管鮑之交)에서 온 말이다.[주-D003] 궁려(窮廬)의 탄식 : 주희의 〈봉수구자야표형음주지구(奉酬丘子野表兄飮酒之句)〉 시에, “고래로 곤궁한 선비는 세모에 고심이 많다네.[古來窮廬士, 歲暮多苦心.]”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晦庵集 卷1》
- 2020-10-04 | NO.136
-
- 박우의 모살사건-첩과 종의 모의가 의심된다
- 중종 28년 계사(1533) 9월 24일(계해) 인사정책에 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강론을 마친 뒤에 영사 한효원이 강론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의 말을 인용하여 아뢰기를,“사마광(司馬光)이 ‘조례(條例)는 이와 같더라도 실정(實情)을 따져서 죄를 정해야 한다.’ 한 이 말은 영원히 본받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한결같이 법의 조문만을 따를 뿐이라면 이는 실정을 살펴 죄를 정하고 죄수를 위해 살려줄 방도를 찾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이 말이 타당하다. 유사(有司)가 법을 집행할 때는 마땅히 조절하여 살려줄 길을 찾아야지 법의 조문만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박우(朴祐)의 첩이 연원수(連原守)와 간통한 일은 강상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지난번에 의금부가 취품했다. 이와 같은 일은 판결하기가 지극히 어렵다.”하였다. 한효원이 아뢰기를,“박우의 첩에 관한 일은 추문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일이 종실(宗室)에 연관되었고 그 첩도 아직 어린데 일죄(一罪)를 범했으니 가볍게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이 전에 추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대체로 실정을 알기 어려운 은미한 옥사(獄事)는 반드시 철저히 추문하여 의심스러운 일이 없은 다음에야 판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증거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도 반드시 왕래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적(形跡)만으로 곧바로 본인을 추문하니,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애석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종실이니 상께서 분명히 가리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의심스럽다는 생각만으로 여러 차례 고문을 가하면 끝내는 후회할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하고, 동지사 심언경이 아뢰기를,“지난번에 사증(辭證)을 갖추기 위해 종을 추문하였으나 뚜렷이 드러난 일이 없었고 밖의 사람들이나 이웃사람들도 다 애매하다고 하였고, 박우도 역시 첩의 심성이 착하지는 않으나 그 일이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옥사(獄事)로 보더라도 은장(銀匠)에게 약을 사려 했는데 은장은 바로 박우의 일족이라서 독(毒)이라고 하여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우의 종이 박우에게 그것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했을 따름이며, 이 때문에 대간이 아뢴 것입니다. 일이 매우 중대하지만 사증이 없는데,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가하면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이는 실로 작은 일이 아니므로 사중(司中)에서 계품하는 것입니다.” 【언경이 이때 의금부 동지(義禁府同知)로 있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유사(有司)가 짐작해서 해야 한다. 첩이 그 지아비를 모살(謀殺)하는 것은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인데, 그러나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시끄러운 것이리라.”하였는데, 대사헌 권예가 아뢰었다.“전에는 정청(政廳)의 의논이 대간을 오히려 압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상관이 감히 주의(注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관들도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정청이 인물에 대해 논하는 일이 없는데 인물이 얼마나 되기에 현부(賢否)를 알 수 없겠습니까. 대체로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어올 수 없는 것인데, 앞의 정사(政事)에서 논박하여 파직한 사람을 뒤의 정사에서 다시 주의하고, 대간이 내쫓으면 전조(銓曹)는 다시 등용하니, 이 폐단이 매우 큽니다. 지금 좌우에게 들어보면 역시 이런 폐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사사롭게 인정(人情)을 쓰는 일이 매우 많으니 상께서도 이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이고, 유사(有司)도 역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원전】 17 집 472 면【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주-D001]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 송(宋)의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충하여 명(明)의 구준(丘濬)이 지은 책.[주-D002] 정사(政事) : 인사행정.
- 2022-05-31 | NO.135
-
- 박주빈 (제문) 에게 답하다〔答朴周彬, 濟文〕 - 노사집 제4권
- 박주빈 (제문) 에게 답하다〔答朴周彬, 濟文〕 - 노사집 제4권요사이 어떤 사람이 귀촌(貴村)의 근처에 전염병이 극성이라고 전해주던데,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지는 못했지만 염려가 컸었네. 이럴 즈음에 편지를 받고 대소가의 건강이 두루 평안하고 마을의 집들도 깨끗하다고 하니, 이는 변란의 해에 기쁜 소식이네. 가려움증이 말끔히 사라진 것은 언제부터이며, 학업은 전폐하지 않았는지? 그대 조카는 집에서 학업을 하는가? 저번께 괴화(槐花)가 벌써 맺힌 것을 보고 조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네. 만나거든 이런 뜻을 전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나는 집안에 다행히 다른 일이 없고, 전염병의 기운도 다행히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네. 그런데 이웃 마을은 모두 깨끗하지 않아 원근에서 들려오는 사망 소식이 참담하니, 내왕하거나 들르는 것도 이로부터 더욱 어렵게 되었네. 일단 여름이 다 가고 서늘한 바람이 나기를 기다려야 하겠네. 집이 가난하여 제삿날이 될 때마다 밥과 국만 차리는 일도 항상 재물이 없어 걱정인데, 올해는 더욱 궁색하여 예법을 갖추지 못하였네. 그대가 매번 잊지 않고 제수(祭需)를 도와주니, 딸집의 효도가 도리어 아들집의 불초(不肖)함보다 더 낫네. 서글프기 그지없네.[주-D001] 박주빈(朴周彬) : 박제문(朴濟文, 1813~?)으로,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주빈이다. 칠졸재(七拙齋) 창우(昌禹)의 후예로, 광주(光州)에서 거주하였다. 기정진의 문인이자, 매부(妹夫)이다.[주-D002] 괴화(槐花)가 …… 없었네 :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응시하라는 뜻이다. 괴화는 홰나무 꽃인데 중국에서는 괴화가 필 때 곧 음력 7월에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이때 괴화가 누렇게 피기 때문에 당(唐)나라 속어에 “괴화가 누렇게 피면 과거 보는 선비가 바쁘다.[槐花黃, 擧子忙.]” 하였다.
- 2020-10-04 | NO.134
-
- 박해량(朴海量) 행장 -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2권 병자년(1876, 고종13) 선생 44세
- 박해량(朴海量) 행장 -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2권 병자년(1876, 고종13) 선생 44세, 거유 최익현(崔益鉉)윤5월 문인 박해량(朴海量)이 정심사(淨心寺) 중 인찰(寅札)ㆍ춘담(春潭)을 데려 와서 뵙고 선생의 초상을 그려 포천 본댁으로 모시고 갔다.박해량의 자는 도겸(道謙),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집이 광주(光州) 하남(河南)에 있었다. 일찍이 제주에서 선생을 뵈었고 또 용서받고 돌아올 적에 책 상자를 지고 따라와서 제자의 예를 행하였다. 이제 또 화승(畵僧)을 데려와서 선생의 초상을 그렸고, 3개월 동안 모시다가 돌아갔다. 뒤에 항상 천리 길을 멀다 여기지 않고 포천을 내왕하더니, 병술년(1886, 고종23)에 와서 37세의 나이로 죽었다. 선생이 그를 애석히 여겨 행장을 지어 주었다.○ 이때 사방에서 선생의 의리를 사모하는 이가 흑산도로 많이 들어와 뵈었는데, 단천(端川) 사람 최영호(崔永皓)가 그중에 더욱 특출난 사람이다. 중암이 그를 위하여 ‘최영호 입흑산도기(崔永皓入黑山島記)’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금상(今上) 10년 계유(1873) 11월, 면암(勉菴) 최공(崔公)이 일을 말한 것 때문에 조정의 비위를 거슬려 제주 바닷가로 위리안치되었다가 3년 뒤 을해년(1875)에 방환(放還)되어 편의대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듬해 병자년(1876) 정월에 또 도끼를 가지고 궐문 밖에 엎드려 ‘양구(洋寇)가 왜적을 끼고 맹약을 요구하니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극력 말하였더니, 조정에서 또 흑산도에 위리안치하였다.대개, 한 신하가 참되어 국가가 망해감을 통분하고 천하가 바르지 못함을 슬퍼하기를, 산 동쪽에서 우는 봉황[朝陽之鳳]이나 가을 하늘의 새매처럼 하니 비록 원수와 적이 많아져서 찬배되어 만번 죽을 고비를 겪었으나, 이에 힘입어 우주가 동량(棟樑)으로 삼고 일월이 어두워짐을 면한 것은 옛사람의 일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의기에 감동되어 농부나 심부름하는 하인들도 사마(司馬)를 알아보고 칭송하였으며, 먼 시골 구석 사람들도 구역(九罭)ㆍ낭발(狼跋)의 의사가 있었다.박해량 도겸(朴海量道謙 도겸은 자(字))이 광주(光州)에서 험한 바다를 건너 제주에 들어가서 제자의 예를 매우 공손하게 닦았다. 최공이 풀려 포천으로 돌아온 뒤에는 또 제자의 예를 행하여 떠나지 않고 머물러 온갖 고생을 겪으며 학문에 힘썼는데 이때 와서 또 흑산도로 따라가서 성심으로 섬기고 떠나지 않았으니, 이는 정자(程子) 문하의 마동평(馬東平)을 오늘날에 다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생(朴生)은 사부(士夫)이니, 손재공(遜齋公 박광일(朴光一))이 방조(傍祖)가 된다. 손재공은 일찍이 화양 선생(華陽先生 우암(尤菴) 송시열을 말함)을 사사하여 세상에서 고제자(高弟子)로 일컬어졌으니, 그 연원(淵源)의 소종래가 본디 이와 같았던 것이다.최영호는 단천(端川)의 하민(下民)으로서 공의 명성을 듣고 도보로 1천여 리를 왔는데, 집이 가난하여 노자가 없어 남루한 차림으로 걸식해 가며 와서 문을 두드리고서 공을 뵙기를 청하였다. 공의 집에서, 다시 절해(絶海)로 방축되었다고 말하니 영호가 깜짝 놀랐다. 이어서 편지 하나를 굳이 청하여 품에 넣고, 다시 포천에서 남으로 1천여 리를 가서 바다를 건너 흑산도에 이르러, 공의 안색을 바라보고 기거(起居)를 물어서 제자의 예를 닦은 뒤에야 돌아갔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어찌 더욱 기특하지 않겠는가.또 김의현 진여(金懿鉉晉汝 진여는 자임)는 창평(昌平)에서 흑산도로 찾아왔고, 조종헌 준로(趙鍾憲俊魯 준로는 자임)는 순천에서 두 번 들어갔고, 이인(吏人) 이필세(李弼世)는 임피(臨陂)에서 제주도에 들어갔다. 하권묵(河權默)은 영암(靈岩) 아전이고, 손태효(孫台孝)는 나주 아전인데, 두 사람이 사모하는 성의를 드린 것도 또한 혜주(惠州)가 하늘 위에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아, 저 광란(狂亂)을 불어내어 모함하여 해치기를 마지않는 자는 다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른바 ‘천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은 서로 멀다.’는 것인가. 위의 몇 사람에게 참으로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이듬해 정축년(1877) 3월에 내가 가릉(嘉陵)에서 서쪽으로 화산(花山)에 가서 선영(先塋)을 성묘하고 최공의 집을 찾아가서 대정(大庭 남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최익현의 아버지를 가리킴) 어르신네를 뵈었더니, 어르신네께서 나를 붙들어 하룻밤 자면서 몇 사람의 일을 일러 주고 나에게 그것을 쓰게 하였다. 내가 삼가 응낙하고 물러와서 대강 몇 줄의 글을 지어 돌려 드리면서 어르신네에게 ‘이것을 비밀로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방붕(邦朋)ㆍ방무(邦誣)의 죄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주 선생(朱先生)이 조자직(趙子直) 제공(諸公)들과 당적(黨籍)에 들고 시를 지어 스스로 자랑하여 이르기를 ‘늙은 몸의 영광이다.’ 하였으니, 이런 의의에 의거해 보면 또한 신밀(愼密)히 할 것이 없도다. 아, 슬프다.”
- 2020-09-16 | NO.133
-
- 방죽과 보를 수축(修築)하는 일에 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 광주목사
- 보첩고(報牒攷) -光州牧使○ 영조(英祖) 42년(1766) 정월 초6일 방죽과 보를 수축(修築)하는 일에 관해 순영(巡營)에 보고하다첩보(牒報)하는 일. 작년의 홍수는 근년에 없던 것으로 방죽과 보를 막론하고 도처마다 붕괴되고 훼손되었으므로 봄철에 수축하는 것을 조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또 지엄한 관문(關文)의 신칙을 받았으니만큼 더욱더 마땅히 경각심을 갖고 거행해야겠습니다.경내 각처에 방죽과 보가 홍수로 파손된 상황에 대해 작년 가을에 복심(覆審)할 때 목사(牧使)가 거의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소소하게 파손된 곳을 두루 다 손꼽아 셀 수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봄에 역사를 크게 벌이지 않아도 일일이 다 완전히 수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보와 긴 방죽 중에 형체가 없어져 질펀하게 끝이 없는 것은 바로 황룡강(黃龍江) 선암보(仙巖洑)와 방하동(方下洞) 가음내(可音內) 축언(築堰) 등 두어 곳인데, 그 보는 수천 석의 논에 수리(水利)의 혜택을 입히고, 그 방죽은 수백 호가 의지해 살고 있는 곳입니다.지금 막 첫봄을 만나 의당 먼저 이와 같이 큰 곳을 수축해야겠기에 이미 상중하(上中下)의 소임을 차정(差定)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해빙(解氷)이 되기를 기다려 즉시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곳이 엄청나게 커서 단지 일을 하는 것만으로 의논할 수 없으므로 부근의 면민(面民) 장정에게 조금 품삯을 지급하여 같이 힘을 합해 완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을 막고 파손된 곳을 보완하려면 소나무 가지가 아니면 안 되므로 개인의 산이나, 공한지에 구불구불 자란 소나무 가지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을 동원해 사용하는 것과 소나무 가지를 베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첩보(牒報)하오니, 특별히 참작하여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제사(題辭)이 첩보의 내용을 보니, 공무를 봉행하는 성근함에 정말로 존경하고 감탄하였다. 대체로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백성을 위한 것이니, 어찌 민력(民力)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근 백성의 장정을 동원하여 힘을 합해 완전하게 수축해야 할 것이다. 소나무 가지도 가져다 사용해야 하는데, 비록 개인의 산이지만 이와 같이 할 적에 전체를 벨 염려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엄하게 신칙해야 할 것이다.
- 2023-08-17 | NO.132
-
- 백련사 어록〔白蓮社語錄〕 - 손재집
- 백련사 어록〔白蓮社語錄〕 - 손재집 제9권 / 어록(語錄) : 박광일(朴光一, 1655~1723)○ 기사년(1689, 숙종15) 2월에 선생께서 세자(世子) 세우는 일로 상소하였다. 사헌부(司憲府) 관원이 논계하여, 선생을 제주도에 안치(安置)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달 18일 선생께서 선암(仙巖)에 도착하였다. 광일이 미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들어가 절하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오래전부터 이 걸음이 있을 줄 알았다.”라고 하고, 이어서 묻기를 “요새 무슨 책을 읽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여러 책을 대강 보느라 전일하게 힘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다.선생께서 또 말하기를 “부모님 모시기는 어떠한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가친께서 선생님께 인사드리려고 지금 바깥채에 와 있습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 바로 심부름하는 동자를 시켜 문안 인사를 전하게 했다.또 일어나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중도에 부치신 편지는 잘 받았으나 이곳에는 《주자어류》가 없어서 미처 말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자대전(朱子大全)》이 있기에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주자대전》은 이미 행장(行裝)에 가져왔으나 《주자어류》는 짐이 무거워서 멀리 가져오기 어려워 남중(南中 호남 지방)의 친구에게서 빌려 보려고 했네. 배우는 이는 하루도 《주자어류》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 갖고 있지 못했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가난한 선비이다 보니 미처 장만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가난한 선비라 장만할 재력이 없으면 학궁(學宮 향교)에서 인쇄하여 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또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실 때 안청촌(安淸村)에 잠깐 들르셨다는데, 안청에서 맞이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중간에서 맞이하는 것은 혹시나 편하기 어려운 꼬투리가 될까 염려되어 곧장 여기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병든 몸이라 부득이 잠시 길옆의 집에서 쉬었는데, 그 집은 바로 죽은 친구 사술(士述)의 집이어서 슬픈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네. 그 집에 두 분 선생님의 왕복 편지가 있기에 빌려 왔네.”라고 했다.박중회(朴重繪)가 들어와 절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의 일을 무어라 말씀드리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이 옛정을 펴고 나서 말하기를 “옛날에 채서산(蔡西山)이 용릉(舂陵)으로 귀양 가게 되었을 때, 이는 죽으러 가는 걸음인데도 주자가 탄식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무엇을 서로 위로한단 말인가.”라고 했다.선생께서 묻기를 “서석산(瑞石山)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30리입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 광일에게 말하기를 “자네 어르신의 얼굴과 풍채를 살펴보니 병도 없고 강녕하신 듯하네.”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앓으시다가, 봄과 여름에는 연례로 조금 나아지십니다.”라고 했다.또 묻기를 “오는 길에 동쪽으로 높고 큰 산이 바라다보이던데 전에 가 보지 못한 곳이었네. 그것이 서석산(瑞石山)인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19일, 행차가 금성(錦城 나주(羅州))에 도착하였다. 20일, 이른 아침에 수여(受汝 박중회(朴重繪)의 자)와 함께 들어가 문안을 드리자 선생께서 시 한 수를 지어 수여에게 주시니, 대체로 옛정을 생각하는 뜻을 술회한 것이었다. 이어 판서(判書) 김만중(金萬重)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선생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평소에는 신부(新婦)와 같으나 입을 열면 곧 요긴한 말을 하였네. 지난해 윤휴(尹鑴)가 탑전(榻前)에서 아뢰기를 ‘어전(御前)에서는 공자(孔子)도 굳이 휘(諱 이름을 부르지 않음)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김 판서가 면전에서 반박하기를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도 북쪽으로 향하여 무릎 꿇고 절하며 공경하는데 어찌 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굳이 휘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네. 임금께서 윤휴의 말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에 김 판서는 문외출송(門外黜送)이 되었네.”라고 했다.○ 선생께서 왕복 편지를 열람해 보고 말하기를 “두 분 선생의 논설이 거의 부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었으니, 애석하도다!”라고 하기에, 광일이 대답하기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견해는 정말로 명백한데, 퇴계(退溪)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은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주자는 ‘음양(陰陽)이 뒤섞여 있어도 그 단서(端序)를 잃지 않으니 곧 이것이 천리(天理)의 발현이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에 이런 뜻은 살피지 않고 이기호발설을 강력히 주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봉의 ‘사단(四端)도 절도(節度)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 말도 주자의 말씀입니다.”라고 했다.선생께서 말하기를 “주자가 자네 말처럼 그런 말을 했으니, 이는 이기(理氣)를 겸하여 말한 것으로, 그 말을 제대로 갖추려고 한 것이지. 그러므로 공자가 성(性)을 말할 때 ‘이어 가는 것이 선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다.[繼之者善, 成之者性.]’라고 하였고, 또 ‘천도가 변화함에 각각 그 성명을 바르게 한다.[乾道變化, 各正性命]’라고 하였으니, 성(性)을 논할 때는 공자께서 성을 논한 것만 한 것이 없네.”라고 했다. - 기(氣)를 논하면서 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못하고, 성을 논하면서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생께서 이 말을 하였다. - ○ 이날 영산강(榮山江)을 건너 죽두촌(竹頭村)에서 묵었다. 밤에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광일이 묻기를 “사계 선생께서, 우계(牛溪 성혼(成渾))가 임진왜란 때 강화(講和)하자고 한 문제에 대해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우계가 강화를 논의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강화하자는 계책은 무척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왔네. 그때 우리나라가 보전을 믿고 있던 것은 오직 천장(天將 명(明)나라 장수)뿐이었는데, 천장이 굳이 강화를 하려고 하니 우리나라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천장은 장차 우리를 버리고 돌아갈 것이고, 천장이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하여 강화하자는 의논이 나온 것이네. 그런데 당시 옥대(玉帶)를 뽑아 가거나 의심스런 흔적을 만드는 등 능변(陵變)이 발생한 것 등은 신하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나라는 왜노(倭奴)와 하늘을 같이할 수 없는 원수였지. 그러므로 사계 선생의 뜻은, ‘그때 죽기로써 지키는 것은 경도(經道)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권도(權道)이니, 이 경우에 만일 성인(聖人)이 계셨다면 권도를 쓸지 안 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인(賢人) 이하는 경도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나을 터인데, 우계는 무엇 때문에 가벼이 권도를 썼느냐.’라는 것이었네. 사계 선생의 의심은 여기에 지나지 않네. 그 의리가 어떻다는 것을 논했을 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상소하였는데, 임금께서 보류해 두고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초본은 남아 있네. 대체로 그때의 사세가 위급했으므로 유서애(柳西厓)가 강화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우계를 찾아와 의논하자, 우계도 그렇다고 생각하여 함께 청대(請對)하였네. 선조(宣祖)께서 그들이 화의(和議)를 주장하기 위하여 청대하는 줄 짐작하고 범할 수 없는 기색이 있었으므로 서애는 두려워 감히 그 말을 꺼내지 못했고 우계께서 꺼내었네. 이에 선조께서 진노하시어 시를 지어 벽에다 써 붙이기까지 하셨는데, 그 시는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겠네.”라고 했다. 중회(重繪)가 말하기를 “‘어찌 간사한 말을 지어내어 의리를 부수고 삼군을 미혹하는가.[如何倡邪說, 破義惑三軍?]’라는 시는 선조의 시인데, 이것이 그때의 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그것이 그때의 시인 듯하네. 그 뒤에 결국 화의를 받아들였으면서도 선조는 끝내 우계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감히 알 수 없는 일이네. 그 당시에 강화하자는 의논은 실지 서애가 먼저 제의했으나 임금 앞에서는 감히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인(南人)들은 유독 우계에게만 허물을 돌렸으니, 가소로운 일일세.”라고 했다.○ 광일이 묻기를 “지난번 의논한 괘변(卦變)에 대해 망녕되이 저의 좁은 소견으로 도(圖)를 만들어 보내드렸는데, 살펴보셨는지요?”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보았네. 그 도(圖)가 아마 행장 가운데 있을 것이네. 다만 《주역》의 괘변은 《역학계몽(易學啓蒙)》의 괘변과 서로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이것이 내가 답답한 점이네.”라고 했다.대답하기를 “《역학계몽》의 괘변은 괘(卦)마다 모두 64변(變)이 있다는 뜻이고, 《주역》의 괘변은 다만 강유(剛柔) 2효(爻)가 아래위로 왕래하는 뜻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음(純陰 곤괘(坤卦))과 순양(純陽 건괘(乾卦))의 괘에는 모두 어디로부터 왔다는 뜻을 말하지 않았으니, 《주역》과 《역학계몽》이 각각 다른 까닭입니다. 《본의》에서 ‘어떤 괘는 어떤 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 것은 각각 저절로 그러한 형세이지, 사람의 힘으로 안배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마음이 후련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송 수찬(宋修撰)이 말하기를 “예전에 탑전에서 괘변을 강론할 때, 권 아무개가 - 그 이름을 잊었다. - 소견을 진달했는데, 그 말이 무척 지리했고 또한 《본의》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에서 진달하기를, ‘주자의 《본의》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권 아무개의 말은 《본의》와 전혀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권 아무개는 이에 두리번거리며 ‘소신이 과연 망발을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권은 역학(易學)에 조예가 깊다고 들었는데, 그 소견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21일, 불수원(不愁院)에 도착하였다. 선생께서 광일에게 말하기를 “어제 강론한 괘변(卦變)을 지금 도(圖)로 만들어 다시 강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 도(圖) 하나가 소매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선생께 드렸더니 선생께서 펴 보셨다. 광일이 강유(剛柔)의 괘(卦)가 서로 왕래하는 뜻을 설명해 드렸다.송서구(宋敍九)가 말하기를 “지금 ‘강유가 서로 왕래한다’고 하였지만, 〈송괘(訟卦)〉 아랫부분의 중효(中爻 제2효(爻))는 〈천화동인괘(天火同人卦)〉에서 왔다고 하여도 될 터인데, 하필 〈돈괘(遯卦)〉에서 왔다고 해야 하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동인괘〉의 제2효(爻)와 제3효가 왕래하면 〈천택리괘(天澤履卦)〉가 되는데, 어찌 〈송괘〉가 〈동인괘〉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서구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라고 하고, 이어 선생께 아뢰기를 “이 도(圖)는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했다.선생께서 흔연히 권이진(權以鎭) - 선생의 외손 - 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알겠느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평소 생각할 때에는 그런 까닭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니 정말 의심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이 다음에 너는 이 그림을 보지 않고도 그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권생(權生)이 말하기를 “오늘 이후로는 거의 그려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선생께서 말하기를 “가슴속에 있는 견해를 분명하게 그려낸 다음에야 비로소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광일이 아뢰기를 “이 그림은 제가 창조해 낸 견해가 아니고, 사실 주자의 일기(一奇)와 일우(一耦)가 왕래한다는 설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그렇지.”라고 했다.○ 이날 정오에 어떤 사람이 술과 안주를 내어왔다. 선생께서 어육(魚肉) 등의 음식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사람과 물건은 모두 천지(天地) 사이에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니, 나중기(羅重器)가 경솔하게 대답하기를 “사람이 먹는 물건은 모두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 웃으며 말하기를 “옛날 정자(程子)의 문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정자가 ‘그러면 너의 몸은 이[蝨]를 위하여 생겼느냐’라고 하셨다. 정자의 이 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대저 오행(五行)은 상극(相克)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만물(萬物)에도 서로 잡아먹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22일, 석주원(石柱院) 하촌(下村)에 당도하여 묵었다. 23일, 이른 아침에 들어가 문안을 드리니, 선생께서 박 참봉(朴參奉) - 박태초(朴泰初) -의 집에서 빌려 온 《주자어류》를 보시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을 시켜 분류(分類)를 정리하고 계셨다. 선생이 광일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하루라도 《주자어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옷을 팔더라도 사야 할 것이네. 판본(板本)이 금산(金山)에 있고 또 그 지방에는 이름난 절이 있으니, 책을 가지고 금산사(金山寺)에 가서 머물러 읽으면서 그 참에 인쇄하여 오면 좋을 것이네.”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도 그 절에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 절에서 글을 읽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선생께서 좌중의 여러 사람에게 《주자어류》 가운데서 괘변(卦變)의 예(例)를 가려내게 하셨는데, 선생께서 주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 조목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기 때문에 나도 평소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광일이 주자가 논의한 ‘하나의 기와 하나의 구가 변환한다[一奇一耦變換]’라는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이 시생이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헤아려 보면 《본의》와 서로 들어맞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그런가?”라고 했다.묻기를 “《대학》 혈구장(絜矩章)에서 ‘백성이 배반하지 않는다.[民不背]’라고 말한 것은 ‘효를 일으키고 제를 일으킨다.[興孝興弟]’는 뜻이고, 백성도 자애를 일으킨다는 뜻입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바로 그렇지.”라고 했다.○ 또 묻기를 “시생의 생각은, 자애[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로 밝히기를 ‘자식 기르기를 배운 뒤에 시집가는 사람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애를 일으킨다[興慈]’고 하지 않고 단지 ‘배반하지 않는다[不背]’라고 했습니다. 시생의 견해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혹여 견강부회는 하지 말게.”라고 했다.○ 이날 저녁때 강진(康津)에 당도하였다. 성(城)안이 시끄러우므로 포구 마을에 가서 묵었더니, 새로 지은 집으로 깨끗하고 벽 위에 《천자문(千字文)》을 걸어 놓았는데 필법(筆法)이 매우 특이하였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이것은 취금(醉琴 박팽년(朴彭年))의 글씨로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정말 취금의 글씨입니까?”라고 했다.아, 취금 박 선생은 회덕(懷德) 사람이고 1백 년이 지난 뒤에 그 글씨가 바닷가 백성의 집에 걸려 있는 것이 대단히 이상한 일인데, 지금 회덕 노선생(老先生)께서도 이곳에 머물게 되셨으니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아마도 그 사이에 하늘이 정한 운수가 있는 듯하다.○ 24일, 기해의례(己亥議禮)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 앞에 문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 강론을 마치고 나서 선생께서 말하기를 “허목(許穆)은 예가(禮家)의 죄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 송주석(宋疇錫)이 선생께서 수여(受汝 박중회(朴重繪)의 자)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바쳤다. 선생께서 여러 차례 읊은 다음 좌중에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자네들도 모두 차운하게.”라고 했다. 물러나 차운하여 올렸다.○ 선생께서 바야흐로 물과 토양을 염려하셨다. 송 서산(宋瑞山)이 - 선생의 아우인 송시걸이다. - 말하기를 “고을 사또가 ‘이 마을은 낮고 가라앉았으며 물맛도 지극히 좋지 않으니, 결코 오래 머물 땅이 아니다. 물맛은 오직 만덕사(晩德寺)가 좋으니, 배를 구하여 수리하는 동안 그 절에서 머무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렇다.”라고 했다.오후에 만덕사로 향했는데, 당시 바다와 산이 적막하여 전혀 봄기운이 없었는데, 절 아래 장춘동(長春洞)에 이르니 분위기가 물씬 늦봄 기상이 있었다. 대개 한 골짜기에 두루 사철나무이지만, 동백나무가 난만하게 붉은 꽃을 피우고 있으니, 장춘이란 이름이 진실로 허언이 아니었다. 누각에 오르니, 누상에 ‘만덕사백련사(晩德寺白蓮社)’라는 큰 글씨 여섯 글자가 한 현판에 같이 써 있었다. 노승이 말하기를 “이것은 김생(金生)의 글씨인데, 난세에 물속에서 화를 면했다.”라고 했다. 또 ‘만경루(萬景樓)’라는 큰 글씨 세 자가 있었는데 역시 감상할 만하였다.이때 함평(咸平) 안중화(安仲和)가 와서 뵙고 말하기를 “소생은 안여해(安汝諧)입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제명(題名)하는 곳에 적힌 “안여해” 석 자를 가리키며, “내가 이것을 보고 이미 도착했음을 알고 있었네.”라고 했다.누상에 서역(西域) 글자로 된 현판이 있었는데, 선생께서 대략 번역하여 뜻을 설명해 주셨지만 속된 소견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다.○ 25일,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올렸다. 이어 아뢰기를 “선생님께서 장성(長城)에 도착하여 참봉 기정익(奇挺翼) 어른을 만나셨습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만났네.”라고 했다.말하기를 “이 어른이 ‘사람은 모두 미발(未發)의 중(中)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사람이 일 없이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외면으로 보면 비록 고요한 듯하지만, 그 속은 염려와 움직임의 싹이 없지 않으니 어찌 미말의 중이라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식사 후에 선생께서 법당(法堂)에 나와 앉으시어, 바다 위에서 권(權 권이진(權以鎭))ㆍ윤(尹 윤주교(尹周敎)) 두 외손자를 보내는 서(序)를 지으셨는데, 선생께서 입으로 부르고 송주석(宋疇錫)은 받아 적었다. 내가 그 대의(大義)를 보니, 맨 첫머리에는 두 사람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멀리 보낸다는 뜻을 말하였고, 중간에는 두 사람의 세덕(世德)을 진술했고, 끝에는 학문하는 일을 권면하였다. 두 사람이 받들어 읽고는 서글퍼 하는 모습이었다.선생께서 제주를 유람한 적이 있는 노승(老僧)을 불러 제주도의 물정ㆍ풍토와 경치를 물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한라산(漢挐山)을 더욱 자세히 물으셨다. 또 이어 묻기를 “만일 절 뒤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니, 노승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개고 일기가 맑은 날에는 볼 수 있는데, 마치 바다 구름 한 조각이 아득한 곳에 보일 듯 말 듯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다.선생께서 자리 귀퉁이에 《주자대전(朱子大全)》ㆍ《주자어류(朱子語類)》 및 《격양집(擊壤集)》, 두 선생의 왕복 편지 등의 책을 쌓아 놓고 그지없이 사색에 잠기셨는데, 항상 《격양집》을 주로 보셨다. 그 나머지는 마음 내키는 대로 보셨으며, 길을 가실 적에도 《격양집》 1권은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선생께서 광일에게 말하기를 “‘초나라가 연나라로 문서를 보낸 이야기[郢書燕說]’에 대해 아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 뜻이 대개 ‘동을 물었는데 서를 답한다[問東答西]’는 뜻입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네. 옛날에 초(楚)나라 재상이 연(燕)나라에 보낼 문서를 지으면서, 한 사람에게 촛불을 들게 하고 한 사람에게는 적도록 했다네. 초나라 재상이 ‘들라[擧]’고 했는데, 그 뜻은 불을 들라는 것이었네. 그런데 적는 사람이 살피지 못하고 바로 ‘거(擧)’ 자를 썼네. 초나라 재상 또한 살피지 못하고 연나라로 보냈다네. 연나라 사람이 ‘거’ 자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서, 이윽고 ‘이는 현자를 등용하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현자를 등용했더니 연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고 하네. 이것이 ‘영서연설’의 이야기일세. 한 글자의 착오가 남의 나라를 크게 다스려지게 했으니, 재미있는 일일세.”라고 했다.○ 광일이 말하기를 “주자의 《태극도해(太極圖解)》 중에서 논의한 오행(五行) 한 대목은 바로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의 ‘수음(水陰)은 양에 뿌리를 두고 화양(火陽)은 음에 뿌리를 둔다’고 한 설에 근거하여 곧장 도체(圖體)를 풀이한 것입니다. 황면재(黃勉齋)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도리어 ‘수가 양의 어린 것이 되고, 화가 음의 어린 것이 된다.[水爲陽稚, 火爲陰稚.]’고 말한 것은 전혀 염계의 본의가 아니고, 나아가 주자가 《태극도(太極圖)》를 풀이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생이 망녕되이 좁은 소견으로 논변한 바가 있으나, 초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면재의 설은 진실로 알 수 없는 데가 있네.”라고 했다.○ 26일, 박수여(朴受汝)가 묻기를 “《대학장구(大學章句)》에 ‘의성(意誠) 이하는 모두 그칠 곳을 얻은 차례이다[意誠以下, 則皆得所止之序]’라고 한 말은, 삼강령(三綱領)의 차례로 보면 의성에서부터 신수(身修)까지 이른 다음에야 ‘명명덕(明明德)의 지지선(止至善)’이라 말할 수 있고, 가제(家齊)로부터 천하평(天下平)까지 이른 다음에야 ‘신민(新民)의 지지선’이라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그칠 곳을 얻는 차례다[得所止之序]’라고 한 ‘서(序)’ 자로 보면 이와 같을 듯한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하였다.선생께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네. 나누어서 말하면 성의(誠意)에도 지지선이 있고 정심(正心)에도 지지선이 있고 수신(修身)에도 지지선이 있어서, 제가(齊家) 이하가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네. 그러므로 ‘의성 이하는 모두 그칠 곳을 얻는 차례다’라고 한 것이네.”라고 했다.어떤 승려 한 사람이 종이 두 장을 올리면서 글씨를 써 달라고 청하였다. 선생께서 한 장에는 ‘서암의 승려가 또렷하도다[瑞巖僧惺惺]’라 쓰고, 한 장에는 ‘그대는 큰 스님이 되지 말고, 큰 도둑이 되라[汝不爲大僧, 爲大盜]’는 여덟 자를 쓰신 다음 붓을 놓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주자어류》의 말이다.”라고 했다.수여(受汝)가 또 장지(壯紙) 몇 장을 올리니, 선생께서 승려의 붓을 자기의 붓에다 합쳐 묶어서 시원스럽게 큰 글씨로 ‘고금의 역사 속에 한가롭고, 하늘과 땅 사이에 취했노라[閒中今古, 醉裏乾坤]’ 여덟 자를 쓰셨다.○ 광일이 이별시 두 수를 써 올렸더니, 선생께서 차운(次韻)하여 주셨다. 이어 말하기를 “괴안국(槐安國)에 관한 고사를 아는가? 옛사람이 꿈에 개미를 따라 괴화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40년 간 부귀를 누렸다는 것이 괴안국에 관한 이야기일세. 이것은 대체로 인간 만사가 모두 허사라는 말이네.”라고 했다.○ 광일이 평소 지었던 《호연장문답(浩然章問答)》을 올리며 말하기를 “이는 시생이 《맹자》를 읽을 때의 차기(箚記)입니다.”라고 하고, 이어 “고자가 말하기를, 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든 …… 기운에서 구하지 말라[告子曰不得於言, …… 勿求於氣]” 이하 몇 대목을 뽑아내어 내가 읽자 선생께서 들으셨다. 읽기를 마치자 선생께서 말하기를 “논의한 바가 옳다.”라고 했다.○ 또 묻기를 “이과재(李果齋 이방자(李方子))의 ‘오성(五性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에 모두 정(靜)과 동(動)이 있다’고 한 말은 혹 말에 병통이 있는 듯합니다. 오성이 제각기 움직이고 고요하여 혼연한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어찌 주자께서 말한 괴루(塊壘 응어리)라는 병통에 가깝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과재의 말은 병통이 되지 않네. 오성(五性)이 마음속에 혼연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서 각각 조리가 있기 때문에 인(仁)이 움직이면 측은(惻隱)한 마음이 되고 의(義)가 움직이면 수오(羞惡)하는 마음이 되고 예(禮)가 움직이면 사양(辭讓)하는 마음이 되고 지(智)가 움직이면 시비(是非)를 가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측은한 마음이 감동할 적에 의ㆍ예ㆍ지가 다 같이 움직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네. 네 가지가 다 그러하네. 그러므로 주자의 ‘조리(條理)와 간가(間架)가 있다’는 설, ‘성(性)과 정(情)이 체(體)와 용(用)이 되며 각기 저절로 분별이 있다’는 설, ‘하나의 이치[理] 속에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이 서로 체(體)와 용(用)이 된다’는 설이 있는 것일세.”라고 하고, 이어 주자의 〈옥산강의(玉山講議)〉를 내어 보이셨다.금오랑(金吾郞 의금부 도사)이 배[船] 구하기를 재촉하여 어렵게 배 1척을 얻었다고 하니, 선생께서 말하기를 “내일 작은 배라도 타고 내려가야겠다.”라고 했다.○ 28일 오후, 박수여(朴受汝)와 집에 돌아가겠다고 아뢰었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호연장문답》은 내가 장차 가지고 가려고 이미 가동(家僮)에게 맡겼네.”라고 했다. 마침내 절하고 하직한 뒤 돌아왔다. - 위는 기사년(1689, 숙종15) 백련사(白蓮社)의 어록이다. - [주-D001] 기사년 …… 상소하였다 : 숙종이 희빈 장씨 소생을 원자(元子)로 세우자, 봉조하(奉朝賀) 송시열이 위호(位號)가 너무 이르다며 “대개 철종(哲宗)은 열 살인데도, 번왕(藩王)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神宗)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太子)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이 산림이므로 귀양은 보내지 않고 삭탈관작하였고, 송시열을 구원하는 상소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15년 1월 11일, 2월 1일》[주-D002] 사헌부(司憲府) …… 내렸다 : 송시열의 상소에 대해, 집의(執義) 박진규(朴鎭圭)ㆍ장령(掌令) 이윤수(李允修)를 필두로 비판이 이어졌고, 곧 제주로 유배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15년 2월 7일, 3월 19일》[주-D003] 선암(仙巖) : 전라도 광산현(光山縣)에 있는 역참이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전라도(全羅道)》[주-D004] 안청촌(安淸村) : 전라도 광주목(光州牧)에 있던 마을이다.[주-D005] 사술(士述) : 박광후(朴光後, 1637~1678)의 자이다. 호는 살던 마을 이름 안청촌(安淸村)을 따서 안촌(安村)이라 하였다. 1677년(숙종3), 박광일이 박광후와 장기(長鬐)로 귀양 가 있던 송시열을 찾아갔다가 강론하고 돌아간 일이 있는데, 다녀온 이듬해 세상을 떴다. 제주로 귀양 가는 송시열을 배웅할 때 박광일과 같이 간 박중회(朴重繪, 1664~1691)가 박광후의 외아들이다. 《安村集 卷4 行錄》 《性潭集 卷30 安村朴公行狀》[주-D006] 두 분 …… 편지 : 이어지는 대화로 미루어 퇴계 이황(李滉, 1501~1570)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이 주고받은 편지를 말한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는 주장을 폈고, 기대승은 “사단 역시 정(情)이고, 따라서 기(氣)가 배제될 수 없다. 칠정 역시 인의예지(仁義禮智)에서 발하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도식적으로 대거(對擧)하면 마치 두 가지의 대별되는 정이 있는 것 같고, 정에 또 두 가지의 선이 있어 하나는 이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기에서 근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8년에 걸친 논쟁을 벌였다. 《이황ㆍ기대승,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주-D007] 옛날에 …… 않았는데 : 서산은 송나라 채원정(蔡元定)의 호이다. 자는 계통(季通)이다. 한탁주(韓侂冑)에 의해 위학(僞學)으로 몰려 주희와 관계된 인물들이 화를 당할 때 호남(湖南) 도주(道州)로 귀양 가 용릉(舂陵)에서 죽었다. 주희와 함께 《서경》을 주석한 채침(蔡沈)의 아버지이다. 《宋史 卷434 蔡元定列傳》[주-D008] 서석산(瑞石山) : 전라도 광주(光州)에 있는 무등산(無等山)의 별칭이다.[주-D009] 지난해 …… 되었네 : 김만중(1637~1692)의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중숙(重淑)이고, 호는 서포(西浦)이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예학(禮學)의 대가인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이다. 1675년(숙종1) 승지로 있을 때 경연에 입시하여, “윤휴(尹鑴)가 성상께 ‘《논어(論語)》의 주(註)를 읽을 것이 없으며 대문(大文)도 또한 많이 읽을 것이 못되고 다만 수십 번만 읽으면 된다.’고 청하였다 하니, 그 말은 마땅하지 못합니다.……‘글에 임하여 공자의 이름을 휘(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달했다 합니다. 만일 글에 임하여는 휘하지 않는 규칙을 쓴다면 어휘(御諱) 또한 군부(君父) 앞에서 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또 성인의 휘를 〈곧바로〉 읽는다 해서 나랏일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1년 윤5월 26일》[주-D010] 사계 …… 합니다 : 우계는 성혼(成渾, 1535~1598)의 호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호원(浩源)이며, 호는 우계 또는 묵암(默庵)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성수침(成守琛)의 아들이다. 1594년(선조27),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왜와의 화친에 관한 논의에서, 황신(黃愼)은 성혼이 왜와 화친을 도모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성혼은 화친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牛溪集 卷5 答黃思叔論奏本事第二書》[주-D011] 옥대(玉帶)를 …… 것 : 임진왜란 때 왜적이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능을 파헤치고 왕의 시신을 꺼내어 불태운 흔적이 있었는데, 중종의 능 속에는 의심쩍은 시체 하나가 들어 있어서 그 진위(眞僞)를 알 수 없으므로 의논이 분분하다가 그 시체를 별도로 후장(厚葬)하고 능 옆의 불태운 흔적이 있는 재를 거두어 능 안에 환봉(還奉)한 일을 말한다. 《燃藜室記術 卷16 宣祖朝 二陵之變》[주-D012] 유서애(柳西厓) :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호이다. 본관은 풍산(豐山)이며, 자는 이현(而見)이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에 올라 명나라의 참전을 이끌어냈고 평양과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1598년(선조31) 북인의 탄핵으로 삭탈관직당했다가 복관되었으나 은거하며 세상을 마쳤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정리한 《징비록(懲毖錄)》을 남겼다.[주-D013] 선조께서 …… 했다 : 《손재집》 저본에는 별도의 어록인 듯 편집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송시열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번역하였다.[주-D014] 어찌 …… 미혹하는가 : 선조의 시에 “한번 죽음은 내가 참을지언정, 강화란 말은 듣기 싫도다. 어찌 간사한 말을 지어내어 의리를 부수고 삼군을 미혹하는가.[一死吾寧忍, 求和願不聞. 如何倡邪說, 敗義惑三軍.]” 하였다. 《국역 연려실기술 제17권 선조조 고사본말(宣朝朝故事本末) 병신년에 왜병이 철환하다》[주-D015] 송 수찬(宋修撰) : 송시열이 1689년(숙종15) 3월 제주(濟州) 북포(北浦)에 도착하여 위리안치되었을 때 수행한 손자 송주석(宋疇錫, 1650~1692)으로 보인다. 《국역 송자대전 부록 권11 연보10》 송주석은 1685년,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었고, 1687년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11년 8월 22일, 13년 9월 9일》[주-D016] 대학 …… 뜻입니까 : 《대학장구》 전문 10장에 “천하를 평안히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림에 달려 있다는 말은, 윗사람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우함에 백성들이 효를 일으키고,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함에 백성들이 제(弟)를 일으키며, 윗사람이 고아(孤兒)를 구휼함에 백성들이 저버리지 않는다. 이러므로 군자는 구(矩)로 재는 도(道)가 있는 것이다.[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君子有矩之道也.]”라고 했다. ‘배(倍)’ 자는 ‘배(背)’ 자와 같다.[주-D017] 어린아이를 …… 했습니다 : 《대학》 전 9장에 “〈강고(康誥)〉에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마음에 진실로 구하면 비록 정확히 맞지는 않으나 멀지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기를 배운 뒤에 시집가는 사람은 없었다.[《康誥》 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라고 했다.[주-D018] 기해의례(己亥議禮)에 …… 했다 : 1659년 효종이 세상을 뜬 뒤, 인조 왕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가 효종에 대해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전례논쟁인 기해예송을 말한다. 정태화, 송시열의 기년복설(期年服說)에 대해, 허목은 효종이 차자로서 장자가 되었다는 차장자설(次長子說)에 따라 삼년복을 주장했고, 윤휴(尹鑴)는 신모설(臣母說)에 따라 삼년복을 주장했다. 《宋子大全 卷26 大王大妃服制議》 《국역 현종실록 7년 3월 25일》[주-D019] 송 서산(宋瑞山) : 송시걸은 송시열의 막내아우인데, 형 송시수(宋時壽)와 함께 송시열의 귀양길에 동행하였다. 《국역 송자대전 부록 권11 연보10》[주-D020] 만덕사(晩德寺) : 강진(康津)에 있는 절이다. 송시열이 1689년(숙종15) 2월 24일에 강진에 도착하고 26일에 백련사(白蓮寺)로 처소를 옮겨 있으면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3월 1일에 비로소 제주로 가는 배가 출발했다. 아래 기록을 보면 만덕사는 백련사와 같은 곳에 있었다. 《국역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연보》[주-D021] 안중화(安仲和) : 중화는 안여해(安汝諧)의 자이다.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호는 이병재(理病齋)이다. 26세에 성균관에 들어갔고, 1689년에 송시열을 만나 사제의 연을 맺었다. 이때 ‘이병재’라는 호를 받았고, ‘조심주일(操心主一)’이라는 글을 받았다. 《손재집(遜齋集)》 권8 〈이병재 안공 묘지명(理病齋安公墓誌銘)〉이 실려 있다.[주-D022] 기정익(奇挺翼) : 1627~1690. 자는 자량이다. 본관은 행주(幸州)이고, 호는 송암(松巖)이다. 기대승(奇大升)의 방5대손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제릉 참봉(齊陵參奉), 효릉 참봉(孝陵參奉) 등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호남의 장성(長城), 영광(靈光)에서 평생을 보냈다. 《송암집(松巖集)》이 있다. 《遜齋集 卷8 松巖奇公行狀, 韓國文集叢刊 171輯》[주-D023] 격양집(擊壤集) : 송나라 소옹(邵雍, 1011~1077)의 시집인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을 말한다. 소옹의 자는 요부(堯夫), 시호는 강절(康節)이다.[주-D024] 초나라가 …… 이야기 : 초나라 수도가 영(郢)이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에 나온다.[주-D025] 황면재(黃勉齋)가 …… 것 : 면재는 주희의 사위이자 제자인 황간(黃榦, 1152~1221)이다. 그는 《태극도해》에서 “양이 처음 생(生)해서는 수(水)가 아직 약하다가 목(木)을 생함에 이르러서는 이미 강성해진 것이요, 음이 처음 생해서는 화(火)가 아직 약하다가 금(金)을 생함에 이르러서는 이미 질(質)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가 양의 어린 것이 되고 목이 양의 성한 것이 되며, 화가 음의 어린 것이 되고 금이 음의 성한 것이 되는데, 《태극도해》에서 가리킨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다.[주-D026] 괴안국(槐安國)에 관한 고사 : 순우분(淳于棼)이 술을 마시고 홰나무[槐樹]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가, 괴안국에 가서 그곳 왕의 부마가 되어 남가 태수(南柯太守)를 30년 동안 지내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 보니 홰나무 아래에 커다란 개미집이 하나 있었고, 남쪽 가지에는 또 작은 개미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꿈에서 보았던 괴안국과 남가군(南柯郡)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괴안몽(槐安夢)’,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唐)나라 이공좌(李公佐)의 전기소설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에 나온다.[주-D027] 호연장문답(浩然章問答) : 이 차기는 《손재집(遜齋集)》 권7 〈호연장문답병서(浩然章問答幷序)〉이다. 송시열은 세상을 뜨기 전 박광일에게 〈호연장문답〉을 읽고 난 뒤 몇 가지 의견을 적어 편지로 보냈다. 《국역 송자대전 제113권 박사원(朴士元)에게 답함 - 기사년 6월 2일》
- 2020-12-28 | NO.131
-
- 백벌남의 처가 올린 격쟁 원정을 징계하라
- 정조 11년 정미(1787)2월 6일(갑진) 형조가 격쟁(擊錚)한 사람들의 원정(原情)으로 아뢰었다. “광주(光州)의 고 조이(高召史)의 격쟁 원정에, ‘남편 백벌남(白伐男)이 지난해 9월에 고질적인 폐단 및 경주인(京主人) 김광택(金光澤)이 중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죄를 대략 진달하였다가 멀리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풀어 준 뒤 김광택의 죄를 분명하게 캐내어 엄히 다스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백벌남은 역참(驛站)의 폐단이라 일컬으며 관장(官長)을 무고하고 멋대로 격쟁하였기에 판부(判付)로 인하여 본도에 조사를 행하였는데, 무망(誣罔)으로 귀결되어 형률대로 정배되었습니다. 겨우 한 달이 지나자마자 그 처가 외람되이 격쟁하였을 때는 본조에서 깊이 책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말게 하라고만 청하였는데, 몇 달이 되지도 않아 다시 호소하였으니,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시행하지 말게 하고, 본조에서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그대로 따랐다.
- 2022-05-16 | NO.130
-
- 백사(白沙)의 북천록(北遷錄) 서문 - 약천집 제27권
- 백사(白沙)의 북천록(北遷錄) 서문 - 약천집 제27권 :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옛날에 우리 선조(宣祖)께서 중흥(中興)하실 때에 큰 공을 세운 대신(大臣)이 있었으니, 백사 선생 이공 항복(李公恒福)으로 자가 자상(子常)이다. 광해가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 )를 폐위하려 하니, 공은 헌의(獻議)하여 정도(正道)를 지키다가 관북으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별세하였다. 이때 살아서 유배지에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즈음에 서로 따른 자는 바로 금남군(錦南君) 정충신 가행(鄭忠信可行)이었다. 그는 발섭(跋涉)하는 노고와 나그네로서 타관에 있는 고통과 질병의 위태로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남겨 주어 보게 하였으니, 아, 지금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는 다만 비분강개한 뜻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술했을 뿐이요, 언어의 묘함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의 떳떳한 이치와 백성들의 윤리의 중함을 증대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감발(感發)해서 흥기하게 함이 어쩌면 이리도 많단 말인가.모자간의 윤리와 군신 간의 의리는 참으로 중대한 것이며, 인품의 간사하고 바름과 세도(世道)의 오르고 내림, 무상(無常)한 사람들의 태도와 없어지지 않는 공의(公議), 죽어서도 영화로움과 살아서도 치욕스러움, 인륜을 보고 식별하는 지혜와 지우간(知遇間)에 허여하여 보답하는 것들이 한 가지도 이 책에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후세의 군자가 이 책을 본다면 또한 때를 헤아려 처신하는 방법을 알 것이다. 사람이 서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은 이 때문일 뿐이다. 비록 훌륭한 선생과 대인이 세상의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지었다 하더라도 요컨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군복을 입은 무신이 경병(競病)의 말을 남긴 것과 같은 종류로 여겨 함께 평할 수 있겠는가.내 들으니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용만(龍灣)으로 파천하였을 때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내부(內附)하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 중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를 물으니, 오직 공만이 몸소 말고삐를 잡고 따라갈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이 북쪽 지방으로 귀양 가자, 오직 금남만이 따르고 떠나가지 아니하여 살아 계실 때와 별세한 뒤를 잘 경영하였으니, 아, 공이 스스로 군부(君父)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 보답을 금남에게서 받은 것이다. 《시경(詩經)》에 말하지 않았는가. “선조에게 훌륭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후손이 그와 같은 것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맞는 말이다.또한 나는 여기에서 다시 느끼는 바가 있다. 옛날 보상(輔相)의 직책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인재를 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 진(晉)나라의 창고 관리하는 자를 오직 조 문자(趙文子)가 알아보고 천거하여 대부로 삼았고, 한(漢)나라로 도망온 병졸을 오직 소 상국(蕭相國)이 알아보고서 천거하여 대장으로 삼았으니, 이처럼 명철한 식감(識鑑)은 본래 천성에서 얻은 것이니, 어찌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으며 배우고 익혀서 능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금남은 광주(光州)의 한 천한 선비로서 총각 시절에 적군 속을 뚫고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니, 공은 마침내 눈을 들어 한 번 바라보는 사이에 그를 알아보고서 가르치고 성취시켜 끝내 국가의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한 몸이 곤궁할 때에 큰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기세가 하늘을 뒤덮는 역적을 토벌하고 국가를 거듭 회복하는 공렬(功烈)을 이루어서 세상의 간성(干城)이 되어 종묘사직이 이에 의뢰하였다. 지금 이러한 안목이 없으면서 국가의 큰 임무를 담당한 자들은 비록 혹 구구히 충성할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인물을 선발하여 군주를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주-D001] 군복을 …… 것 : 경병(競病)은 경(競)과 병(病) 두 험운(險韻)을 달아 지은 시를 말한다. 양(梁)나라 때 조경종(曹景宗)이 개선(凱旋)하자, 무제(武帝)가 화광전(華光殿)에서 잔치를 베풀어 연음(宴飮)하면서 심약(沈約)과 더불어 연구(聯句)를 지었는데, 이때 운자를 모두 사용하고 오직 경병 두 글자만 남았다. 조경종이 붓을 잡고 즉석에서 시를 지어 “떠날 때에는 아녀자들 슬퍼하더니, 돌아올 때에는 피리와 북소리 요란하네. 한 번 길 가는 사람에게 묻노니, 옛날의 곽거병과 어떠한가.〔去時兒女悲 歸來笳鼓競 借問行路人, 何如霍去病〕”라고 하니, 무제가 감탄하였다. 《南史 卷55 曹景宗傳》[주-D002] 진(晉)나라의 …… 삼았고 : 문자(文子)는 춘추 시대 진나라의 명재상인 조최(趙衰)의 시호이다.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진나라 사람들이 조 문자(趙文子)를 일러 사람을 잘 아는 자라고 하였다. …… 진나라에서 천거한 사람 중에 관고(管庫)의 선비가 70여 명이었으나 살아서는 그들과 이익을 주고받지 않고 죽어서는 자기 자식을 부탁하지 않았다.” 하였는바, 관고의 선비란 창고를 맡아 관리하는 낮은 벼슬아치를 가리킨다.[주-D003] 한(漢)나라로 …… 삼았으니 : 한나라로 도망온 병졸은 한신(韓信)을 가리킨다. 한신은 회음(淮陰) 사람으로 일찍이 초(楚)나라의 패왕(覇王)인 항우(項羽)를 섬기다가 한나라 고조(高祖)인 유방(劉邦)에게 귀의하였으나 크게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승상인 소하(蕭何)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도망가지 말도록 설득한 다음 유방에게 대장(大將)으로 크게 등용할 것을 건의하여, 결국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史記 卷93 淮陰侯列傳》
- 2020-09-23 | NO.129
-
- 백제가 탐라(耽羅)를 치려다가 중도에서 돌아왔다 - 동사강목 제3상
- 동사강목 제3상 갑술 신라 소지왕(炤智王) 16년, 고구려 문자왕(文咨王) 3년, 백제 동성왕(東城王) 16년부터, 무신 신라 진덕 여주(眞德女主) 2년,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7년, 백제 의자왕(義慈王) 8년까지 155년간 무인년 신라 소지왕 20년, 고구려 문자왕 7년, 백제 동성왕 20년(북위 효문제 태화 22, 498) 춘정월 고구려가 아들 흥안(興安)을 태자로 삼았다. 백제가 웅진교(熊津橋)를 가설하였다.추7월 고구려가 금강사(金剛寺)를 창건하였다.8월 백제가 탐라(耽羅)를 치려다가 중도에서 돌아왔다. 백제 왕이 탐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하여 친히 정벌하려고 무진주(武珍州 지금의 광주(光州))에 이르니, 탐라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므로 중도에서 회군하였다.
- 2020-09-15 | NO.128
-
- 벽진서원 의열사 상량문〔義烈祠上梁文〕- 서하집
- 의열사 상량문〔義烈祠上梁文〕- 서하집 제13권 / 상량문(上梁文) : 이민서(李敏敍, 1633~1688).향선생을 사(社)에 향사하여 오래전부터 정성을 바치는 사당이 있는데, 열장부(烈丈夫)가 때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독 충(忠)을 나타내는 전례(典禮)가 빠졌도다. 이에 옛 사당을 새롭게 하여 영령(英靈)을 함께 향사하도다.회재(懷齋) 박 선생(朴先生)은 재야의 현인이며 방국(邦國)의 큰 선비로다. 복자하(卜子夏)와 단간목(段干木)의 절개로 남주(南州)에서 출중하였고, 진원방(陳元方)과 정강성(鄭康成)의 주선으로 상국(上國)에서 빈흥(賓興)하였네. 조정에서 날릴 때에는 기러기 날개를 함께 쳐다보았지만, 길 잃고는 소 잡는 칼을 누차 시험하였지. 골짜기에서 은거한 세월 오래되었고 조정에 출입하여 덕과 명예가 더욱 높았네. 마침 큰 뱀이 형(荊)을 침범하여 육룡(六龍)이 촉(蜀)에 거둥하였네. 촉지무(燭之武)가 늙음을 고했으나 여전히 임금을 잊지 못하였고, 안고경(顔杲卿)이 군사 일으켜 적을 섬멸하기를 맹세하였네. 이 때문에 집안에 거처하며 의병에게 물자를 공급하였는데 몸이 죽어 중흥을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충용(忠勇) 김 장군(金將軍)은 산악의 밝은 영기를 받고 초야에 자취 감췄네. 충정(精忠)은 해를 꿰뚫어 전쟁을 만나 의리상 마다하지 않았으니, 화란(禍亂)은 천지에 가득하여 뛰어난 호걸이 아니고선 힘으로 구제할 수 없었지. 처음 일어나자 총애하는 명령이 거듭 내렸고 한번 호령하자 군사들이 다투어 모여들었네.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처럼 작은 응원군조차 없이 홀로 외로운 군대를 이끌고, 관우(關羽)와 장비(張飛)처럼 맹수 같은 용맹을 갖고 충절을 자부하였네. 왕언장(王彥章)이 창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며 나는 듯이 출입하였고, 악무목(嶽武穆)이 등에 새기고 마음에 맹세하여 생사를 잊은 듯하였네. 손랑(孫郞)이 이르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였고 단도제(檀道濟)가 태어나자 나라에 간성(干城)이 있었네.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인재는 하늘이 시대를 위해 낸다는 것을 진실로 알겠으니, 옛날의 명장을 보면 누가 수염이 무리에서 특출한 이만 하랴.화의(和議)가 이루어지자 열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당화(黨禍)가 기승하자 간신이 계책을 얻었네. ‘막수유(莫須有)’ 3자(字)가 애당초 어떻게 사람을 복종시켰으랴. 만약 속죄할 수 있다면 내 몸을 백 번이라도 주겠다 하였으니 옛날에 진실로 이렇게 지극한 울분이 있었도다.다행히 백 년의 공론(公論)이 정해져서 선조(先朝)의 포증(褒贈)이 통쾌하게 펴졌도다. 내가 누구와 함께 돌아가랴. 돌아가신 분 환생할 수 없어 애통하도다. 선비들 서로 감격하여 백대 만에 오히려 새로워졌도다. 외지고 누추한 곳이라 글 짓는 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한스럽고 향사(享祀)가 거행되지 않아 애석하도다. 단 태위(段太尉)의 일사(逸事)를 징험하고 수양(睢陽)의 쌍묘(雙廟)를 모방했도다. 사당을 예전 규모보다 넓히고 충혼을 일실(一室)에서 제사 지내도다. 도(道)는 인의(仁義)에 근원을 함께 두고 사람은 무(武)와 문(文)에 차이를 두지 않았네. 대우전(大羽箭)과 진현관(進賢冠)이 능연각(凌煙閣)에 함께 그려졌고 살벌한 소리와 드문드문한 비파소리가 공문(孔門)에 아울러 있었네. 영렬(英烈)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음을 기뻐하고 천도(天道)가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옴을 믿겠노라. 애오라지 찬송하는 붓을 들어 긴 들보 올리는 일을 돕노라.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 兒郞偉拋梁東서석산이 높이 하늘에 솟구쳤구나 / 瑞石山高聳碧空구름 일으키고 안개 낼 뿐만 아니니 / 不獨興雲兼出霧신령스런 빛과 아름다운 기운이 영웅을 냈도다 / 靈光休氣產英雄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 兒郞偉拋梁西큰 들이 평평히 펼쳐져 바라보면 가지런하네 / 大野平分一望齊거록의 창칼의 모임을 상상해 보니 / 想看鉅鹿刀槍會천군만마가 소리 없이 북소리를 들었으리라 / 萬馬無聲聽鼓鼙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 兒郞偉拋梁南백 이랑의 모난 못 쪽보다 더 푸르구나 / 百頃方池綠勝藍서호는 나귀 탄 장군이 정착할 만하니 / 西湖可着騎驢將물빛과 산빛에 한을 견딜 수 없네 / 水色山光恨不堪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 兒郞偉拋梁北만산의 소나무와 회나무가 푸르름 일색이로다 / 滿山松檜靑一色세상 사람 누가 추워진 뒤의 자태를 알리오 / 世人誰識歲寒姿도끼로 베어 가는 것이 더 이상 애석치 않구나 / 斧斤斬伐不復惜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 兒郞偉拋梁上해와 달 빛나고 은하수도 출렁이네 / 日月照耀星河泳흙 속의 푸른 피 갑 속의 칼날이 / 土中碧血匣中刀밤마다 원통한 기운 하늘을 찌르도다 / 夜夜冤氣衝宸象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 兒郞偉拋梁下널찍한 산의 돌이 앞들을 굽어보네 / 山石盤陀俯前野청금과 만호영이 가득하니 / 濟濟靑襟及胡纓사방에서 의를 좋아하는 이들 달려오누나 / 奔走四方好義者삼가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많은 선비들 구름처럼 모여들고 온 나라가 감화되며, 봄가을로 향사하는 일에 희생을 마련하여 정성을 바치고 조석으로 강습하는 법규는 〈백록동규(白鹿洞規)〉와 번갈아 아름다우며, 풍성(風聲)이 묘사(廟祀)와 함께 멀리 퍼지고 문교(文敎)가 치화(治化)와 함께 흘러가게 하소서. 전현(前賢)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며, 영원한 세상에 함께 힘쓰기를 기대하도다.[주-D001] 의열사 : 1604년(선조37)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박광옥(朴光玉)의 덕행과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원래 이름은 벽진서원(碧津書院)이었다. 그 뒤 이민서가 광주 목사로 있던 1678년(숙종4)에 김덕령(金德齡)을 추가 배향하는 동시에 중수하였으며, 1681년 ‘의열사(義烈祠)’라고 사액되었다. 광주시 서창에 있다. 그 뒤 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의열사는 철거되고, 1975년 2월 이곳에 충장사를 지어 배향하였다.[주-D002] 회재(懷齋) 박 선생(朴先生) : 회재는 박광옥(朴光玉, 1526~1593)의 호이다. 자는 경원(景瑗), 본관은 음성(陰城)이다. 전라도 광주에 세거(世居)하며, 기대승(奇大升)ㆍ박순(朴淳)ㆍ이이(李珥)ㆍ노사신(盧思愼) 등과 교유하였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고, 고향의 의병도청(義兵都廳)에서 군사 장비와 군량을 조달하였다. 의병 활동의 공로로 다시 관직에 올라 나주 목사로 재임하다가 죽었다. 1602년(선조35) 광주 벽진촌(碧津村)에 세워진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되었으며, 뒤에 벽진서원으로 고쳐졌다. 운봉(雲峰)의 용암서원(龍巖書院)에도 제향되었다.[주-D003] 복자하(卜子夏)와 …… 출중하였고 : 박광옥이 벼슬하기 전에 광주(光州)에서 출중한 인사였음을 말한다. 복자하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문학으로 이름난 복상(卜商)으로, 자가 자하(子夏)이다. 단간목(段干木)은 전국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위(魏)나라에 살면서 도를 지킨 채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다. 위나라 문후(文侯)가 그가 어진 것을 알고서 찾아가자 문후를 피하여 담을 넘어 도망쳤다. 《孟子 滕文公下》[주-D004] 진원방(陳元方)과 …… 빈흥(賓興)하였네 : 박광옥이 빼어난 학문을 바탕으로 대신의 추천을 받아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제수된 것을 말한다. 진원방은 후한(後漢)의 진기(陳紀)로, 자가 원방이다. 덕행과 재주로 이름나 그 아우 진계방(陳季方)과 함께 난형난제(難兄難弟)로 일컬어졌다. 정강성(鄭康成)은 후한의 학자 정현(鄭玄)으로, 자가 강성이다. 빈흥(賓興)은 주(周)나라 때 어진 인재를 선발하던 방법의 하나로, 지방의 소학(小學)에서 덕행과 학예(學藝)가 뛰어난 학생을 뽑아서 빈례(賓禮)로 맞이한 뒤에 국학에 입학시키는 방법이다. 《周禮 大司徒》[주-D005] 길 잃고는 …… 시험하였지 : 작은 고을의 수령을 자주 역임하였다는 말이다. 공자가 자신의 제자 자유(子游)가 수령으로 있는 무성(武城)에 가서 현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割雞焉用牛刀?]” 하였다. 《論語 陽貨》 박광옥은 운봉 현감(雲峯縣監)ㆍ영광 군수(靈光郡守)ㆍ밀양 부사(密陽府使) 등을 지냈다. 《記言 別集 卷25 羅州牧使朴公墓表》[주-D006] 마침 …… 침범하여 : 큰 뱀은 흔히 봉시장사(封豕長蛇)로 쓰인다. 큰 뱀처럼 포학하고 탐욕스러운 부족이라는 말로, 본래 남만(南蠻)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정공(定公) 4년조에 “오나라는 큰 돼지와 뱀이라서 끊임없이 상국을 침범하고 있다.[吳爲封豕長蛇, 以荐食上國.]”라고 하였다. 형(荊)을 침범한 일은 미상이다.[주-D007] 육룡(六龍)이 촉(蜀)에 거둥하였네 : 육룡은 천자(天子)의 수레를 끄는 여섯 마리의 말에 대한 미칭으로, 천자의 수레를 이르기도 하고 천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당 현종(唐玄宗) 천보(天寶) 14년에 안녹산(安祿山)이 낙양(洛陽)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장안(長安)까지 쳐들어오자, 천자가 촉 지방으로 거둥하였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선조(宣祖)가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한 것을 비유하였다.[주-D008] 촉지무(燭之武)가 …… 못하였고 : 촉지무는 춘추 시대 정(鄭)나라 신하로, 진(秦)과 진(晉)이 정나라를 포위했을 때 정나라 임금이 그를 사신으로 보내려 하자, 그가 “나는 젊었을 때에도 남처럼 일을 못했는데, 지금은 늙기까지 했으니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라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중용하지 못한 것을 임금이 사과하자, 결국 진(秦)나라 군대에 가서 진 목공(秦穆公)을 만나 “만약 정나라를 그대로 놔두어, 진(秦)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할 적에 길 안내 역할을 맡게 하시고, 사신들이 왕래할 적에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게 하신다면, 임금에게도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若舍鄭以爲東道主 行李之往來 供其乏困 君亦無所害]”라고 설득하여 포위를 풀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30年》[주-D009] 안고경(顔杲卿)이 …… 맹세하였네 : 안고경은 당(唐)나라의 충신으로 상산 태수(常山太守)로 있을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당했다. 반란군 사사명(史思明)이 상산을 공격하여 성이 함락되고 자신은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면전에서 준열하게 꾸짖다가 혀가 잘리고 죽었다. 《新唐書 卷192 顔杲卿列傳》[주-D010] 충용(忠勇) 김 장군(金將軍) :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을 말한다. 1593년(선조26) 어머니 상중에 담양 부사 이경린(李景麟), 장성 현감 이귀(李貴) 등의 권유로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세력을 크게 떨치자, 선조로부터 형조 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의 군호를 받았다.[주-D011] 장순(張巡)과 …… 이끌고 :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인 장순과 허원(許遠)의 병칭이다. 천보(天寶) 연간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순이 진원 영(眞源令)으로 백성들을 인솔하고 당나라의 시조인 현원황제(玄元皇帝)의 묘(廟)에 나아가 통곡한 다음 기병(起兵)하여 반란군을 막았다. 그 뒤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인 수양성을 몇 달 동안 사수하고 있었는데, 구원병이 오지 않아 양식은 다 떨어지고 힘은 다 소진되어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자 태수(太守)로 있던 허원과 함께 사절(死節)하였다. 《舊唐書 卷187 張巡列傳》[주-D012] 관우(關羽)와 …… 갖고 : 관우와 장비(張飛)는 촉한(蜀漢) 유비(劉備)의 휘하 장수로서 무예가 출중하였다.[주-D013] 왕언장(王彥章)이 …… 출입하였고 : 왕언장은 후량(後梁)의 맹장으로 철창(鐵鎗)은 그의 호이다. 그가 행영(行營)의 선봉이 되어 철창을 사용하는 것이 몹시 빨랐으므로 군중(軍中)에서 왕철창(王鐵鎗)이라고 하였다. 후진(後晉)이 운주(鄆州)를 차지하였을 때 후량의 말제(末帝)가 왕언장을 불러 초토사(招討使)로 삼고 적을 격파하는 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는데 “3일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므로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피식 웃었다. 왕언장이 명을 받고 출병하여 이틀 동안 달려 활주(滑州)에 이르러서 적을 격파할 때까지 걸린 날짜가 모두 3일이었다. 《宋子大全隨箚 卷10》[주-D014] 악무목(嶽武穆)이 …… 듯하였네 : 무목은 남송(南宋)의 장군 악비(嶽飛, 1103~ 1142)의 시호이다. 악비가 등에다가 정충보국(精忠報國)이란 네 글자를 새기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말하였다.[주-D015] 손랑(孫郞)이 …… 혼비백산하였고 : 손랑은 후한(後漢)의 손책(孫策)을 말한다. 후한 말엽에 나라가 어지러워져 군웅이 할거할 때, 당대의 실력자 원술(袁術)이 그에게 강동(江東) 지역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진군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다. 평소 강동의 백성들은 손책이 사나운 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처음에 모두 혼비백산했으나 군령을 엄하게 내려 노략을 금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귀의하였다. 《資治通鑑 卷61 漢紀53 孝獻皇帝丙》[주-D016] 단도제(檀道濟)가 …… 있었네 : 대군(大軍)을 지휘하는 중신(重臣)을 비유한 표현이다.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명장 단도제(檀道濟)가 누차 전공(戰功)을 세웠으나 시기를 받아 억울하게 죽을 때에 “이제는 또 너희들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乃復壞汝萬里之長城.]”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 《宋書 卷43 檀道濟列傳》[주-D017] 화의(和議)가 …… 해이해졌고 : 명(明)나라 유격(遊擊) 심유경(沈惟敬)과 왜장 소서행장(小西行長) 사이에 벌어진 강화 협상을 말한다. 계사년(1593, 선조26)부터 이어져 오던 협상은 풍신수길(豐臣秀吉)의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으로 인해 결렬되고 결국 정유재란이 발생하였다.[주-D018] 당화(黨禍)가 …… 얻었네 : 김덕령(金德齡)이 당파싸움에 희생된 것을 말한다. 1596년 7월 홍산(鴻山)에서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김덕령은 도원수 권율의 명을 받아 진주에서 운봉(雲峯)까지 진군했다가, 이미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돌아가려 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진주로 돌아왔다. 이때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충청도 체찰사 종사관 신경행(辛景行)과 모속관(募粟官) 한현(韓絢)의 무고로 곽재우(郭再祐)ㆍ고언백(高彦伯)ㆍ홍계남(洪季男)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에 정탁(鄭琢)ㆍ김응남(金應南) 등이 그의 무고를 힘써 변명했으나 20일 동안에 여섯 차례의 혹독한 고문으로 옥사하였다.[주-D019] 막수유(莫須有) …… 복종시켰으랴 : 김덕령(金德齡)의 옥사(獄事)가 터무니없는 무고였음을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막수유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후대에 근거 없이 날조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남송의 악비(嶽飛)가 북송(北宋)을 멸망시킨 금나라와 싸워서 중원(中原)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간신 진회(秦檜) 등 주화파(主和派)에 의해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를 당하여 ‘막수유’의 죄명(罪名)으로 죽임을 당했다. 충신 악비를 죽이려고 무함하는 진회가, “악비의 아들 악운(嶽雲)이 악비의 장수 장헌(張憲)에게 준 편지가 있는데 사실은 분명치 않지만, 아마 있을 것이다.” 하자, 악비를 편드는 한세충(韓世忠)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세 글자로 어떻게 천하 사람들을 납득시키겠는가.”라고 하였다. 《宋史 卷365 嶽飛列傳》[주-D020] 속죄할 …… 하였으니 : 김덕령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말이다. 진 목공(秦穆公)이 훌륭한 인재들을 순장한 것을 비난한 시에 “저 푸른 하늘이여, 우리의 훌륭한 이들을 죽이는구나. 만약 속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제 몸을 백 번이고 내놓으리라.[彼蒼者天, 殲我良人. 如可贖兮, 人百其身.]” 하였다. 《詩經 黃鳥》[주-D021] 다행히 …… 펴졌도다 : 《현종개수실록》 2년 8월 30일조에, 충용장(忠勇將) 김덕령을 신원하고 관작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고, 《현종개수실록》 9년 4월 13일조에, 좌랑 김덕령을 제조(諸曹)의 참의(參議)에 추증하였으며, 《숙종실록》 6년 윤8월 24일조에, 이민서가 경연관으로 입시하여 박광옥(朴光玉)과 김덕령의 포상을 건의하자 사액(賜額)하도록 명한 기사가 보인다.[주-D022] 단 태위(段太尉)의 …… 징험하고 : 단 태위는 당(唐)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수실(秀實), 자는 성공(成公),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주자(朱泚)가 모반하면서 당시 사농경(司農卿)으로 있던 단 태위의 인망이 높은 것을 생각하여 맞아 오게 하자, 단 태위가 거짓 협력하는 체하고서 하루는 일을 논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상홀(象笏)을 빼앗아 내리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크게 꾸짖으니 주자의 이마에 유혈이 낭자하였다. 결국 주자에게 살해되었다. 《新唐書 卷153》 《舊唐書 卷128》[주-D023] 수양(睢陽)의 쌍묘(雙廟)를 모방했도다 : 당나라 현종(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성들은 모두 함락되었으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은 수양을 굳게 지켜 2년을 버티었다. 성이 고립되고 원군이 이르지 않아 결국 식량이 떨어지고 사졸이 없어 성이 함락되어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전에 장순이 전투를 독려하면서 눈을 부릅떠서 눈자위가 찢어져 피가 흘렀고, 이를 악물어 이가 부서졌는데, 포로가 된 뒤에 안녹산의 당인 윤자기(尹子奇)가 장순의 입을 칼로 찢어서 보니 남아 있는 이가 서너 개뿐이었다. 장순이 죽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군부(君父)를 위해 의리로 죽지만 너희들은 역적에게 붙었으니 개돼지만 못하다. 어찌 오래 가겠느냐.” 하였다. 《舊唐書 卷187 忠義列傳下》[주-D024] 대우전(大羽箭)과 …… 그려졌고 : 대우전은 무관이 쓰는 화살이고 진현관(進賢冠)은 문관이 쓰는 관이다. 당 태종이 정관(貞觀) 17년(643)에 장손무기(長孫無忌)ㆍ두여회(杜如晦)ㆍ위징(魏徵)ㆍ방현령(房玄齡) 등 훈신(勳臣) 24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능연각에 걸어 놓게 하였는데, 문관과 무관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주-D025] 살벌한 …… 있었네 : 공자(孔子)가 한가로이 거문고를 탈 때 살벌한 소리를 내자, 민자(閔子)가 밖에서 듣고 의아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공자는 고양이가 한창 쥐를 잡는 것을 보고 꼭 잡기를 바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심리가 반영되어 살벌한 소리를 냈다고 대답하였다. 《山堂肆考 卷162 取鼠》 한가로운 비파소리는 공자가 증점(曾點)에게 자기 뜻을 말해 보라고 했을 때, 증점이 비파를 드문드문 타다가 대답하기 위해 비파를 덜커덩 땅에 놓은 것[鏗爾舍瑟]을 말한다. 증점은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先進》[주-D026] 거록의 …… 보니 : 박광옥이 의병을 일으킨 당시를 상상해 본다는 말이다. 후한 영제(靈帝) 때 장각(張角)이 황노(黃老)의 학설을 받들어 한 왕실이 어지러운 틈을 타 난을 일으켰다. 그 무리들이 모두 누런 두건을 썼으므로 황건적이라 불렀는데, 거록(鉅鹿)에서 유비(劉備)ㆍ관우(關羽)ㆍ장비(張飛)가 도원결의(桃園結義)하고 의병을 일으켜 이들을 소탕하였다.[주-D027] 세상 …… 알리오 : 암울한 시대에 지조를 변치 않은 고인의 풍모를 후인들이 모른다는 말이다. 《논어》 〈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ㆍ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줄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 하였다. 《論語 子罕》[주-D028] 흙 속의 …… 칼날이 : 김덕령이 재능을 펴 보지도 못하고 원통하게 죽었음을 말한다. 원문의 ‘벽혈(碧血)’은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푸른 피를 말한다. 주(周)나라 경왕(敬王) 때 장홍(萇弘)이 참소를 당해 촉(蜀)으로 쫓겨나 자결했는데, 그 피가 3년 만에 푸르게 변했다고 하며, 일설에는 푸른 옥으로 변했다고도 한다. 《莊子 外物》 갑 속의 칼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인재를 비유하는 말이다.[주-D029] 청금(靑襟)과 만호영이 가득하니 : 선비와 무인들이 향사하러 가득히 모였다는 말이다. 청금은 푸른 옷깃으로 선비들이 착용하는 옷이고, 만호영(曼胡纓)은 무늬가 없는 갓끈으로 무부들이 착용한다.* 수정 2023.11.12. '나주 벽진촌'을 '광주 벽진촌'으로
- 2020-12-23 | NO.127
-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연려실기술 별집 제8권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연려실기술 별집 제8권 / 관직전고(官職典故) 전라도는 2명인데, 하나는 관찰사가 겸한다. 태종조에 처음 두었는데, 광주(光州)에 영을 개설하였다가, 정유년에 남쪽의 도적을 막기 위하여, 강진(康津)으로 옮겼다. 선조 기해년에 장흥(長興)으로 옮겼다가 갑진년에 지형이 불편하다 하여 도로 강진에 설치하였다.
- 2020-09-25 | NO.126